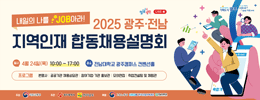노란 동백꽃을 떠올리는 이유는 - 김창균 광주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
 |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
이맘때면 다시 돌아보게 되는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의 한 구절이다. 점순이와의 아찔한 사랑이 알싸한 동백꽃 향기로 이어지는 장면이 눈에 선하지만 노란 동백꽃을 떠올리는 데는 소설의 문화적 배경과 강원도 사투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 고장의 동백꽃 씨앗은 머릿기름 재료로도 사용되는데 동백이 자라지 않는 중북부 지역에서는 생강나무 열매로 대신하다 보니 이름까지 따라간 것이다. 생강나무는 잘라낸 가지나 꽃에서 생강 향기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니 소설을 읽을 때 붉은 동백꽃이 아니라 봄철 산중 바위틈에서 올망졸망 피어난 노란 생강나무꽃을 떠올려야 알싸하면서도 향긋한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터이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와 관습을 담아내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어휘와 문법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정체성과 맥락에 대한 이해와도 맞닿아 있다. 평화롭고 단란했던 고향집 정경을 그린 정지용의 시 ‘향수’에 나오는 ‘얼룩백이 황소’도 그렇다.
얼룩백이(표준어는 얼룩빼기)하면 하양과 검정이 섞인 젖소가 아닌가 싶은데 검정 줄무늬가 얼루룩덜루룩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칡소’를 일컫는다. 황소도 노란색을 띤 소가 아니다. 작은 수소를 가리키는 부룩소의 상대어로, 크다는 뜻의 ‘한’이 붙은 ‘한소’가 황소로 변한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젖소와 누렁소의 이질적인 조합에 의문은 당연하다. 그런데 무심히 넘기는 순간 우리 전통의 정경, 호랑이처럼 줄무늬가 있는 커다란 수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는 풍경은 정녕 사라지고 만다.
몇 년 전 어느 방송에서는 “괴발개발에 등장하는 개를 제외한 동물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 정답을 맞힌 시민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을 일컫는 우리말이 ‘괴발개발’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해석만 놓고 보면 고양이의 옛말이 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린 개’를 뜻하는 말이 강아지이듯이 고양이는 ‘어린 괴’를 지칭했다. 역사적 변화를 거쳐 괴의 자리를 고양이가 차지하게 되니 정작 현재에 와서는 ‘어린 고양이’를 가리키는 말은 없는 불균형 상태가 된 마당이다.
산기슭의 괴불나무나 들판의 괴불주머니에나마 흔적을 남긴 ‘괴’를 놓치게 되니, ‘개발새발’이 버젓이 ‘표준국어대사전’에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이라고 2010년에 등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은 개와 새라는 표기에 이끌려 개와 새의 발로 언중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단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언어가 사용자 중심의 통신 규약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시대가 흘러 사람이 바뀌고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 약속도 변하게 마련이다. 더욱이 작금의 디지털 문해력 시대에는 변화가 가속화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언어는 우리의 삶을 담고 시간을 건너뛰어 고유의 기억을 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역사의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변화를 극복하며 생존하는 유기체와도 같은 존재가 언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문학 작품을 그 나라의 언어로 감상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문화와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세계적인 작품에 담긴 감정과 사고를 오롯이 감상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이를 온전히 세계화하고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에 담긴 문화적 정체성과 맥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승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문해력은 단어나 문맥의 의미를 전체적 맥락 속에서 정확히 이해하려는 정성에서 출발함을 기억해야 한다. 사흘이 4일이라든가 ‘심심한 사과’에 진정성을 못 느낀다는 부류의 목소리가 얘깃거리가 되는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이맘때면 다시 돌아보게 되는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의 한 구절이다. 점순이와의 아찔한 사랑이 알싸한 동백꽃 향기로 이어지는 장면이 눈에 선하지만 노란 동백꽃을 떠올리는 데는 소설의 문화적 배경과 강원도 사투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와 관습을 담아내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어휘와 문법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정체성과 맥락에 대한 이해와도 맞닿아 있다. 평화롭고 단란했던 고향집 정경을 그린 정지용의 시 ‘향수’에 나오는 ‘얼룩백이 황소’도 그렇다.
몇 년 전 어느 방송에서는 “괴발개발에 등장하는 개를 제외한 동물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 정답을 맞힌 시민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을 일컫는 우리말이 ‘괴발개발’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해석만 놓고 보면 고양이의 옛말이 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린 개’를 뜻하는 말이 강아지이듯이 고양이는 ‘어린 괴’를 지칭했다. 역사적 변화를 거쳐 괴의 자리를 고양이가 차지하게 되니 정작 현재에 와서는 ‘어린 고양이’를 가리키는 말은 없는 불균형 상태가 된 마당이다.
산기슭의 괴불나무나 들판의 괴불주머니에나마 흔적을 남긴 ‘괴’를 놓치게 되니, ‘개발새발’이 버젓이 ‘표준국어대사전’에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이라고 2010년에 등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은 개와 새라는 표기에 이끌려 개와 새의 발로 언중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단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언어가 사용자 중심의 통신 규약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시대가 흘러 사람이 바뀌고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 약속도 변하게 마련이다. 더욱이 작금의 디지털 문해력 시대에는 변화가 가속화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언어는 우리의 삶을 담고 시간을 건너뛰어 고유의 기억을 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역사의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변화를 극복하며 생존하는 유기체와도 같은 존재가 언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문학 작품을 그 나라의 언어로 감상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문화와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세계적인 작품에 담긴 감정과 사고를 오롯이 감상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이를 온전히 세계화하고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에 담긴 문화적 정체성과 맥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승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문해력은 단어나 문맥의 의미를 전체적 맥락 속에서 정확히 이해하려는 정성에서 출발함을 기억해야 한다. 사흘이 4일이라든가 ‘심심한 사과’에 진정성을 못 느낀다는 부류의 목소리가 얘깃거리가 되는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