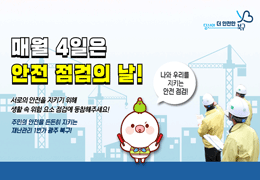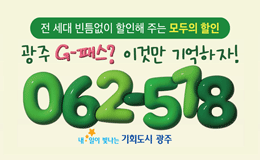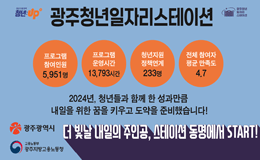광주, 두바이에서 도시 비전을 배우다 - 박홍근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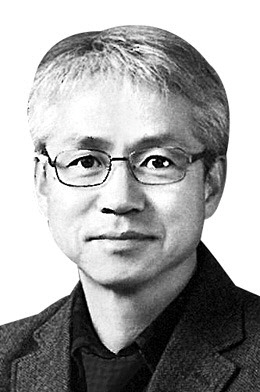 |
2월 중순,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원들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와 두바이 건축답사를 다녀왔다. 어느 나라나 사람 사는 곳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기 마련이다. 그곳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도시를 즐기는 사람, 이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유지·관리를 위해 후미진 곳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래도 이곳에 사람이 몰려들고 있다. 두바이 인구는 현재 약 350만명이다. 향후 20년 내에 약 600만명까지 증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경제 성장 계획에 기인한다.
163층에 828m높이의 ‘버즈 칼리파’ 빌딩과 주변으로 40~80층 높이의 건물이 즐비하다. 광주에서 40층 높이라면 엄청 높은 빌딩이지만 그곳에서는 낮은 건물이다. 높고 낮음,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이란 것이 존재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잠시 생각하게 된다.
두바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무역, 금융, 쇼핑, 관광 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사막의 작은 어촌도시에서 60여년만에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가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지도자의 탁월한 ‘생각’과 ‘열정’과 ‘실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권국가이고, 오일머니가 있고, 장기집권을 하기에 가능했다고만 평가할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높은 차원의 ‘상상력’과 ‘계획성’과 ‘실천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그리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광주·전남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도지사, 지자체 장들은 두바이 지도자의 밑바탕에 흐르는 ‘생각’, ‘열정’, ‘자질’을 눈여겨볼 일이다.
셰이크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1912~1990)은 두바이의 통치자이며 UAE의 첫 번째 부통령이자 두 번째 총리였다. 왕족이고, 정치인이며, UAE의 창시자였다. 사망할 때까지 32년 동안 두바이를 이끌었다.
그는 “언젠가 석유는 고갈된다” “우리는 석유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두바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의 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는 메르세데스를 운전했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운전했고, 그의 아들은 랜드로버를 운전하겠지만, 그의 아들은 낙타를 탈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에는 1966년에 발견되어 1969년에 생산을 시작한 두바이의 석유가 몇 세대 안에 고갈될 것이라는 현실 인식과 다음 세대의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반영되어 있다.
현재 두바이를 통치하고 있는 셰이크 모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1949~ )은 1995년 왕세자로 지명되자 수많은 국가 건설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직접 통치하며 오늘의 두바이 역사를 계속 쓰고 있다.
그가 구축한 여러 업적 중 눈여겨볼 건축물은 2022년에 개관한 두바이 ‘미래 박물관(Museum of the Future)’이다. 중앙이 비어있는 타원형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는 50년 후의 세상을 상상하며 오늘에도 좋은 두바이를 만들어 가는 ‘철학’과 ‘상상력’으로 채워져 있다. 외관의 독특한 꼬불꼬불한 무늬의 창들은 셰이크 모함마드 국왕의 미래 비전 세 가지를 아랍어 캘리그래피로 새긴 것이다.
“생명의 갱신, 문명의 진화, 인류 발전의 비결은 간단하다. 혁신이다” “미래는 상상하고 설계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백 년을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창의력의 산물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유산으로 남는다”는 뜻이다. 오늘의 두바이를 있게 한 지향점이 드러난다.
‘혁신’, ‘미래’, ‘창조’, ‘창의력의 산물’, ‘유산’ 등등 우리 단체장들도 많이 쓰는 언어지만 늘 허공에 흩어진다. 이 지역 선출직 공무원과 리더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 지역이 현재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살고 싶은 도시인가?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바이 지도자가 지향하는 점들과 그 결과물을 다시 참고해보면 어떨까.
163층에 828m높이의 ‘버즈 칼리파’ 빌딩과 주변으로 40~80층 높이의 건물이 즐비하다. 광주에서 40층 높이라면 엄청 높은 빌딩이지만 그곳에서는 낮은 건물이다. 높고 낮음,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이란 것이 존재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잠시 생각하게 된다.
두바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무역, 금융, 쇼핑, 관광 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사막의 작은 어촌도시에서 60여년만에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가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지도자의 탁월한 ‘생각’과 ‘열정’과 ‘실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권국가이고, 오일머니가 있고, 장기집권을 하기에 가능했다고만 평가할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높은 차원의 ‘상상력’과 ‘계획성’과 ‘실천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그리될 것으로 보인다.
셰이크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1912~1990)은 두바이의 통치자이며 UAE의 첫 번째 부통령이자 두 번째 총리였다. 왕족이고, 정치인이며, UAE의 창시자였다. 사망할 때까지 32년 동안 두바이를 이끌었다.
그는 “언젠가 석유는 고갈된다” “우리는 석유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두바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의 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는 메르세데스를 운전했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운전했고, 그의 아들은 랜드로버를 운전하겠지만, 그의 아들은 낙타를 탈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에는 1966년에 발견되어 1969년에 생산을 시작한 두바이의 석유가 몇 세대 안에 고갈될 것이라는 현실 인식과 다음 세대의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반영되어 있다.
현재 두바이를 통치하고 있는 셰이크 모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1949~ )은 1995년 왕세자로 지명되자 수많은 국가 건설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직접 통치하며 오늘의 두바이 역사를 계속 쓰고 있다.
그가 구축한 여러 업적 중 눈여겨볼 건축물은 2022년에 개관한 두바이 ‘미래 박물관(Museum of the Future)’이다. 중앙이 비어있는 타원형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는 50년 후의 세상을 상상하며 오늘에도 좋은 두바이를 만들어 가는 ‘철학’과 ‘상상력’으로 채워져 있다. 외관의 독특한 꼬불꼬불한 무늬의 창들은 셰이크 모함마드 국왕의 미래 비전 세 가지를 아랍어 캘리그래피로 새긴 것이다.
“생명의 갱신, 문명의 진화, 인류 발전의 비결은 간단하다. 혁신이다” “미래는 상상하고 설계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백 년을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창의력의 산물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유산으로 남는다”는 뜻이다. 오늘의 두바이를 있게 한 지향점이 드러난다.
‘혁신’, ‘미래’, ‘창조’, ‘창의력의 산물’, ‘유산’ 등등 우리 단체장들도 많이 쓰는 언어지만 늘 허공에 흩어진다. 이 지역 선출직 공무원과 리더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 지역이 현재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살고 싶은 도시인가?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바이 지도자가 지향하는 점들과 그 결과물을 다시 참고해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