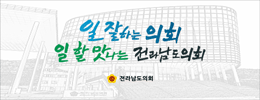우리는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 고성혁 시인
 |
시골인가 산골인가.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 1구. 여름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봄비 그친 마당에서 부남이를 바라보고 있다. 부남이. 부남이는 부곡리의 첫 글자를 따 이름 지은 수컷 진돗개고, 집 위쪽 산자락에 있는 곡순이는 부곡리의 두 번째 글자를 따 이름 지은 암컷 진돗개. 부남이는 땅바닥에 누워 졸고 곡순이는 제 집 문턱에 고개를 눕힌 채 자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피고 진 진달래와 개나리 사이 목련과 살구꽃이 피었다 졌다. 시든 꽃들을 대신하여 피는 또 다른 이팝나무 하얀 꽃 이파리가 천지사방에 너울거리는 봄. 다시 오월이 왔다. 햇볕과 후회 사이를 세월이 물결처럼 스치고 있다.
녀석들을 데리고 이곳에 들어온 지 십일 년이 넘었다. 녀석들 사람 나이로 치면 얼마쯤 될까. 우리 부부와 이 녀석들은 어떤 인연으로 묶인 것일까? 짖기는커녕 문턱에 누워 아픈 몸을 뒤척이는 녀석들을 보노라니 삶의 유한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풀을 뜯고 마당에 풀물을 토했던 녀석들을 생각한다. 방울을 딸랑거리던 녀석들의 장난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었다. 강물을 끼얹으며 아기처럼 함께 놀던 천진무구와 하얗게 콧김을 내뿜으며 힘차게 겨울들판을 달리던 본능적 질주와 땔감으로 쓸 나무토막을 함께 끌고 내려오던 산중의 파안대소를 기억한다. 아, 녀석들과의 추억들이 절절한 봄 마당. 함께 다녔던 산과 강변과 벌판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어찌하여 시절은 이리 조급한 것인지.
어느 겨울, 빈 들판에 목줄을 풀어주자 녀석들이 사라졌다. 녀석들은 일주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지만 대전에서 진도까지 집을 찾아온 전설의 진돗개 후손이니 곧 집 마당에 들어설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끝내 소식이 없었고 결국 전단지를 만들고 마을 앰프방송을 하고서야 산 넘고 물 넘은 한천면에서 녀석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 돌기둥에 묶인 부남이의 몰골은 흉흉했다. 찢어진 얼굴에 피가 말라붙었고 다리까지 절뚝였다.
그런데 그런 부남이에게 암컷 하나가 착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닌가. 그새 부남이를 사랑한 녀석이 생긴 것이다. 따로 떨어져 있던 녀석의 아내, 곡순이를 달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일로 틀어졌는지 녀석들은 그 후 단 한 번도 부부의 연을 맺지 않았다. 그 얼마 후에는 곡순이가 집을 나갔다. 큰길 건너 숲속에 있는 수도원에서 녀석을 찾았는데 신부님이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몇 번이나 풀어줬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짖으면 안 되는 수도원이라 어쩔 수 없이 유기견 보호소로 보낼 참이었는데 때맞춰 오셨네요.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리 때문인가, 아니면 부남이 때문인가. 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 좋아하던 생닭도 먹지 못해 고개를 내젓는 곡순이. 흐르는 시간 앞에 모든 게 속절없을 뿐이다. 다음 생엔 부디 목줄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이놈들의 병든 몸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남이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자꾸 부딪쳐 넘어지고 곡순이는 부기 때문에 뒷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좋은 날 꿈쩍 않고 누워만 있는 녀석들을 보노라니 가슴이 아프다. 모든 게 내 탓이다. 그동안 나의 비정함이 녀석들을 병들게 했다. 나의 늙음으로 녀석들의 늙음을 등한시했다. 아니 녀석들의 치료비와 치료 과정의 힘듦으로 녀석들을 못 본체한 나의 비루함이 녀석들을 저리 만들었다. 미안하고 미안하다. 젊은 날의 오월과, 녀석들의 병듦까지 상처가 돼 가슴을 짓누르는 봄. 내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 고독의 배출구였으니 너무나 매정한 짓이었다. 너희의 비애와 고통을 어찌할거나…. 이 풍경을 기억할게, 이별의 그날까지 너희 두 눈을 바라볼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러본다. 부남아, 곡순아….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김광섭 시 ‘저녁에’ 전문)
다시 온 오월, 사람 노릇 부족했던 그날이 되살아나 이 봄볕 아지랑이처럼 어른거린다. 그리하여 이 아픈 오월에 세상과 멀어지고 있는 너희를 바라보며 목이 멘다. 부남아, 곡순아. 정말로 미안하다. 비 그친 세상은 이렇게 찬란한데 유한한 우리 삶은 어찌하여 이리도 쓸쓸한 것이냐.
그런데 그런 부남이에게 암컷 하나가 착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닌가. 그새 부남이를 사랑한 녀석이 생긴 것이다. 따로 떨어져 있던 녀석의 아내, 곡순이를 달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일로 틀어졌는지 녀석들은 그 후 단 한 번도 부부의 연을 맺지 않았다. 그 얼마 후에는 곡순이가 집을 나갔다. 큰길 건너 숲속에 있는 수도원에서 녀석을 찾았는데 신부님이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몇 번이나 풀어줬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짖으면 안 되는 수도원이라 어쩔 수 없이 유기견 보호소로 보낼 참이었는데 때맞춰 오셨네요.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리 때문인가, 아니면 부남이 때문인가. 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 좋아하던 생닭도 먹지 못해 고개를 내젓는 곡순이. 흐르는 시간 앞에 모든 게 속절없을 뿐이다. 다음 생엔 부디 목줄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이놈들의 병든 몸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남이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자꾸 부딪쳐 넘어지고 곡순이는 부기 때문에 뒷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좋은 날 꿈쩍 않고 누워만 있는 녀석들을 보노라니 가슴이 아프다. 모든 게 내 탓이다. 그동안 나의 비정함이 녀석들을 병들게 했다. 나의 늙음으로 녀석들의 늙음을 등한시했다. 아니 녀석들의 치료비와 치료 과정의 힘듦으로 녀석들을 못 본체한 나의 비루함이 녀석들을 저리 만들었다. 미안하고 미안하다. 젊은 날의 오월과, 녀석들의 병듦까지 상처가 돼 가슴을 짓누르는 봄. 내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 고독의 배출구였으니 너무나 매정한 짓이었다. 너희의 비애와 고통을 어찌할거나…. 이 풍경을 기억할게, 이별의 그날까지 너희 두 눈을 바라볼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러본다. 부남아, 곡순아….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김광섭 시 ‘저녁에’ 전문)
다시 온 오월, 사람 노릇 부족했던 그날이 되살아나 이 봄볕 아지랑이처럼 어른거린다. 그리하여 이 아픈 오월에 세상과 멀어지고 있는 너희를 바라보며 목이 멘다. 부남아, 곡순아. 정말로 미안하다. 비 그친 세상은 이렇게 찬란한데 유한한 우리 삶은 어찌하여 이리도 쓸쓸한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