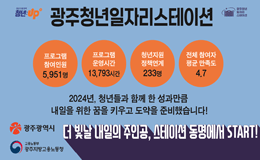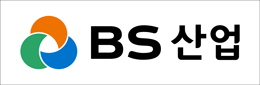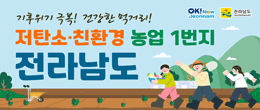[조인호의 키워드로 읽는광주·전남 미술사] 풍요와 대동세상 염원 … 민초들의 일상 보듬는 신앙처
[(1) 현세에 펼친 이상향의 세계-남도 석불 부도]
불상·토속신앙, 고단했던 삶 위로
월출산 암벽에 조성된 석가여래마애좌상
바다 바라보며 뱃길 무사 평안·풍요 빌어
운주사 석불상, 산골짜기·밭 곳곳에 모셔
이승 고달픈 이들의 한과 소망 품어 안아
무등산 원효사 동부도, 소박한 아름다움
불상·토속신앙, 고단했던 삶 위로
월출산 암벽에 조성된 석가여래마애좌상
바다 바라보며 뱃길 무사 평안·풍요 빌어
운주사 석불상, 산골짜기·밭 곳곳에 모셔
이승 고달픈 이들의 한과 소망 품어 안아
무등산 원효사 동부도, 소박한 아름다움
 더불어 사는 대동세상을 보여주는 듯한 화순 운주사 천불상. <사진=조인호 제공> |
삶을 주어진 숙명으로 받아들여 순응하거나, 힘겨운 나날들에 고뇌와 한탄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고달픈 현실에 부대끼면서도 이 너머엔 더 나은 세상이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현실을 인내하며 이상향을 꿈꾸거나, 인생살이 사는 모습은 모두가 똑같지가 않다. 저마다 개인사 희비들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생의 의지나 어딘가로 향한 소망이 공통되다 보면 신앙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혼돈과 번뇌가 그 어느 때 못지않은 요즘, 세상 곳곳에 오색찬란 연등이 줄지어 불 밝히고 교회 십자가들이 무수히 하늘로 향하듯이, 옛 시대에는 불상과 토속 신상들이 삶의 언저리에서 이승 삶을 지탱하고 피안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남도 곳곳에 조성된 수많은 옛 불상과 불교 조형물들은 고단했던 삶을 위무 받고 복덕을 빌며 내세 극락을 염원하는 귀의처였다.
◇이승에 나투신 석조 불보살상들
불교가 보편적 신앙이던 시대가 적어도 천오백여 년 이상 지나는 동안 이 땅 곳곳에는 수많은 불보살상들이 모셔졌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사찰 밖 삶의 현장 가까이에 조성한 석불상들이 일상을 보듬는 민초들의 미감 그대로의 신앙처였다. 부처님 역할 따라 달리하는 손모양(手印)과 32상 80종호 정통도상도 조성 주체가 무지렁이 기층민들일수록, 시대가 흐를수록, 자유롭게 흐트러지면서 그저 부처님이라고 인식할 수만 있으면 족했다.
정형양식을 최대한 충실히 따르면서 새김이 정교하기로는 해남 두륜산 북미륵암 석가여래마애좌상(신라 말~고쳐 초, 국보308호, 높이 4.2m)을 먼저 들 수 없다. 2004년 보호각 해체 재건공사 때 본 숲속 자연광 상태의 마애불 조각은 경주 석굴암 석가여래좌상 정형양식을 부조로 옮긴 정성 그 자체였다. 자비로운 미소와 부드럽게 늘어뜨려지고 접히는 옷주름(衣褶), 네 귀퉁이에 무릎 꿇어 공양 올리는 비천상, 광배의 화염무늬 조각까지 남도 마애불 중 가장 잘 새겨진 불상이다.
이와 함께 영암 월출산 구정봉 아래 높은 암벽에 조성된 석가여래마애좌상(신라말~고려 초, 국보144호)은 높이 8.6m의 장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깊이 파낸 돋을새김 정도나 상호와 세세한 옷주름의 표현이 정교하여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멀리 영암 앞바다를 바라보며 뱃길의 무사 평안과 풍요를 염원하던 발원의 소산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지은 3층 목탑으로 법당 실내에 모시게 되어 예전 산등성이 노천불상 때와는 달라진 나주 봉황면 철천리 아미타석불입상(고려, 보물462호)도 새김의 두께나 정교함에서 손꼽히는 남도 석불상이다. 두툼한 손모양이 아미타여래 수인(施無畏 與願印)의 위아래 방향이 반대이긴 하지만 5.4m 높이에 전신의 돋을새김 정도나 광배와 상호, 옷주름, 손모양을 세세하게 새겨낸 걸작이다. 이 또한 너른 나주 들녘의 풍요와 극락정토를 기원하던 기도처였을 것이다.
그에 비하면 광주 운천사마애여래좌상(고려, 광주시유형문화재4호)은 그리 크지 않은 바위면에 새긴 2.1m 크기의 불상으로 소박한 편이다. 백석산 산등성이 자연암반에 새겨져 허름한 보호각으로 눈비를 가리다가 새로 지어진 대웅전의 주불이 되어 있다. 복부에 약함을 감싸 안은 손모양이나 상호와 옷주름이 딱딱하고 어색해서 형식화되어 보이지만 광주 시내 너머 멀리 무등산을 바라보는 약사여래 결가부좌상이다. 다른 예인 보성 유신리 마애불상(고려, 보물944호)도 높이 5m쯤의 바위에 정성들여 새겼지만 얼굴 상호나 아미타여래 구품인(九品印)과 비슷한 손모양, 옷주름 등에서 딱딱하게 형식화되어 있다.
화순의 운주사 천불상은 불상 양식이야 맞든 틀리든 내 손으로 이 땅에 미륵정토 부처님 세계를 연다는 소박한 심성의 민불들이다. 좁고 긴 골짜기 밭뙈기와 산등성이 곳곳에 세운 석불상들은 어떤 부처인지 구분하는 손모양도 상호도 옷주름도 육계도 표시만 하는 정도로 간략하게 새겨졌다. 깊숙한 바위 아래를 법당 삼아 여러 불상을 늘어놓거나 세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크고 작은 불상들을 모셨다. 무지렁이들이 꿈꾸는 부처님 세상이면서, 부처가 된 민초 자신들이 대동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습 같아 보인다. 이런 미륵정토의 꿈은 골짜기 가운데 자리한 돌법당에 등을 맞대 앉은 미륵불상과, 산 능선 위 미처 일으켜 세우지 못한 와불, 그 가까이 칠성바위들로 연결 지어 상상하기도 한다. 운주사 천불상처럼 이 땅에 현세불로 내려온 부처들은 조선시대에는 아예 마을 어귀나 길목, 들녘에 돌과 나무로 새긴 민불들이 되어 이승 고달픈 이들의 한과 소망들을 품어 안아 주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극락’이라 하듯 삶 가운데서 신과 인간이 한세상을 이루어 사바세계가 곧 극락에 이르는 구도처이자 미륵정토라 여기며 스스로를 다독이던 현세와 내세의 교차지대였던 셈이다.
◇부도에 새긴 극락정토 무등세상
이들 석불상에 비하면 세간의 신심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불가의 극락왕생 의식이 석조물로 조형된 것이 부도(浮屠)다. 부도는 스님들의 사리를 모시는 장엄물이니 일반인들과는 다른 세계다. 여러 유형의 부도들 가운데 몇몇 팔각당 부도에 새겨진 극락정토 발원은 한 시대의 정신세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국 부도의 가장 고전이자 최고 걸작은 화순 이양면의 쌍봉사 철감선사부도(868년, 국보57호)다. 부도탑을 꾸미는 상륜부는 없어졌지만 높이 2.3m로 위압감이 들지 않는 데다 전체 조형적 균형도 짜임새 있고, 층층의 새김이 유려하고 도상들이 세세해서 매력적인 부도다. 밑돌에서 탑신으로 오르는 팔각의 단마다 맞이하는 세계가 다른데, 사바세계와 극락을 경계 짓는 구름띠 속 사자들과, 그 위 극락조(가릉빈가)의 환영 연주, 연꽃잎으로 떠받든 극락의 탑신 출입문과 문고리, 사천왕과 비천상 등의 돋을새김들이 돌 같지 않게 부드럽고 정교하다.
이 쌍봉사 부도를 전형 삼아 비슷한 시기인 신라 말 고려 초에 구례 연곡사 동부도와 북부도,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영성탑,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조륜청정탑,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탑 등 팔각당 부도들이 곳곳에 조성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양식은 철감선사부도를 비슷하게 따랐어도 각 도상들 새김에서 배어나는 신심이나 유연함에서는 다들 형식화되어 보인다.
무등산 원효사 동부도(조선 중기, 광주시 유형문화재7호)는 쌍봉사와는 전혀 다르다. 기본은 팔각당이면서 낮은 받침부에 보상화무늬와 귀여운 사자상들로 한 단을 이루고 그 위에 간결한 연꽃받침과 탑신을 올렸다. 크기도 사람 키보다 살짝 큰 정도로 아담하면서 장식이 번거롭지 않아 소박함이 묻어난다. 그런데 이 부도의 백미는 지붕돌이다. 기와지붕 여덟 귀퉁이마다 용, 오소리(?), 비둘기, 거북이, 쥐, 두꺼비 등 산짐승, 날짐승, 바다생물들을 둘러 새겼다.
이는 모양이 서로 닮아 같은 조성 시기로 보이는 해남 대흥사 서산대사 청허당부도(조선 중기 17세기 초, 높이 2.7m, 보물1347호)의 지붕돌 여덟 귀퉁이에 대부분 용이 새겨진 것과도 다르다. 또한 미황사 부도들에 갖가지 산짐승, 날짐승, 바다생물들이 새겨졌지만 대개 부도들 몸돌과 받침에 한가지씩 새겨진 것과도 다르다. 승려의 무덤돌인 부도에, 그것도 왜 유독 원효사 부도에만 이렇게 여러 생명들을 한 무리를 이뤄 새겼을까. 모든 생명존재들이 등위 없이 더불어 사는 만유상생의 무등세상, 함께 극락정토로 가자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의 발원을 담아낸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이 원효사 동부도야말로 무등산의 의미와 광주정신을 실제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라 해도 억지는 아닐 것 같다.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승에 나투신 석조 불보살상들
불교가 보편적 신앙이던 시대가 적어도 천오백여 년 이상 지나는 동안 이 땅 곳곳에는 수많은 불보살상들이 모셔졌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사찰 밖 삶의 현장 가까이에 조성한 석불상들이 일상을 보듬는 민초들의 미감 그대로의 신앙처였다. 부처님 역할 따라 달리하는 손모양(手印)과 32상 80종호 정통도상도 조성 주체가 무지렁이 기층민들일수록, 시대가 흐를수록, 자유롭게 흐트러지면서 그저 부처님이라고 인식할 수만 있으면 족했다.
 2004년 보호각 해체 재건축 때의 해남 두륜산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
이와 함께 최근 지은 3층 목탑으로 법당 실내에 모시게 되어 예전 산등성이 노천불상 때와는 달라진 나주 봉황면 철천리 아미타석불입상(고려, 보물462호)도 새김의 두께나 정교함에서 손꼽히는 남도 석불상이다. 두툼한 손모양이 아미타여래 수인(施無畏 與願印)의 위아래 방향이 반대이긴 하지만 5.4m 높이에 전신의 돋을새김 정도나 광배와 상호, 옷주름, 손모양을 세세하게 새겨낸 걸작이다. 이 또한 너른 나주 들녘의 풍요와 극락정토를 기원하던 기도처였을 것이다.
그에 비하면 광주 운천사마애여래좌상(고려, 광주시유형문화재4호)은 그리 크지 않은 바위면에 새긴 2.1m 크기의 불상으로 소박한 편이다. 백석산 산등성이 자연암반에 새겨져 허름한 보호각으로 눈비를 가리다가 새로 지어진 대웅전의 주불이 되어 있다. 복부에 약함을 감싸 안은 손모양이나 상호와 옷주름이 딱딱하고 어색해서 형식화되어 보이지만 광주 시내 너머 멀리 무등산을 바라보는 약사여래 결가부좌상이다. 다른 예인 보성 유신리 마애불상(고려, 보물944호)도 높이 5m쯤의 바위에 정성들여 새겼지만 얼굴 상호나 아미타여래 구품인(九品印)과 비슷한 손모양, 옷주름 등에서 딱딱하게 형식화되어 있다.
화순의 운주사 천불상은 불상 양식이야 맞든 틀리든 내 손으로 이 땅에 미륵정토 부처님 세계를 연다는 소박한 심성의 민불들이다. 좁고 긴 골짜기 밭뙈기와 산등성이 곳곳에 세운 석불상들은 어떤 부처인지 구분하는 손모양도 상호도 옷주름도 육계도 표시만 하는 정도로 간략하게 새겨졌다. 깊숙한 바위 아래를 법당 삼아 여러 불상을 늘어놓거나 세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크고 작은 불상들을 모셨다. 무지렁이들이 꿈꾸는 부처님 세상이면서, 부처가 된 민초 자신들이 대동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습 같아 보인다. 이런 미륵정토의 꿈은 골짜기 가운데 자리한 돌법당에 등을 맞대 앉은 미륵불상과, 산 능선 위 미처 일으켜 세우지 못한 와불, 그 가까이 칠성바위들로 연결 지어 상상하기도 한다. 운주사 천불상처럼 이 땅에 현세불로 내려온 부처들은 조선시대에는 아예 마을 어귀나 길목, 들녘에 돌과 나무로 새긴 민불들이 되어 이승 고달픈 이들의 한과 소망들을 품어 안아 주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극락’이라 하듯 삶 가운데서 신과 인간이 한세상을 이루어 사바세계가 곧 극락에 이르는 구도처이자 미륵정토라 여기며 스스로를 다독이던 현세와 내세의 교차지대였던 셈이다.
 만유상생 무등세상을 새긴 듯한 무등산 원효사 동부도. |
이들 석불상에 비하면 세간의 신심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불가의 극락왕생 의식이 석조물로 조형된 것이 부도(浮屠)다. 부도는 스님들의 사리를 모시는 장엄물이니 일반인들과는 다른 세계다. 여러 유형의 부도들 가운데 몇몇 팔각당 부도에 새겨진 극락정토 발원은 한 시대의 정신세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국 부도의 가장 고전이자 최고 걸작은 화순 이양면의 쌍봉사 철감선사부도(868년, 국보57호)다. 부도탑을 꾸미는 상륜부는 없어졌지만 높이 2.3m로 위압감이 들지 않는 데다 전체 조형적 균형도 짜임새 있고, 층층의 새김이 유려하고 도상들이 세세해서 매력적인 부도다. 밑돌에서 탑신으로 오르는 팔각의 단마다 맞이하는 세계가 다른데, 사바세계와 극락을 경계 짓는 구름띠 속 사자들과, 그 위 극락조(가릉빈가)의 환영 연주, 연꽃잎으로 떠받든 극락의 탑신 출입문과 문고리, 사천왕과 비천상 등의 돋을새김들이 돌 같지 않게 부드럽고 정교하다.
이 쌍봉사 부도를 전형 삼아 비슷한 시기인 신라 말 고려 초에 구례 연곡사 동부도와 북부도,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영성탑,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조륜청정탑,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탑 등 팔각당 부도들이 곳곳에 조성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양식은 철감선사부도를 비슷하게 따랐어도 각 도상들 새김에서 배어나는 신심이나 유연함에서는 다들 형식화되어 보인다.
 우아하면서도 정교한 조각의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부도. |
이는 모양이 서로 닮아 같은 조성 시기로 보이는 해남 대흥사 서산대사 청허당부도(조선 중기 17세기 초, 높이 2.7m, 보물1347호)의 지붕돌 여덟 귀퉁이에 대부분 용이 새겨진 것과도 다르다. 또한 미황사 부도들에 갖가지 산짐승, 날짐승, 바다생물들이 새겨졌지만 대개 부도들 몸돌과 받침에 한가지씩 새겨진 것과도 다르다. 승려의 무덤돌인 부도에, 그것도 왜 유독 원효사 부도에만 이렇게 여러 생명들을 한 무리를 이뤄 새겼을까. 모든 생명존재들이 등위 없이 더불어 사는 만유상생의 무등세상, 함께 극락정토로 가자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의 발원을 담아낸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이 원효사 동부도야말로 무등산의 의미와 광주정신을 실제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라 해도 억지는 아닐 것 같다.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