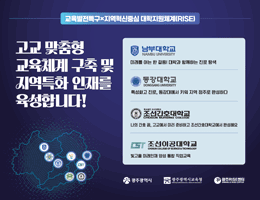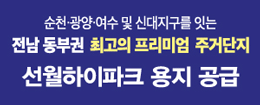붉은 신호등 아래에서- 중현 광주 증심사 주지
 |
절을 나설 때만 해도, 하늘은 그럭저럭 푸른빛을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시내에 들어서자 빌딩 위 검푸른 하늘이 금새 어둑어둑 해진다. 차를 멈춰 세우는 신호등 혼자 처연하게 붉다. 자동차로 북적이는 거리에 땅거미가 자박하게 깔린다. 인생이 아무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이라지만 붉은 신호등 혼자 덩그러니 허공에 매달려 있을 때면, 있지도 않은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듯한 몽롱한 환상에 빠져든다. 드라마와 영화로 학습한 샐러리맨의 퇴근길이 머리 속에서 재생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자동차 꽁무니의 붉은 불빛에 마음은 최면처럼 편안해진다. 이 긴 붉은 대열의 일원이라는 안도감이 차 안을 포근하게 감싼다. 온 세상이 한 편의 영화같다. 모든 사람들이 배우들이다.
소리 없이 떨어지는 빗방울도, 자유낙하를 즐기는 낙엽도 한 뼘 가로등 불빛 속으로 돌아간다. 새파란 하늘도, 요란한 거리도 전염병처럼 퍼지는 어둠속으로 돌아간다. 무슨 영문인지, 나만 홀로 거리 한복판에 우뚝 서있다. 도로 위에 멈춘 인생이 낯설다. 미지의 행성에서 갑자기 의식을 차린 SF영화의 주인공처럼 아주 긴 잠에서 깬 것만 같다. 영혼 없는 주문이 머리 속을 맴돈다. ‘이젠 돌아가야지’ 그런데 그곳은 과연 어디에 있는거지?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텅 빈 메아리 되어 차 안을 가득 채운다. 길을 잃었던가? 나만 모르는 ‘트루먼 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해질 무렵 거리가 펼치는 마법일까?
발 없는 새는 바람 속에서 쉰다지. 땅에 내리는 것은 영원한 휴식이라지. 어느 해였던가? 장국영은 만우절 이벤트처럼 자신의 죽음을 세상에 알렸다. 4월에 떠난 그는 지금 어느 거리의 신호등 아래에서 영원 같은 휴식에 취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비정전’의 장국영이 가장 장국영답다. 거칠게 흔들리면서 안으로 아픔을 삭히는 모습이 그답다. 발 없는 새는 발이 없어 멈추지 못하고, 멈추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한다.
며칠 전, 지인들과 저녁모임을 가졌다. 맛난 식사와 차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신변잡기가 오가는 자리였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의 정을 주거니 받거니 채워주는 자리였다. 이런 살가운 자리는 오래도록 잔잔한 여운으로 남는다. 혼자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감정이다. 문득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이 한 말이 떠오른다. 나이 먹어서 고독해질 자신이 없으면, 결국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꼬이게 된다고 말이다. 살가운 정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걸까? 퇴근길 도시인은 군중 속에서 고독하고, 발 없는 새는 스스로 선택한 고독에 힘겨워하고, 어떤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고독해지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부담스러워 한다. 홀로 있음을 견디지 못한다. 같이 있어도 고립감과 단절감으로 허우적거린다. 물리적인 고립은 물론, 정서적인 단절을 기피하고 두려워한다. 사람들 속에서 안정감을 구하고 사람에게 애착하지만, 타인이 주는 피곤함은 더욱 견디지 못한다. 덕분에 스마트폰은 신체 장기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환상에 빠져든다. 환상에 취하다 못해, 스마트폰 속 세상만 바라본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 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이다.”
법정스님의 책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한다. 인간에게 부족한 것은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는 용기와 끈기이다. 홀로 있음은 자신을 마주하여 나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자유롭고 독립적일 수 있다.
고독은 나 아닌 것에 기대고 의지하는 감정의 소산이며, 물리적 고립을 버거워하는 것, 즉 ‘외’롭게 있음, 다른 말로 쓸쓸함이다. 홀로 있음은 말그대로 독립(獨立)이며 그래서 자유(自由)이다.
신호등이 바뀐다. 다시 차가 달린다. 헤드라이트가 만드는 작은 원 안으로 차가운 빗방울들이 달려와 안긴다. 발 없는 새는 바람 속에서 쉬고, 도시인들은 붉은 신호등 아래에서 쉰다. 얼른 돌아가 오랜만에 ‘아비정전’을 다시 봐야겠다. 옆구리가 시리다. 어쨌든 가을이다.
며칠 전, 지인들과 저녁모임을 가졌다. 맛난 식사와 차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신변잡기가 오가는 자리였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의 정을 주거니 받거니 채워주는 자리였다. 이런 살가운 자리는 오래도록 잔잔한 여운으로 남는다. 혼자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감정이다. 문득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이 한 말이 떠오른다. 나이 먹어서 고독해질 자신이 없으면, 결국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꼬이게 된다고 말이다. 살가운 정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걸까? 퇴근길 도시인은 군중 속에서 고독하고, 발 없는 새는 스스로 선택한 고독에 힘겨워하고, 어떤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고독해지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부담스러워 한다. 홀로 있음을 견디지 못한다. 같이 있어도 고립감과 단절감으로 허우적거린다. 물리적인 고립은 물론, 정서적인 단절을 기피하고 두려워한다. 사람들 속에서 안정감을 구하고 사람에게 애착하지만, 타인이 주는 피곤함은 더욱 견디지 못한다. 덕분에 스마트폰은 신체 장기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환상에 빠져든다. 환상에 취하다 못해, 스마트폰 속 세상만 바라본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 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이다.”
법정스님의 책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한다. 인간에게 부족한 것은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는 용기와 끈기이다. 홀로 있음은 자신을 마주하여 나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자유롭고 독립적일 수 있다.
고독은 나 아닌 것에 기대고 의지하는 감정의 소산이며, 물리적 고립을 버거워하는 것, 즉 ‘외’롭게 있음, 다른 말로 쓸쓸함이다. 홀로 있음은 말그대로 독립(獨立)이며 그래서 자유(自由)이다.
신호등이 바뀐다. 다시 차가 달린다. 헤드라이트가 만드는 작은 원 안으로 차가운 빗방울들이 달려와 안긴다. 발 없는 새는 바람 속에서 쉬고, 도시인들은 붉은 신호등 아래에서 쉰다. 얼른 돌아가 오랜만에 ‘아비정전’을 다시 봐야겠다. 옆구리가 시리다. 어쨌든 가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