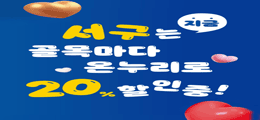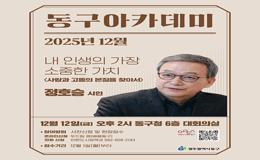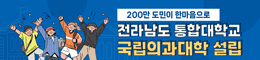아버지의 삶을 깨달은 장자의 눈물 - 최현열 광주 온교회 담임목사
 |
나는 성격속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 중 장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우연히 하와이 사람들도 모르는 ‘하와이 애국단’이라는 다큐 프로를 보게 되었다. 그 프로의 제작진은 각종 문헌을 통해 하와이 애국단의 존재와 활약상을 밝히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하와이 애국단의 단원들이 대거 하와이 외곽 소도시인 와히아와 소재 올리브연합감리교회 교인들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밝혀낸다.
천신만고 끝에 하와이 애국단원 김예준(1880~1970) 선생의 장남(김영호, 88세)을 찾아내지만 첫 반응은 “우리 아버지는 지독한 구두쇠여서 독립운동 자금을 댔을 리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왜 김씨는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전혀 모르는 것인가. 이는 김씨 가족뿐만 아니라 하와이 한인사회 일각에 만연한 분위기였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비밀결사’라는 방식을 택한 원인 외에도 이미 1920년대에 이승만 지지세력(동지회)과 반이승만 세력(국민회)으로 양분된 하와이 한인사회의 갈등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1945년 조국이 광복을 맞이했지만 1948년 이승만이 남한의 초대 대통령에 오르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오랜 기간 후원했던 국민회 출신들은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와이총영사관에서 한국행 비자 발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사탕수수 농장이나 세탁소 등지에서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임금의 절반가량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바쳤고 결국 그토록 그리던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게 된 그들이지만 결국 마음속에 고국을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70년이 흘렀고 역사는 소리 없이 단절됐다. 가족에게는 인색했던 아버지가 독립운동 자금을 댔던 중요한 인물임을 88세의 나이에 처음 알게 된 김영호씨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나는 그 장면을 통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속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 즉 장자의 모습 중에 아버지를 이해 못하며 서운함을 표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장자는 아버지의 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동생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불만을 드러낸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고 평생을 아버지의 곁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 즉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아닌, 오직 자신의 고생과 인정만이 중요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다. 주된 내용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마치 열린 결말처럼 말이다.
나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결말을 상상해 보았다. 작은 아들은 거지꼴로 돌아온 자신을 받아준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았을 것이고 큰 아들은 처음에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도 자식을 키우며 인생을 살다가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었을 것으로 상상을 해 보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장자의 깨우침’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희생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김영호씨가 뒤늦게 아버지의 삶을 인정하고 존경을 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장자의 태도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여겨진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감격 속에 지금까지 이어왔다면 이제는 장자의 깨달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에 비해 현재는 침체하고 하나님이 눈길을 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장자로 거듭날 때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돌아온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되어줄 때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왜 김씨는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전혀 모르는 것인가. 이는 김씨 가족뿐만 아니라 하와이 한인사회 일각에 만연한 분위기였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비밀결사’라는 방식을 택한 원인 외에도 이미 1920년대에 이승만 지지세력(동지회)과 반이승만 세력(국민회)으로 양분된 하와이 한인사회의 갈등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사탕수수 농장이나 세탁소 등지에서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임금의 절반가량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바쳤고 결국 그토록 그리던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게 된 그들이지만 결국 마음속에 고국을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70년이 흘렀고 역사는 소리 없이 단절됐다. 가족에게는 인색했던 아버지가 독립운동 자금을 댔던 중요한 인물임을 88세의 나이에 처음 알게 된 김영호씨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나는 그 장면을 통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속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 즉 장자의 모습 중에 아버지를 이해 못하며 서운함을 표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장자는 아버지의 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동생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불만을 드러낸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고 평생을 아버지의 곁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 즉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아닌, 오직 자신의 고생과 인정만이 중요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다. 주된 내용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마치 열린 결말처럼 말이다.
나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결말을 상상해 보았다. 작은 아들은 거지꼴로 돌아온 자신을 받아준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았을 것이고 큰 아들은 처음에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도 자식을 키우며 인생을 살다가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었을 것으로 상상을 해 보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장자의 깨우침’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희생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김영호씨가 뒤늦게 아버지의 삶을 인정하고 존경을 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장자의 태도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여겨진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감격 속에 지금까지 이어왔다면 이제는 장자의 깨달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에 비해 현재는 침체하고 하나님이 눈길을 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장자로 거듭날 때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돌아온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되어줄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