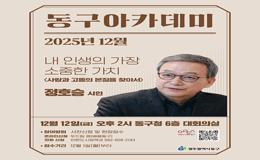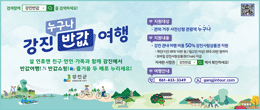삶의 축복, 불사의 형벌- 중 현 광주 증심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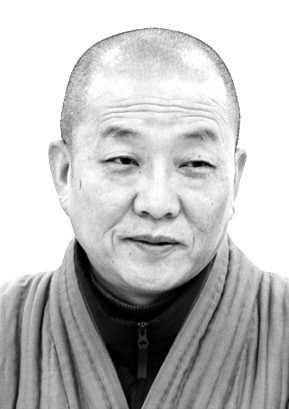 |
한창 재앙적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였다. 내가 있는 곳 역시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실내도, 그렇다고 바깥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없어서 배경이 온통 밝은 톤의 연회색으로 처리된 화면 속에 있는 듯 했다. 아예 모양이라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오로지 연회색의 색깔 뿐이었다. 대개 꿈은 깨고 나서 생각해보면 비현실적이고 황당하다. 하지만 정작 꿈 속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다.
한여름 밤의 그 꿈 역시 그랬다. 다만, 이제 나는 죽었다는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마음 한 구석이 바늘에 찔린 듯 너무나도 생생해서, 지금도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다. 씁쓸한 체념, 회한, 옅지만 지워지지 않는 슬픔, 막연한 다짐 같은 것들이 뒤섞인 매우 낯선 감정이었다.
잠이 깼다. 꿈 속의 그 감정은 깨고 나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언젠가 반드시 나는 죽는다는 확신이 잔잔하게 밀려왔다. ‘하긴, 인생은 한바탕 꿈이지…’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이젠 뭘 하지?’ 하는 아주 희미한 생각이 느낄 듯 말 듯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삶은 아주 잠깐의 공백도 결벽증적으로 용납하지 않았다. ‘산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끊임없이 할 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로구나!’ 소리 없는 탄식이 무겁게 새어 나왔다.
상어는 부레가 없다.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는다. 무엇보다 계속 움직여서 아가미로 물을 받아들여야 호흡할 수 있다. 멈추면 곧 죽음이다. 그러니 상어는 죽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 났다. 상어는 중생들의 삶이 지닌 특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살아있는 중생들은 몸이 되었건 마음이 되었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이상 살 수 없다고 산 자들은 철썩 같이 믿고 있다.
새벽 2시 2분. 몸은 꿈 밖으로 빠져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꿈 속이다. 잠시 멍하니 책상 머리에 앉아 있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유튜브에서 쇼츠 영상을 하나 봤더니 그 뒤부터 계속 추억의 팝송들만 이어졌다. ‘스모키’, ‘아바’, ‘비지스’ …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었다. 레디메이드된 감정들이 꾸역꾸역 밀려왔다. 약간의 쓸쓸함, 아련함 같은 감정들이 마구잡이로 버무려졌다. 죽음 마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싸구려 기성 제품이 되어 버린 듯했다. 그렇게라도 해서 죽음은 매순간을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지난 여름의 기억이 불쑥 소환된 것은 며칠 전 다시 본 ‘도깨비’ 때문이다. 10여년 만에 다시 본 ‘도깨비’는 불사(不死)의 형벌을 받은 자의 1인칭 시점 서사극으로 다가왔다. 김신은 전장에서 숱한 생명을 죽인 벌로 불사의 형벌을 받는다. 형벌의 삶을 이어가던 김신은 도깨비가 된다. 그 형벌을 면하는 길조차 운명적인 슬픈 사랑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어쩌면 한낱 도구에 불과할 수도 있는 사랑이다. 그러나 도깨비는 그런 사랑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불사의 형벌을 선택한다. 도깨비가 사랑한 것은 자신의 신부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었다. 그는 불사의 형벌마저도 기꺼이 사랑하기로 했다. 어쩌면 영원히 회귀하는 삶도 운명적으로 사랑하라고 했던 니체가 ‘도깨비’의 모티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도깨비에게 불사는 형벌이었지만, 삶에 취한 중생들에게 불사는 위안, 축복, 모든 행복의 근원, 너무나 당연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 존재의 든든한 토대였다. 불사의 형벌로 고통받는 존재에게 죽음은 곧 평안한 휴식이었다. 그러나 산 자에게 죽음은 미지의 두려움이다. 산 자가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심신을 움직이려는 것도 결국 죽음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삶에 중독된 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뭐하지?’라고 독백하며 삶에 조금의 틈이라도 생길까 봐 조마조마해 한다. 삶의 중단은 곧 죽음일 뿐이다.
어리석은 중생은 삶 속에 갇혀서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삶에 집착한다. 그러나 생과 사를 벗어나 생사를 바라보면, 무심하게 피고지는 생명들의 향연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자유인은 생사와 부대끼면서 생사를 초월한다.
니체는 윤회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마저도 사랑하라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침을 증득하여 윤회의 사슬을 끊어 내라 하였다. Amor fati? 니체는 과연 자신의 운명을 사랑했을까
잠이 깼다. 꿈 속의 그 감정은 깨고 나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언젠가 반드시 나는 죽는다는 확신이 잔잔하게 밀려왔다. ‘하긴, 인생은 한바탕 꿈이지…’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이젠 뭘 하지?’ 하는 아주 희미한 생각이 느낄 듯 말 듯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삶은 아주 잠깐의 공백도 결벽증적으로 용납하지 않았다. ‘산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끊임없이 할 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로구나!’ 소리 없는 탄식이 무겁게 새어 나왔다.
새벽 2시 2분. 몸은 꿈 밖으로 빠져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꿈 속이다. 잠시 멍하니 책상 머리에 앉아 있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유튜브에서 쇼츠 영상을 하나 봤더니 그 뒤부터 계속 추억의 팝송들만 이어졌다. ‘스모키’, ‘아바’, ‘비지스’ …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었다. 레디메이드된 감정들이 꾸역꾸역 밀려왔다. 약간의 쓸쓸함, 아련함 같은 감정들이 마구잡이로 버무려졌다. 죽음 마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싸구려 기성 제품이 되어 버린 듯했다. 그렇게라도 해서 죽음은 매순간을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지난 여름의 기억이 불쑥 소환된 것은 며칠 전 다시 본 ‘도깨비’ 때문이다. 10여년 만에 다시 본 ‘도깨비’는 불사(不死)의 형벌을 받은 자의 1인칭 시점 서사극으로 다가왔다. 김신은 전장에서 숱한 생명을 죽인 벌로 불사의 형벌을 받는다. 형벌의 삶을 이어가던 김신은 도깨비가 된다. 그 형벌을 면하는 길조차 운명적인 슬픈 사랑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어쩌면 한낱 도구에 불과할 수도 있는 사랑이다. 그러나 도깨비는 그런 사랑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불사의 형벌을 선택한다. 도깨비가 사랑한 것은 자신의 신부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었다. 그는 불사의 형벌마저도 기꺼이 사랑하기로 했다. 어쩌면 영원히 회귀하는 삶도 운명적으로 사랑하라고 했던 니체가 ‘도깨비’의 모티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도깨비에게 불사는 형벌이었지만, 삶에 취한 중생들에게 불사는 위안, 축복, 모든 행복의 근원, 너무나 당연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 존재의 든든한 토대였다. 불사의 형벌로 고통받는 존재에게 죽음은 곧 평안한 휴식이었다. 그러나 산 자에게 죽음은 미지의 두려움이다. 산 자가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심신을 움직이려는 것도 결국 죽음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삶에 중독된 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뭐하지?’라고 독백하며 삶에 조금의 틈이라도 생길까 봐 조마조마해 한다. 삶의 중단은 곧 죽음일 뿐이다.
어리석은 중생은 삶 속에 갇혀서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삶에 집착한다. 그러나 생과 사를 벗어나 생사를 바라보면, 무심하게 피고지는 생명들의 향연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자유인은 생사와 부대끼면서 생사를 초월한다.
니체는 윤회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마저도 사랑하라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침을 증득하여 윤회의 사슬을 끊어 내라 하였다. Amor fati? 니체는 과연 자신의 운명을 사랑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