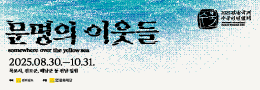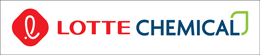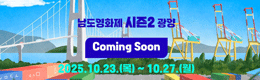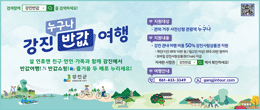아무리 걸어도 대답 없는 전화- 채희종 디지털 본부장
 |
문득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 창의 ‘즐겨 찾기’를 띄워 맨 위의 번호를 눌렀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들려왔다. 결번임을 알리는 안내음은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양 메마르고 단호하다. 안내음에 따라 상대방 이름과 번호를 확인한 뒤, 다시 한번 같은 번호를 누른다. 똑같은 메시지이지만 이번엔 한층 차가운 느낌이다. 몇 번이고 같은 터치를 되풀이한다. 두 눈 가득 고인 눈물이 흘러내리고서야 휴대폰을 덮는다.
최후까지 존엄 지키려는 몸부림들
즐겨 찾기 메뉴 맨 위 전화번호의 이름은 ‘아부지’로 편집돼 있다. 두 달전 말기암으로 죽음을 맞은 아버지의 휴대폰은 해지했지만 즐겨 찾기 상단에 있는 번호만은 지우지 못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두 달이 됐지만 부모를 보낸 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아직은 실감 나지 않는다.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는 전화, 아부지라는 이름을 확인 후 다시 걸어도 여전히 묵묵부답인 전화가 아버지의 부재를 확인시켜 준다. 실재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닿을 수 없음은 명백하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소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액정화면의 연락처 ‘아부지’ 이다. 오늘은 즐겨찾기 액정화면을 띄웠지만 누르지를 못했다. 아버지의 소멸은 과학적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상실은 아직 학습되지 않았고 날마다 새로운 슬픔으로 다가온다.
아버지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다. 아버지는 우리 시대 부모들이 그렇듯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고, 그저 자식만을 사랑한 분이었다. 다만 병상에서 암투병을 한 6개월여 동안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만은 지키려던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간병을 하는 동안 보았던, 병마와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존귀함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던 노년기 환자들의 간절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탓이다.
병실 보조침대에서 지내며 아버지 병간호를 하던 지난해 11월 중순 어느 날. 건너편 침대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여든 한 살의 말기암 환자인 할아버지와 간병하는 일흔 아홉 살의 할머니가 한치 양보도 없다. 할아버지의 몸에는 주사줄과 코줄, 오줌줄, 옆구리 줄, 각종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는 10여개 의료기기 줄들이 꽂혀 있다. 절대 움직여서는 안되는 상태였지만 할아버지는 화장실을 가겠다며 연신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냥 여기에서 봐, 괜찮아 기저귀 찼으니까. 당신은 환자니까 부끄러운 일 아냐.”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독인다.
하지만 할머니가 잠시 조는 사이 할아버지가 주사줄과 의료기기 줄들을 뽑고 말았다. 순간 의료기기 경고음이 울리면서 간호사 서너 명이 달려와 할아버지를 제압(?)한 뒤, 줄을 다시 부착하고 양손을 침대 난간에 결박하고나서야 사태가 진정됐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화장실에 가자며 졸랐고, “제발 그냥 싸라고, 싸.” 참다 못한 할머니가 악을 쓰고 만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난 뒤 설핏 잠이 든 새벽, 옆 환자의 보호자 침상에서 낮고 섧은 흐느낌이 들려온다. 30대인 듯 한 아들은 70대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두고 크게 다퉜었다. “(아들) 한 술이라도 먹어야지, 안 먹어, 그래야 약도 먹고 빨리 집에 가제. (아버지) 집에 못가 죽어서나 가제. (아들) 뭔 죽어서 가, 그럴러면 집에서 죽지.” 아버지에게 마음에 없는 모진 말을 쏟아낸 후회를 하고 있으리라. 아버지가 들을까 꾹꾹 누른 아들의 흐느낌은 어느덧 나에게로 전염된다.
갑자기 아버지가 침상에서 일어 선 채로 나를 불렀다. 아버지 바지에서 오줌이 흐르고 있었다. 침상에 소변통을 놓아두었지만 대소변만큼은 화장실에서 해결하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주사줄 때문에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실례를 한 것이다. 바지를 벗기고 하체를 닦았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장작개비 같은 다리가 슬펐지만 소변을 가리지 못해 자책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지없이 안쓰러웠다.
연명중단 넘어 안락사 공론화해야
건너 편 할아버지는 점차 의식을 잃어 일주일 뒤 격리 병실로 옮겨 생을 달리했고, 이후 아버지도 병세가 깊어지면서 떠나시는 날까지 대소변을 남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종교를 가진 어머니는 매일 기도했다. 병들어 죽는 것은 운명이지만, 제발 떠날 때 고통없이 가게 해달라 빌고 또 빌었다.
고통스럽고 비참한 생을 이어가느니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편안하게 죽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임종기에 효과 없는 의학적 시술을 안 받겠다’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한 국민이 제도 시행 5년 만에 300만명에 달한다. 또한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연명의료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발 나아가 유럽 선진국처럼 안락사나 조력 존엄사(의사 조력 자살) 도입에 찬성한다는 비율도 80%를 넘어섰다.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나 고령인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두렵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을까 걱정한다. 자녀들이 오랜 시간 병간호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적절한 시기에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이 이제는 치료가 의미 없는 순간에 자신의 삶을 환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로 확산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연명 치료 중단’은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이 시급하고, 안락사에 대한 공론화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즐겨 찾기 메뉴 맨 위 전화번호의 이름은 ‘아부지’로 편집돼 있다. 두 달전 말기암으로 죽음을 맞은 아버지의 휴대폰은 해지했지만 즐겨 찾기 상단에 있는 번호만은 지우지 못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두 달이 됐지만 부모를 보낸 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아직은 실감 나지 않는다.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는 전화, 아부지라는 이름을 확인 후 다시 걸어도 여전히 묵묵부답인 전화가 아버지의 부재를 확인시켜 준다. 실재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닿을 수 없음은 명백하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소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액정화면의 연락처 ‘아부지’ 이다. 오늘은 즐겨찾기 액정화면을 띄웠지만 누르지를 못했다. 아버지의 소멸은 과학적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상실은 아직 학습되지 않았고 날마다 새로운 슬픔으로 다가온다.
병실 보조침대에서 지내며 아버지 병간호를 하던 지난해 11월 중순 어느 날. 건너편 침대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여든 한 살의 말기암 환자인 할아버지와 간병하는 일흔 아홉 살의 할머니가 한치 양보도 없다. 할아버지의 몸에는 주사줄과 코줄, 오줌줄, 옆구리 줄, 각종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는 10여개 의료기기 줄들이 꽂혀 있다. 절대 움직여서는 안되는 상태였지만 할아버지는 화장실을 가겠다며 연신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냥 여기에서 봐, 괜찮아 기저귀 찼으니까. 당신은 환자니까 부끄러운 일 아냐.”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독인다.
하지만 할머니가 잠시 조는 사이 할아버지가 주사줄과 의료기기 줄들을 뽑고 말았다. 순간 의료기기 경고음이 울리면서 간호사 서너 명이 달려와 할아버지를 제압(?)한 뒤, 줄을 다시 부착하고 양손을 침대 난간에 결박하고나서야 사태가 진정됐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화장실에 가자며 졸랐고, “제발 그냥 싸라고, 싸.” 참다 못한 할머니가 악을 쓰고 만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난 뒤 설핏 잠이 든 새벽, 옆 환자의 보호자 침상에서 낮고 섧은 흐느낌이 들려온다. 30대인 듯 한 아들은 70대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두고 크게 다퉜었다. “(아들) 한 술이라도 먹어야지, 안 먹어, 그래야 약도 먹고 빨리 집에 가제. (아버지) 집에 못가 죽어서나 가제. (아들) 뭔 죽어서 가, 그럴러면 집에서 죽지.” 아버지에게 마음에 없는 모진 말을 쏟아낸 후회를 하고 있으리라. 아버지가 들을까 꾹꾹 누른 아들의 흐느낌은 어느덧 나에게로 전염된다.
갑자기 아버지가 침상에서 일어 선 채로 나를 불렀다. 아버지 바지에서 오줌이 흐르고 있었다. 침상에 소변통을 놓아두었지만 대소변만큼은 화장실에서 해결하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주사줄 때문에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실례를 한 것이다. 바지를 벗기고 하체를 닦았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장작개비 같은 다리가 슬펐지만 소변을 가리지 못해 자책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지없이 안쓰러웠다.
연명중단 넘어 안락사 공론화해야
건너 편 할아버지는 점차 의식을 잃어 일주일 뒤 격리 병실로 옮겨 생을 달리했고, 이후 아버지도 병세가 깊어지면서 떠나시는 날까지 대소변을 남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종교를 가진 어머니는 매일 기도했다. 병들어 죽는 것은 운명이지만, 제발 떠날 때 고통없이 가게 해달라 빌고 또 빌었다.
고통스럽고 비참한 생을 이어가느니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편안하게 죽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임종기에 효과 없는 의학적 시술을 안 받겠다’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한 국민이 제도 시행 5년 만에 300만명에 달한다. 또한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연명의료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발 나아가 유럽 선진국처럼 안락사나 조력 존엄사(의사 조력 자살) 도입에 찬성한다는 비율도 80%를 넘어섰다.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나 고령인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두렵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을까 걱정한다. 자녀들이 오랜 시간 병간호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적절한 시기에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이 이제는 치료가 의미 없는 순간에 자신의 삶을 환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로 확산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연명 치료 중단’은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이 시급하고, 안락사에 대한 공론화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