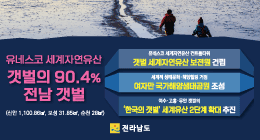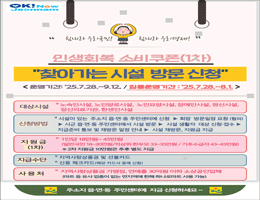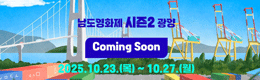비어가는 말들 - 김창균 광주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
 |
글을 읽다 보면 ‘줄곧, 계속해서’의 의미로 사용된 ‘주구장창’이 누차 눈에 띈다. ‘밤낮으로 길게 이어진 내’라는 한자의 뜻대로 ‘주야장천(晝夜長川)’이 설 자리에, 입말로 전하던 ‘주구장창’이 끼어든 것이다. 누군가는 ‘장창’이 ‘늘’을 뜻하는 특정 지역 사투리라고 주장하지만 뜻 모르는 ‘주구’에 ‘장창’을 조합하는 논리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주야장창’에 이르기까지 꼴바꿈한 표현이 널리 퍼지는 현상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구어체로만 사용되는 비표준어, 즉 ‘입말’은 시대적 감각이 잘 반영되어 언어의 생동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말이란 본디 삶의 흔적이 담긴 것이니만큼 변이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나 맥락과 의미를 잃은 채 소통되는 단어가 늘어난다면 이는 언어의 사회적 변화 이전에 감각의 무뎌짐일 수 있다.
말의 변형과 오용이 일상화된 현실은 사고의 깊이와도 연결된다. 최근 어느 한문 교사의 푸념이 누리소통망(SNS)에 올라왔다.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한자 성어를 묻는 시험 문제에 일부 학생이 ‘럭키비키’라고 답했다고 한다. 표리부동(表裏不同)은 ‘겉바속촉’이란다. 언뜻 보면 웃음을 자아내는 해프닝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교육적 토대를 돌아보게 된다. 이 짧은 오답에 고전적 교양의 축소, 상식의 약화, 그리고 언어의 맥락 상실 문제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뜻 이상의 통찰을 담아 시대를 불문하고 유용한 교훈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 ‘변방 노인의 말[馬]’을 통해 이어지는 일련의 서사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깨우침을 전승한다. 이처럼 새옹지마는 현실과 동떨어진 고답적 어휘가 아니라 삶을 읽어내는 깊이 있는 언어다. 그런데 이 지혜가 럭키비키라는 말장난에 덮이고 만다면 이는 엉뚱하면서도 치기 어린 오답이라기보다는 교육이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위기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고전은 때로 시험의 지문에만 존재하고 상식은 시험 범위를 벗어난 잡지식으로 취급된다. 얼마나 빨리 정답을 고르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현실에서 철학적 사고는 설 자리를 잃어간다. 생각하는 힘이 사라진 곳에서는 단어는 있되 맥락이 없고 말이 있으나 함의는 증발한다. 그 결과가 용호상박(龍虎相搏)이나 호각지세(互角之勢)를 대신해 ‘자강두천’(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 등장하는 식이다.
이것은 단지 언어의 실종이 아니라 사고의 정지나 진배없다. 물론 한자 성어 하나를 모른다고 세상이 무너질 일은 아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지혜가 계승되지 않는 교육,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반성은 필요한 법이다. 공통의 문화와 역사 인식에 기반한 비판적 사고의 틀이 사라진, 즉 생각을 멈춘 사회는 이른바 ‘사고의 정지 버튼’을 누른 것과 같으니 말이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의 ‘밈(meme, 패러디되고 변조되며 퍼지는 문화 요소)’으로 수용된다는 사실이다. ‘자강두천’은 수준 낮은 싸움을 비꼬는 의미로 확장되며 ‘자강두바’(자존심 강한 두 바보의 대결)와 함께 조롱의 의미로 용례가 바뀌고 있다. 이처럼 패러디와 웃음의 소재로써 언어가 소비될 때 우리는 그 안에 감춰진 공백을 보지 못하게 된다.
언어는 결국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흐릿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마찬가지 길을 걷게 된다. 말의 의미가 사라지고 맥락이 지워진 자리에 남은 공허한 말장난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저 ‘말’이 아니라 ‘뜻’을 되살려야 한다. 지나쳐 가는 유행일지라도 난용(亂用)되는 언어를 보며 우리 사회가 깊이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일이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말의 껍데기만 남은 시대에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언어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말장난이나 유행을 넘어서 사고의 수준과 교육의 방향을 되묻는 반성의 계기여야 한다. 표현이 넘쳐나는 지금, 언어의 깊이를 되살리는 일은 옛말 지키기를 넘어 함께 사유하고 성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걸음마다.
말의 변형과 오용이 일상화된 현실은 사고의 깊이와도 연결된다. 최근 어느 한문 교사의 푸념이 누리소통망(SNS)에 올라왔다.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한자 성어를 묻는 시험 문제에 일부 학생이 ‘럭키비키’라고 답했다고 한다. 표리부동(表裏不同)은 ‘겉바속촉’이란다. 언뜻 보면 웃음을 자아내는 해프닝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교육적 토대를 돌아보게 된다. 이 짧은 오답에 고전적 교양의 축소, 상식의 약화, 그리고 언어의 맥락 상실 문제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서 고전은 때로 시험의 지문에만 존재하고 상식은 시험 범위를 벗어난 잡지식으로 취급된다. 얼마나 빨리 정답을 고르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현실에서 철학적 사고는 설 자리를 잃어간다. 생각하는 힘이 사라진 곳에서는 단어는 있되 맥락이 없고 말이 있으나 함의는 증발한다. 그 결과가 용호상박(龍虎相搏)이나 호각지세(互角之勢)를 대신해 ‘자강두천’(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 등장하는 식이다.
이것은 단지 언어의 실종이 아니라 사고의 정지나 진배없다. 물론 한자 성어 하나를 모른다고 세상이 무너질 일은 아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지혜가 계승되지 않는 교육,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반성은 필요한 법이다. 공통의 문화와 역사 인식에 기반한 비판적 사고의 틀이 사라진, 즉 생각을 멈춘 사회는 이른바 ‘사고의 정지 버튼’을 누른 것과 같으니 말이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의 ‘밈(meme, 패러디되고 변조되며 퍼지는 문화 요소)’으로 수용된다는 사실이다. ‘자강두천’은 수준 낮은 싸움을 비꼬는 의미로 확장되며 ‘자강두바’(자존심 강한 두 바보의 대결)와 함께 조롱의 의미로 용례가 바뀌고 있다. 이처럼 패러디와 웃음의 소재로써 언어가 소비될 때 우리는 그 안에 감춰진 공백을 보지 못하게 된다.
언어는 결국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흐릿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마찬가지 길을 걷게 된다. 말의 의미가 사라지고 맥락이 지워진 자리에 남은 공허한 말장난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저 ‘말’이 아니라 ‘뜻’을 되살려야 한다. 지나쳐 가는 유행일지라도 난용(亂用)되는 언어를 보며 우리 사회가 깊이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일이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말의 껍데기만 남은 시대에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언어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말장난이나 유행을 넘어서 사고의 수준과 교육의 방향을 되묻는 반성의 계기여야 한다. 표현이 넘쳐나는 지금, 언어의 깊이를 되살리는 일은 옛말 지키기를 넘어 함께 사유하고 성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걸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