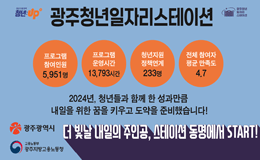모진 세월 가슴을 썩여 온 그 얘기, 4·3…제주도우다 1~3
현기영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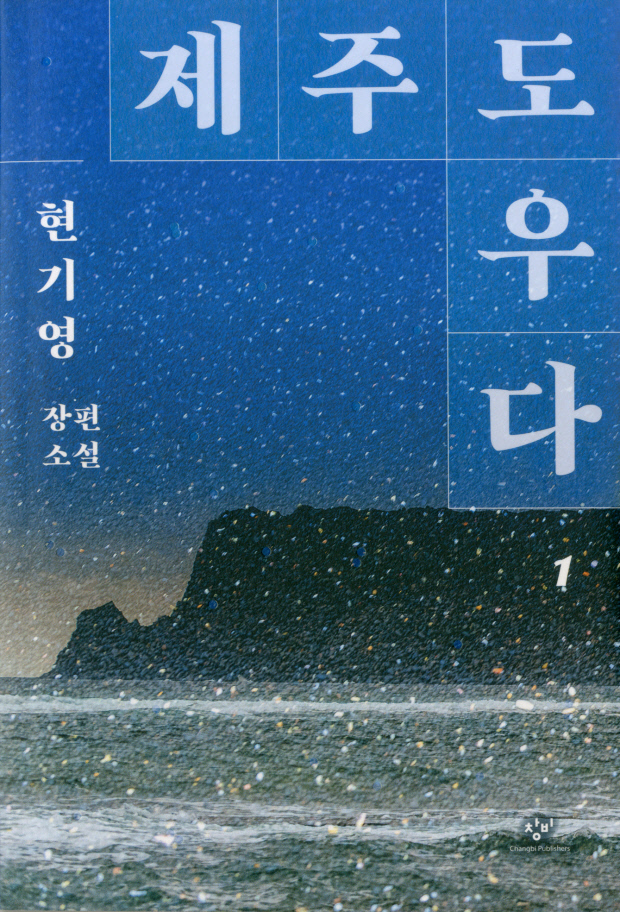 |
“우리는 북조선도, 남조선도 아니고 제주도우다(입니다).”
해방되고 삼팔선이 그어진 직후,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에서 귀향하려는 이들에게 “남과 북 중에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 제주 사람들은 한결같이 답했다. 좌·우익으로 구분 짓던 해방공간에서도 답은 마찬가지였다. 제주 청년들은 고향 땅 흙 한줌을 무명천에 곱게 싸서 떠났고, 귀향해 제주 땅을 밟을 때도 엎드려 얼굴을 흙에 부볐다. ‘제주도우다’라는 제주 토박이말에는 육지 사람들에게 ‘물 건너 한번 들어오면 다시 나가기 어려운 망망대해, 거친 파도 속의 원악도(遠惡島)’인 제주 섬사람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오롯이 담겨있다.
현기영(83) 작가가 최근 1948년 4·3을 정면으로 다루는 대하소설 ‘제주도우다’(전 3권)를 펴냈다. 독재정권 시절이던 1978년에 단편소설 ‘순이 삼촌’을 발표한지 45년 만에 선보이는 역작이다. 작품은 16살 때 4·3의 소용돌이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끌려갔던 안창세가 다큐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30대 외손녀 부부에게 ‘모진 세월 내 가슴을 썩여온 그 얘기’를 회고 형식으로 들려주며 전개된다. 시기적으로는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3년부터 4·3 토벌이 이뤄진 1948년 겨울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11살부터 16살까지 5년 동안 격변의 제주 현대사를 고스란히 겪은 노인 안창세는 자신을 ‘살아있는 죽은 자’’라고 표현한다.
“그 사건 후로는 모든 게 헛것으로 보여 무얼 쓸 수가 없었어. 모든 것이 헛것이고 그 사건만이 진실인데, 당최 그걸 쓸 엄두가 안 나는 거라. 무서워서. 그걸 글로 써야 하는데, 그걸 쓰고 싶은데 무서워서 말이야. 어, 지금도 무서워……”
어릴 적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안창세의 말이 작가의 목소리와 오버랩된다. 작가는 누구도 4·3을 차마 입 밖에 올리지 못하던 엄혹한 때에 ‘순이 삼촌’을 발표한 후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투옥됐다. 그럼에도 작가는 이후에도 4·3을 일생의 화두(話頭)로 삼아 끊임없이 작품을 썼고 이번에 기념비적 역작을 내놓았다. 작가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이 작품은 4·3영령들이 제게 명령해서 쓴 거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꼬박 4년을 매달려 완성한 팔순 작가의 집필 의도는 ‘작가의 말’에서 드러난다.
“그 당시 청년들을 사로잡았던 열정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들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는지, 삶과 죽음은 무엇이고 인간은 또 무엇인지를 작가는 이 소설에서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작가는 1940년대 태평양 전쟁 말기부터 해방을 거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세우지는 1948년까지의 시대상황과 제주 사람들의 대응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1권은 1943년부터 해방까지, 2권은 해방부터 1948년 3·1절 총격사건 까지, 3권은 4·3의 전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야기는 이민하와 정두길, 부대림, 양순태, 고승우, 박털보, 장영발 등 청년활동가를 중심에 두고, 제주 어느 지역보다 항일 투사를 많이 배출해 ‘역향’(逆鄕·반역의 땅)이라는 별칭을 얻은 해변마을 조천리를 주무대로 삼아 펼쳐진다. 작가의 시선을 따라 해방 이듬해 닥친 대흉년과 굶주림, 전염병 창궐, 친일파 재등용, 단독정부 추진 등 제주의 상황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어느 해 제주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굶주린 백성을 위해 나주 영산포 기민창을 찾아가 양곡을 싣고 돌아오며 겪었다는 새콧알(조천포) ‘구렁배암 설문대할망’ 전설 등 소설 곳곳에 제주의 풍광과 정서가 배어있다.
‘일제에 의해 세뇌되었던 정신을 깨는 무서운 천둥벼락’과도 같았던 해방을 맞아 새나라 건설을 꿈꾸던 청년들의 열망은 국가폭력에 의해 꺾이고 만다. 해녀와 테우리(마소를 방목해 키우는 사람)로 사는 평범한 젊은 여성들도 희생되고 만다.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국가의 폭력에 내몰려 희생당한 제주 원혼들을 위로한다. 3권에서 토벌에 나선 군·경과 서북청년단 등 국가의 가혹한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하는 민초들의 모습은 독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75년 전 일어난 제주 4·3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현대사의 뿌리를 찾아나서는 발걸음은 제주 4·3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여전히 좌·우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결하는 현 상황 속에서 과거사를 설원(雪怨)할 해법이 ‘제주도우다’에 녹아있다.
<창비·각 1만7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해방되고 삼팔선이 그어진 직후,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에서 귀향하려는 이들에게 “남과 북 중에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 제주 사람들은 한결같이 답했다. 좌·우익으로 구분 짓던 해방공간에서도 답은 마찬가지였다. 제주 청년들은 고향 땅 흙 한줌을 무명천에 곱게 싸서 떠났고, 귀향해 제주 땅을 밟을 때도 엎드려 얼굴을 흙에 부볐다. ‘제주도우다’라는 제주 토박이말에는 육지 사람들에게 ‘물 건너 한번 들어오면 다시 나가기 어려운 망망대해, 거친 파도 속의 원악도(遠惡島)’인 제주 섬사람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오롯이 담겨있다.
어릴 적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안창세의 말이 작가의 목소리와 오버랩된다. 작가는 누구도 4·3을 차마 입 밖에 올리지 못하던 엄혹한 때에 ‘순이 삼촌’을 발표한 후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투옥됐다. 그럼에도 작가는 이후에도 4·3을 일생의 화두(話頭)로 삼아 끊임없이 작품을 썼고 이번에 기념비적 역작을 내놓았다. 작가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이 작품은 4·3영령들이 제게 명령해서 쓴 거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꼬박 4년을 매달려 완성한 팔순 작가의 집필 의도는 ‘작가의 말’에서 드러난다.
“그 당시 청년들을 사로잡았던 열정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들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는지, 삶과 죽음은 무엇이고 인간은 또 무엇인지를 작가는 이 소설에서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작가는 1940년대 태평양 전쟁 말기부터 해방을 거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세우지는 1948년까지의 시대상황과 제주 사람들의 대응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1권은 1943년부터 해방까지, 2권은 해방부터 1948년 3·1절 총격사건 까지, 3권은 4·3의 전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주 4·3 당시 눈보라 속에서 희생된 25살 어머니(변병생)와 두 살배기 딸의 실화를 토대로 제작된 작품 ‘비설’(飛雪). <광주일보 DB> |
‘일제에 의해 세뇌되었던 정신을 깨는 무서운 천둥벼락’과도 같았던 해방을 맞아 새나라 건설을 꿈꾸던 청년들의 열망은 국가폭력에 의해 꺾이고 만다. 해녀와 테우리(마소를 방목해 키우는 사람)로 사는 평범한 젊은 여성들도 희생되고 만다.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국가의 폭력에 내몰려 희생당한 제주 원혼들을 위로한다. 3권에서 토벌에 나선 군·경과 서북청년단 등 국가의 가혹한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하는 민초들의 모습은 독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75년 전 일어난 제주 4·3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현대사의 뿌리를 찾아나서는 발걸음은 제주 4·3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여전히 좌·우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결하는 현 상황 속에서 과거사를 설원(雪怨)할 해법이 ‘제주도우다’에 녹아있다.
<창비·각 1만7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