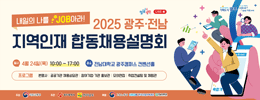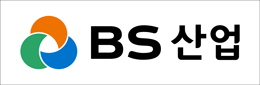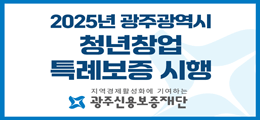선거제 개편, 기득권과 당리당략 넘어서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엊그제 현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올릴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은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전국을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것은 같다. 다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른 병립형으로 하거나, 의석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으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 두 안은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같지만 비례대표는 현재(47석)보다 50석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 의원 정수가 350석으로 증가하게 된다.
세 번째 안은 대도시의 경우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권역별·병립형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국회는 현 21대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개편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지만,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구조로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켜 민심과 괴리가 크고,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및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등 폐단이 크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 제도 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이유다. 그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또다시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된다면 정치 개혁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기대한다.
개편안은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전국을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것은 같다. 다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른 병립형으로 하거나, 의석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으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 두 안은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같지만 비례대표는 현재(47석)보다 50석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 의원 정수가 350석으로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