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소재·부품산업 비중 1.9% ‘국산화’ 지원 받을 기업이 없다
광주 39·전남 17·전북 34곳
일 수출규제 대응 전폭 지원 속
호남은 기업 없어 ‘그림의 떡’
영남권 2324곳 … 절반 차지
일 수출규제 대응 전폭 지원 속
호남은 기업 없어 ‘그림의 떡’
영남권 2324곳 … 절반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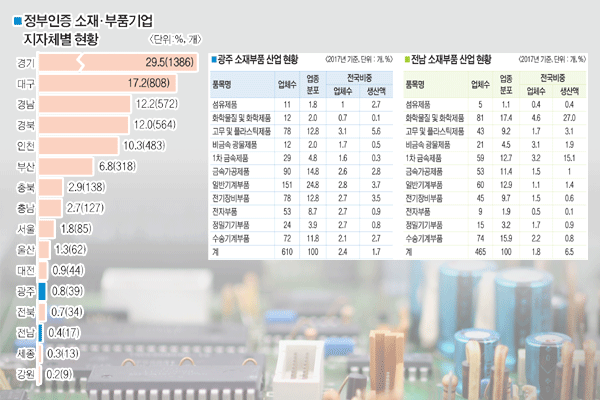 |
한·일 경제전쟁이 격화하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기조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로 정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완제품 생산 방식에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책 방향과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광주·전남 지역은 정부 정책 지원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보니 정책 지원을 받을 중소기업이 없다는 볼멘소리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이날 현재 소재·부품 분야 정부 인증을 받은 전문기업은 전국적으로 4699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지역이 전체 29.5%인 138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 17.2%(808), 경남 12.2%(572), 경북 12.0%(564), 인천 10.3%(483), 부산 6.8%(318) 순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39·17곳으로 전체 비중이 0.8%와 0.4%에 불과했다. 전북도 34곳, 0.7%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2324곳으로 전체의 절반인 49.5%를 차지했고, 수도권은 1956곳으로 41.6%였다. 영남권과 수도권을 합하면 91.1%로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이 곳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권은 6.9%였으며, 호남권은 1.9%로, 채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업부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총 매출액 가운데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전문기업으로 확정되면 3년간 지위를 인정받는다.소재·부품 전문기업에게는 은 인력(병역지정업체)·금융·기술개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지역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지난달 30일 새로 인증을 받은 ㈜이노글로벌·삼성스텐레스상공㈜ 등 39곳이다. 북구 첨단산단에 22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광산구 하남산단·평동산단 등에 17곳이 있다.
업종별로는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과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전자 부품·장비 각각 6곳, 주형 및 금형 제조업과 자동차부품제조업이 각각 4곳으로 광주시 주력 산업인 자동차·가전·광산업 분야가 3분의 2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소재·부품 산업은 광주보다 더 취약했다. 이는 전남의 산업구조가 동부권 중심의 석유화학·철강 등 장치산업에 쏠려있는 데다, 울산·포항의 산업구조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는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의 지역별 전문기업 분포를 보면 여수·순천·광양지역이 각각 1곳에 그친데 반해 조선업 중심의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은 5곳, 영광이 2곳이었다. 광주 인근 담양 2곳, 장성·나주가 각각 1곳이었다. 이들 지역은 광주 대표 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으로 보인다.
전문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소재·부품 관련 기업 2만5869곳 가운데 광주는 610곳(2.4%), 전남은 465곳(1.8%)에 그쳤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보니 정부의 관련 산업 집중 육성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은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 등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등 23개 기관으로 구성된 광주·전남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는 19일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업체들에 대한 정보공유가 시급하다”며 관련 기업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정책 방향과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광주·전남 지역은 정부 정책 지원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보니 정책 지원을 받을 중소기업이 없다는 볼멘소리다.
이 중 경기지역이 전체 29.5%인 138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 17.2%(808), 경남 12.2%(572), 경북 12.0%(564), 인천 10.3%(483), 부산 6.8%(318) 순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39·17곳으로 전체 비중이 0.8%와 0.4%에 불과했다. 전북도 34곳, 0.7%에 그쳤다.
산업부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총 매출액 가운데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전문기업으로 확정되면 3년간 지위를 인정받는다.소재·부품 전문기업에게는 은 인력(병역지정업체)·금융·기술개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지역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지난달 30일 새로 인증을 받은 ㈜이노글로벌·삼성스텐레스상공㈜ 등 39곳이다. 북구 첨단산단에 22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광산구 하남산단·평동산단 등에 17곳이 있다.
업종별로는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과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전자 부품·장비 각각 6곳, 주형 및 금형 제조업과 자동차부품제조업이 각각 4곳으로 광주시 주력 산업인 자동차·가전·광산업 분야가 3분의 2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소재·부품 산업은 광주보다 더 취약했다. 이는 전남의 산업구조가 동부권 중심의 석유화학·철강 등 장치산업에 쏠려있는 데다, 울산·포항의 산업구조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는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의 지역별 전문기업 분포를 보면 여수·순천·광양지역이 각각 1곳에 그친데 반해 조선업 중심의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은 5곳, 영광이 2곳이었다. 광주 인근 담양 2곳, 장성·나주가 각각 1곳이었다. 이들 지역은 광주 대표 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으로 보인다.
전문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소재·부품 관련 기업 2만5869곳 가운데 광주는 610곳(2.4%), 전남은 465곳(1.8%)에 그쳤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보니 정부의 관련 산업 집중 육성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은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 등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등 23개 기관으로 구성된 광주·전남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는 19일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업체들에 대한 정보공유가 시급하다”며 관련 기업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