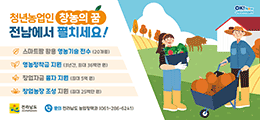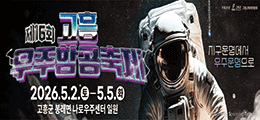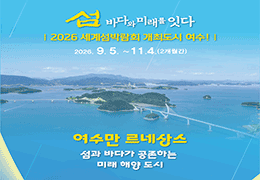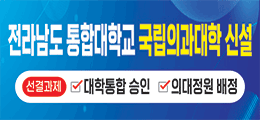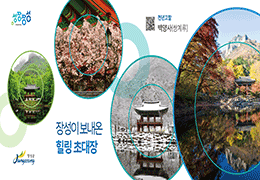[이덕일의 ‘역사의 창’] 헌법 개정 논의에서 빠진 것들
 |
아주 오래 전에 한국 법률 체계가 대륙법 체계라는 말을 듣고 의아했던 기억이 있다. 프러시아(프로이센:독일) 법체계를 따랐다는 것인데, 우리가 독일과 얼마나 가깝다고 독일 법체계를 따른 것일까?
한국 사회에 의문이 있을 때는 일제 강점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된다. 한국이 대륙법 체계를 따른다는 말은 일제의 메이지 헌법과 법률을 따른다는 뜻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만든 메이지(明治) 헌법과 법률을 따른다는 뜻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71년 11월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사절단의 일행으로 미국으로 갔다. 미국은 자신들이 개국시킨 나라에서 온 이와쿠라 사절단을 크게 반겼지만 문물 시찰 외의 구체적인 요구, 즉 1854년에 페리 제독과 맺은 치외법권 폐기를 포함한 불평등조약의 개정은 거부했다. 일본은 헌법도 없고 재판도 구미 각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것이 조선과 일본의 큰 차이였다. 조선은 물론 고려도 전국에 통용되는 단일한 법체계를 갖고 있었지만 일본은 열도 전체에 통용되는 법체계를 갖고 있지 못했다. 조선은 함경도에서 저지르든 제주도에서 저지르든, 같은 범죄에는 같은 처벌을 했지만 일본은 아니었다. 각 영주가 다스리는 쿠니(國)마다 법이 달랐다.
이토오 등은 헌법을 제정하기로 마음먹고 미국과 유럽의 헌법을 연구했다. 미국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나라니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영국은 국왕이 있었지만 의회의 권한이 강한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니 역시 대상이 아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82년 다시 유럽으로 가서 헌법을 연구했는데, 황제의 전제권이 강력했던 프러시아헌법이 마음에 들었다.
이토는 독일 황제 빌헬름 1세를 예방해 “프러시아 헌법이 일본에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는 독일 헌법학계의 권위자인 베를린대학의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Rudolph von Gneist) 교수를 소개했다. 이토는 독일 헌법을 일본식으로 응용해 메이지 헌법을 만들었다. 하위 법률도 독일식을 따랐다.
이토는 사민평등(四民平等,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 일)을 주장하던 민권론자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의 요구를 일축하고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 천황이 통치한다’(제1조)고 규정한 메이지 헌법을 만들고, 일왕 메이지는 1889년 2월 11일 국민에게 헌법을 하사하는 헌법 반포식을 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대륙법을 따르게 된 슬픈 유래다.
더욱 웃기는 것은 일제는 강점 후 한국을 메이지 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메이지 헌법이 아니라 ‘대권’(大權)에 의해 통치하기로 결정했는데, 대권이란 일왕의 자의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일왕이 임명하는 조선 총독이 일체의 입법·사법·행정권을 독점했다. 메이지 헌법을 적용하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총선거를 실시해 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내각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의정부나 대간(臺諫)처럼 국왕의 전제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전혀 없었다.
현행 헌법은 이른바 87년 체제에 의해서 탄생한 것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에 따라 헌법도 달라질 때가 되었다. 조선은 향약 등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향촌 자치권을 향유하던 사회였고, 법도 이런 정신 속에서 운용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법 시행에서 민중들을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그래야 독립운동가들을 마음대로 때려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문제가 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도 1912년 일제가 만든 조선형사령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을 개정한다면 일제가 아니라 우리 선조의 법철학과 운용 정신을 살려서 국민이 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유엔이 정한 각종 인권 조항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유엔 인권 권고 수준에도 미달하면서 북한 인권을 말하는 것도 모순이다. 헌법 개정 때 이런 점들이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한국 사회에 의문이 있을 때는 일제 강점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된다. 한국이 대륙법 체계를 따른다는 말은 일제의 메이지 헌법과 법률을 따른다는 뜻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만든 메이지(明治) 헌법과 법률을 따른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조선과 일본의 큰 차이였다. 조선은 물론 고려도 전국에 통용되는 단일한 법체계를 갖고 있었지만 일본은 열도 전체에 통용되는 법체계를 갖고 있지 못했다. 조선은 함경도에서 저지르든 제주도에서 저지르든, 같은 범죄에는 같은 처벌을 했지만 일본은 아니었다. 각 영주가 다스리는 쿠니(國)마다 법이 달랐다.
이토는 독일 황제 빌헬름 1세를 예방해 “프러시아 헌법이 일본에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는 독일 헌법학계의 권위자인 베를린대학의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Rudolph von Gneist) 교수를 소개했다. 이토는 독일 헌법을 일본식으로 응용해 메이지 헌법을 만들었다. 하위 법률도 독일식을 따랐다.
이토는 사민평등(四民平等,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 일)을 주장하던 민권론자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의 요구를 일축하고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 천황이 통치한다’(제1조)고 규정한 메이지 헌법을 만들고, 일왕 메이지는 1889년 2월 11일 국민에게 헌법을 하사하는 헌법 반포식을 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대륙법을 따르게 된 슬픈 유래다.
더욱 웃기는 것은 일제는 강점 후 한국을 메이지 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메이지 헌법이 아니라 ‘대권’(大權)에 의해 통치하기로 결정했는데, 대권이란 일왕의 자의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일왕이 임명하는 조선 총독이 일체의 입법·사법·행정권을 독점했다. 메이지 헌법을 적용하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총선거를 실시해 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내각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의정부나 대간(臺諫)처럼 국왕의 전제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전혀 없었다.
현행 헌법은 이른바 87년 체제에 의해서 탄생한 것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에 따라 헌법도 달라질 때가 되었다. 조선은 향약 등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향촌 자치권을 향유하던 사회였고, 법도 이런 정신 속에서 운용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법 시행에서 민중들을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그래야 독립운동가들을 마음대로 때려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문제가 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도 1912년 일제가 만든 조선형사령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을 개정한다면 일제가 아니라 우리 선조의 법철학과 운용 정신을 살려서 국민이 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유엔이 정한 각종 인권 조항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유엔 인권 권고 수준에도 미달하면서 북한 인권을 말하는 것도 모순이다. 헌법 개정 때 이런 점들이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