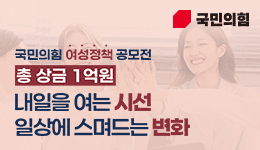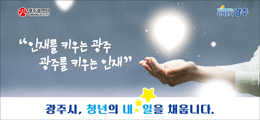[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천원 김밥의 현대사
 |
가을은 전국이 축제의 계절이다. 올해는 경북 김천의 김밥 축제가 큰 주목을 받았다. 안 그래도 이른바 케이푸드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김밥도 덩달아 인기 음식이 된 상황이었다. 김밥은 한국인 영혼의 음식이 된 지 오래다. 요즘은 체험학습으로 불리는 그 옛날 소풍의 단골이었다. 어쩌면 김밥을 먹기 위해 소풍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반에서 능력이 되는 집에서는 선생님 김밥도 쌌다. 사실 이면에는 고통도 있었다. 우리집도 그랬는데, 시간도 돈도 없어서 김밥 싸기 힘든 어머니는 소풍을 보내지 않으시려 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12번의 소풍이 있는데, 아마도 서너 번은 그렇게 빠졌던 것 같다. 한 반에 대여섯 명은 소풍을 가지 못했다. 그렇다고 나머지도 모두 김밥을 싸서 간 건 아니었다. 평소같은 보리밥 도시락을 싸는 집도 꽤 있었다. 쭈뼛거리며 김치와 어묵볶음이 든 도시락을 꺼내던 친구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달걀부침이라도 한 장 올라갔던 것 같기도 하다. 그 친구들은 무얼 하고 있을까. 1970년대였다.
김밥은 그렇게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회사와 작업장마다 야유회라는 걸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님의 낡은 앨범을 한번 보시라. 계원들이나 회사 동료들과 떠난 야유회 사진이 발견될 것이다. 그때 음식은 각자 마련하기도 했지만 식당에 맡기기도 했다. 얇게 켠 나무도시락에 김밥을 담아 파는 게 당시 식당의 괜찮은 돈벌이였다. 내가 그걸 기억하는 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부모 어느 한 쪽의 야유회를 따라갔었기 때문이다. 눈부신 햇빛과 참기름 냄새가 지금도 선명하다. 노란 단무지의 색소가 나무도시락에 배어 있던 색깔도 아른거린다.
김밥이 국민음식이 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김밥은 고급 음식이었다. 앞서 소풍이나 야유회의 음식이었다는 건, 놀러가는 일상이 흔하지 않던 과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벼르고 별러서 먹었다고나 할까.
김밥이 고급인 이유는 우선 김이 싸지 않았다. 설비가 좋아지고 김 양식의 절대량이 늘어난 1980년대 중후반, 식탁용 김이 가정집에 오르는 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 전까지는 살만한 집에서 김을 한 첩(10장) 사서 기름과 소금 발라서 어머니가 일일이 구워서 밥상에 올리던 존재였다. 잘 구운 김이 포장지에 얌전하게 들어앉아 아무 때나 꺼내먹을 수 있는, 학생 도시락 반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그 전 시대만 해도 단 한 명도 없었으리라.
전라남도에 김 양식이 엄청나게 늘면서 한국인은 김만큼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됐다. 지금 뜨고 있는 케이푸드 중에 김과 김 가공품이 있는데, 수 년 전만 해도 김을 서양인은 ‘블랙 페이퍼’라고 불렀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이상한 종이를 먹는다고 비하하곤 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건강에 좋고 맛있다고 난리가 났다.
김밥이 우리의 일상 음식이 된 것은 김 생산량이 폭증한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독특한 경제사회사가 있다.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이 분식 장려 드라이브를 걸던 때였다. 식량 공급으로 독재정권의 원성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식당에서 밥 파는 것을 통제하고 통일벼 생산 독려도 벌어졌다. 우리가 먹는 공깃밥이 그때 탄생한다. 퍼주는 밥의 절대량을 줄이려는 의도였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종목이 분식집이었다. 인구폭발로 늘어나는 학생과 노동자들은 값싼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국수를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쌀 생산량이 안정되자 분식 강제 정책은 사라졌다. 분식집에서도 쌀밥을 지어 팔았다.
오징어덮밥, 비빔밥이 분식집 메뉴가 된 것이 그 무렵이다. 여기에다 앞서 밝힌 것처럼 김 값이 크게 내려가자 김밥을 만드는 분식집도 생겨났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김밥 전문점도 등장한다. 김밥을 주력으로 파는 체인점도 번성하기 시작한다. 천원 김밥의 탄생이다. 이 흐름에는 배경이 있다. 이른바 ‘이모 노동력’이라고 하는, 인구가 많던 1940~50년대생 아주머니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던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들 세대가 은퇴하자 조선족 동포 여성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지금 김밥 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런 노동자들의 퇴장과 관련이 있다. 천원 김밥의 신화 뒤에는 조용히 스러져간 ‘이모’들의 희생이 있었다. 김밥 한 줄로 드러나는 현대사의 한 구비였다.
<음식 칼럼니스트>
김밥이 국민음식이 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김밥은 고급 음식이었다. 앞서 소풍이나 야유회의 음식이었다는 건, 놀러가는 일상이 흔하지 않던 과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벼르고 별러서 먹었다고나 할까.
김밥이 고급인 이유는 우선 김이 싸지 않았다. 설비가 좋아지고 김 양식의 절대량이 늘어난 1980년대 중후반, 식탁용 김이 가정집에 오르는 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 전까지는 살만한 집에서 김을 한 첩(10장) 사서 기름과 소금 발라서 어머니가 일일이 구워서 밥상에 올리던 존재였다. 잘 구운 김이 포장지에 얌전하게 들어앉아 아무 때나 꺼내먹을 수 있는, 학생 도시락 반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그 전 시대만 해도 단 한 명도 없었으리라.
전라남도에 김 양식이 엄청나게 늘면서 한국인은 김만큼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됐다. 지금 뜨고 있는 케이푸드 중에 김과 김 가공품이 있는데, 수 년 전만 해도 김을 서양인은 ‘블랙 페이퍼’라고 불렀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이상한 종이를 먹는다고 비하하곤 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건강에 좋고 맛있다고 난리가 났다.
김밥이 우리의 일상 음식이 된 것은 김 생산량이 폭증한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독특한 경제사회사가 있다.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이 분식 장려 드라이브를 걸던 때였다. 식량 공급으로 독재정권의 원성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식당에서 밥 파는 것을 통제하고 통일벼 생산 독려도 벌어졌다. 우리가 먹는 공깃밥이 그때 탄생한다. 퍼주는 밥의 절대량을 줄이려는 의도였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종목이 분식집이었다. 인구폭발로 늘어나는 학생과 노동자들은 값싼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국수를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쌀 생산량이 안정되자 분식 강제 정책은 사라졌다. 분식집에서도 쌀밥을 지어 팔았다.
오징어덮밥, 비빔밥이 분식집 메뉴가 된 것이 그 무렵이다. 여기에다 앞서 밝힌 것처럼 김 값이 크게 내려가자 김밥을 만드는 분식집도 생겨났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김밥 전문점도 등장한다. 김밥을 주력으로 파는 체인점도 번성하기 시작한다. 천원 김밥의 탄생이다. 이 흐름에는 배경이 있다. 이른바 ‘이모 노동력’이라고 하는, 인구가 많던 1940~50년대생 아주머니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던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들 세대가 은퇴하자 조선족 동포 여성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지금 김밥 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런 노동자들의 퇴장과 관련이 있다. 천원 김밥의 신화 뒤에는 조용히 스러져간 ‘이모’들의 희생이 있었다. 김밥 한 줄로 드러나는 현대사의 한 구비였다.
<음식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