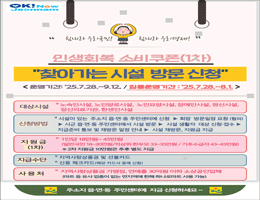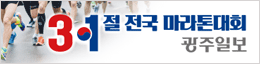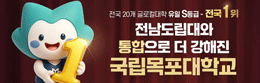“엄마, 자식의 온기 그리워 땡볕에라도 나가십니까”
[농촌 어르신 외로운 삶 오늘도 집 밖으로 돈다] <3> 외로움에 갇히기 싫어
전화 늦게 받으면 애타는 자녀들
“나가지마라·병원비 더 든다” 해도
엄마는 악착같이 밭으로…논으로
노령에 위험한 외출 막을 수 없어
가족해체 시대 고립감 해소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사회화’를
전화 늦게 받으면 애타는 자녀들
“나가지마라·병원비 더 든다” 해도
엄마는 악착같이 밭으로…논으로
노령에 위험한 외출 막을 수 없어
가족해체 시대 고립감 해소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사회화’를
 농촌에 홀로 남아 가족의 온기를 잊고 사는 노인들은 자녀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에나 비로소 웃음꽃이 핀다. 27일 광주시 남구 지동마을회관에서 한 주민이 목포에 거주하는 자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자식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무더위에도 매일같이 논밭으로 나가는 노인들에 자식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농촌을 떠나 도심에 사는 자식들에겐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 기간 농촌에 남은 홀몸 부모의 건강이 큰 걱정거리다. 전남 지역에서 밭일하던 노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급히 전화를 걸었다가 신호음이 길어지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도 여러 번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알아보니 그날도 어머니는 어김없이 밭일을 했단다. 바락바락 악을 써보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모시고 살 수도 없는 형편에 밭일을 하지 않아도 떵떵거리고 살도록 돈을 몇 백씩 쥐어 드리지도 못하니 자식들은 애만 태울 뿐이다.
노인들이 자식들과 공간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단절된 것이다.
이기헌(59·캐나다 뉴브런즈윅주)씨는 조금이라도 더 넓은 환경에서 아들 교육을 시켜보려 캐나다로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는 “나이 90이 다 된 어머니가 땡볕에 일 나가셨다 하면 좋아할 자식이 누가 있겠나. 전화로 매번 ‘좀 쉬시라’고 소리를 질러도 다음 날이면 또 홀린 듯 밭으로 가신다”면서 “워낙 젊을 때 어렵게 살아오신 세월 때문에 악착같이 일해야만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물리적 거리가 있으니 막을 방법도 없고 답답한 한편, 물리적 거리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 타국에 홀로 거주하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더 애달프다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와 한국은 밤낮이 다르니 전화 한 번 할 때도 날 잡아 어렵게 해야 한다.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더라’는 어머니 말씀만 들으면 어쩌다 마음 먹고 통화하면서 성낼 수도 없고 속이 상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일은 아예 손놓고 지내시도록 한 달에 수백 만원 보낼 형편도 아니고 먼 타국으로 모실 수도 없어, 강하게 일을 못하게 할 명분도 없다. 그저 자식된 도리로 ‘조금만 하시라, 건강 챙기시라’고 할 뿐”이라고 푸념을 늘어놨다.
이 씨처럼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부모를 가까이서 지키지 못하는 자식들의 불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순천에 살고 있는 박은영(여·56)씨는 “더운 날 일하면 위험하니 나가지 말라 내내 부탁하지만 어머니는 비가오나 눈이오나 새벽 5시면 밭으로 나간다. 노인들은 텃밭을 가꾸는 최소한의 활동으로나마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느끼시더라”고 말했다.
올해 80세가 된 박 씨의 어머니는 몇 년전 몰아치는 태풍에 비닐하우스를 잡으러 가다가 다쳐 허리에 철심을 박았지만 밭일도 모자라 얼마 전 마을회관 청소까지 시작했다.
박 씨는 “노인들이 그저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막상 응급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에 거주하는 나해경(여·65)씨 역시 89세의 나이에도 콩, 팥, 깨를 살피러 밭을 매일 같이 나가는 어머니의 고집에 “학을 뗐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금 이 시간(오전 7시 30분께)이면 또 밭 매고 있겠다. 원래 논도 있었지만 그 연세에 논일이 체력적으로 훨씬 부담돼 밭으로 개량했다”며 “당장 올해만 해도 몇 번을 탈수 증세로 병원 신세를 졌다. 본인 농사 지은 것보다 병원비가 더 나오는 걸 아는 데도 아무도 못 말린다”고 혀를 내둘렀다.
아무리 자식들이 가까이 살아도 24시간 내내 지키고 있지 않으면 어머니의 위험천만한 외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나 씨 설명이다.
그는 “워낙 배고프게 살아 평생 일만 하던 사람들에게 이제와서 다른 놀거리를 찾으라는 게 더 고역이다. 땅 한 평이라도 있으면 뭔가를 심어서 수확해야 된다, 밭에 잡초가 있으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명절에 자식들 모이면 농약 안 치고 직접 수확한 깨로 참기름 하나 짜서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냐”며 말끝을 흐렸다.
자식들의 마음도 몰라 주고 노인들이 매번 밖으로 나서는 이유는, 사람과 사회로부터 받는 ‘온기’가 그리워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족 구성원들이 전국,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족이 해체되면서 더 이상 가족들에게만 노인 돌봄 책임을 물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됐고, 결국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됐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노인들 한 명 한 명을 빠짐없이 아우를 수 있는 세심한 복지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박상하 사단법인 사회경제연구원장은 “가족이나 자식만으로는 모든 노인을 돌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제도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구 소멸 시대에 특히 인구가 적은 시골 마을에서 지자체 예산 부족, 인력난, 대도시와의 격차 등으로 촘촘한 복지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전남은 도움을 제공할 사람보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더 많다”며 “마을 권역별로 묶어서 예산 지원 확대와 프로그램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농촌, 특히 전남처럼 젊은 인구가 부족한 곳일수록 마을활동가, 공동생활 프로그램, 주거 지원 등이 결합된 지역주도형 돌봄체계 구축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농촌을 떠나 도심에 사는 자식들에겐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 기간 농촌에 남은 홀몸 부모의 건강이 큰 걱정거리다. 전남 지역에서 밭일하던 노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급히 전화를 걸었다가 신호음이 길어지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도 여러 번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알아보니 그날도 어머니는 어김없이 밭일을 했단다. 바락바락 악을 써보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모시고 살 수도 없는 형편에 밭일을 하지 않아도 떵떵거리고 살도록 돈을 몇 백씩 쥐어 드리지도 못하니 자식들은 애만 태울 뿐이다.
이기헌(59·캐나다 뉴브런즈윅주)씨는 조금이라도 더 넓은 환경에서 아들 교육을 시켜보려 캐나다로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는 “나이 90이 다 된 어머니가 땡볕에 일 나가셨다 하면 좋아할 자식이 누가 있겠나. 전화로 매번 ‘좀 쉬시라’고 소리를 질러도 다음 날이면 또 홀린 듯 밭으로 가신다”면서 “워낙 젊을 때 어렵게 살아오신 세월 때문에 악착같이 일해야만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와 한국은 밤낮이 다르니 전화 한 번 할 때도 날 잡아 어렵게 해야 한다.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더라’는 어머니 말씀만 들으면 어쩌다 마음 먹고 통화하면서 성낼 수도 없고 속이 상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일은 아예 손놓고 지내시도록 한 달에 수백 만원 보낼 형편도 아니고 먼 타국으로 모실 수도 없어, 강하게 일을 못하게 할 명분도 없다. 그저 자식된 도리로 ‘조금만 하시라, 건강 챙기시라’고 할 뿐”이라고 푸념을 늘어놨다.
이 씨처럼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부모를 가까이서 지키지 못하는 자식들의 불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순천에 살고 있는 박은영(여·56)씨는 “더운 날 일하면 위험하니 나가지 말라 내내 부탁하지만 어머니는 비가오나 눈이오나 새벽 5시면 밭으로 나간다. 노인들은 텃밭을 가꾸는 최소한의 활동으로나마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느끼시더라”고 말했다.
올해 80세가 된 박 씨의 어머니는 몇 년전 몰아치는 태풍에 비닐하우스를 잡으러 가다가 다쳐 허리에 철심을 박았지만 밭일도 모자라 얼마 전 마을회관 청소까지 시작했다.
박 씨는 “노인들이 그저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막상 응급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에 거주하는 나해경(여·65)씨 역시 89세의 나이에도 콩, 팥, 깨를 살피러 밭을 매일 같이 나가는 어머니의 고집에 “학을 뗐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금 이 시간(오전 7시 30분께)이면 또 밭 매고 있겠다. 원래 논도 있었지만 그 연세에 논일이 체력적으로 훨씬 부담돼 밭으로 개량했다”며 “당장 올해만 해도 몇 번을 탈수 증세로 병원 신세를 졌다. 본인 농사 지은 것보다 병원비가 더 나오는 걸 아는 데도 아무도 못 말린다”고 혀를 내둘렀다.
아무리 자식들이 가까이 살아도 24시간 내내 지키고 있지 않으면 어머니의 위험천만한 외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나 씨 설명이다.
그는 “워낙 배고프게 살아 평생 일만 하던 사람들에게 이제와서 다른 놀거리를 찾으라는 게 더 고역이다. 땅 한 평이라도 있으면 뭔가를 심어서 수확해야 된다, 밭에 잡초가 있으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명절에 자식들 모이면 농약 안 치고 직접 수확한 깨로 참기름 하나 짜서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냐”며 말끝을 흐렸다.
자식들의 마음도 몰라 주고 노인들이 매번 밖으로 나서는 이유는, 사람과 사회로부터 받는 ‘온기’가 그리워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족 구성원들이 전국,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족이 해체되면서 더 이상 가족들에게만 노인 돌봄 책임을 물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됐고, 결국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됐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노인들 한 명 한 명을 빠짐없이 아우를 수 있는 세심한 복지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박상하 사단법인 사회경제연구원장은 “가족이나 자식만으로는 모든 노인을 돌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제도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구 소멸 시대에 특히 인구가 적은 시골 마을에서 지자체 예산 부족, 인력난, 대도시와의 격차 등으로 촘촘한 복지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전남은 도움을 제공할 사람보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더 많다”며 “마을 권역별로 묶어서 예산 지원 확대와 프로그램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농촌, 특히 전남처럼 젊은 인구가 부족한 곳일수록 마을활동가, 공동생활 프로그램, 주거 지원 등이 결합된 지역주도형 돌봄체계 구축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