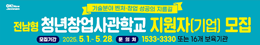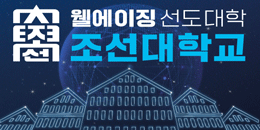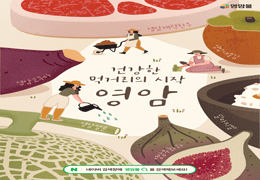국가폭력기록물 은폐·조작·왜곡 위험
피해자·유족·시민사회 접근권 넓혀야
22일부터 전남대 5·18연구자 대회
장연희 이태원조사 비서관 주장
22일부터 전남대 5·18연구자 대회
장연희 이태원조사 비서관 주장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과 관련된 기록물을 피해 당사자, 조사기관 등이 자유롭게 열람할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연희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서관은 22일 열리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제2회 5·18연구자 대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비서관은 “국가폭력 기록물을 국가의 소유물로만 간주하지 않고 피해자·유족·시민사회가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비서관은 국가폭력 기록물은 일반적인 행정기록과 달리 피해자, 민간단체, 언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생산과 기록에 참여해 다층적인 구조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그에 비해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기록물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전제로 설계돼 있어 민간 또는 피해자와 공동 생성된 기록물에 대한 별도의 소유·활용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폭력 기록은 생성 과정 자체에서부터 삭제, 은폐, 조작이 구조적으로 개입된 경우가 많으므로, 왜곡된 기억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5·18 청문회가 열렸던 1988년 정부가 ‘511위원회’를 운영해 신군부의 5·18 관련 자료를 왜곡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진실화해위원회(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 한시기관들은 방대한 양의 조사 기록, 증언, 수집 자료를 생산했으나 활동 종료 후 국가기록원 이관 과정에서 DB연계 불가, 기록물 식별 불능, 검색 불가 상태로 사실상 방치된 사례가 빈번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메타데이터 부재, 체계적 분류 실패로 인해 향후 진상규명과 사회적 활용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과정 기록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최소 15년 봉인됐는데, 같은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도 봉인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록물도 비슷한 상황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23년 12월 활동을 마칠 때까지 서류 284만여쪽과 4.5TB(테라바이트)의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지만, 기록물이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고 광주의 5·18 관련 기관·단체에 이관된 것이 전무해 후속 연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비서관은 “‘기억의 민주화’라는 명분이 때로는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거나, 오히려 국가가 기억을 다시 독점하는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며 “국가폭력 기록물에 대해 피해자, 유족,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대5·18연구소가 주관하는 5·18 연구자대회는 22~23일 이틀에 걸쳐 과거청산, 기록, 진실규명 등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22일에는 국가폭력과 민주항쟁에 관한 장기적 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연구자 모임 ‘5·18학회’ 출범식도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연희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서관은 22일 열리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제2회 5·18연구자 대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비서관은 국가폭력 기록물은 일반적인 행정기록과 달리 피해자, 민간단체, 언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생산과 기록에 참여해 다층적인 구조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그에 비해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기록물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전제로 설계돼 있어 민간 또는 피해자와 공동 생성된 기록물에 대한 별도의 소유·활용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원회(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 한시기관들은 방대한 양의 조사 기록, 증언, 수집 자료를 생산했으나 활동 종료 후 국가기록원 이관 과정에서 DB연계 불가, 기록물 식별 불능, 검색 불가 상태로 사실상 방치된 사례가 빈번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메타데이터 부재, 체계적 분류 실패로 인해 향후 진상규명과 사회적 활용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과정 기록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최소 15년 봉인됐는데, 같은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도 봉인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록물도 비슷한 상황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23년 12월 활동을 마칠 때까지 서류 284만여쪽과 4.5TB(테라바이트)의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지만, 기록물이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고 광주의 5·18 관련 기관·단체에 이관된 것이 전무해 후속 연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비서관은 “‘기억의 민주화’라는 명분이 때로는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거나, 오히려 국가가 기억을 다시 독점하는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며 “국가폭력 기록물에 대해 피해자, 유족,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대5·18연구소가 주관하는 5·18 연구자대회는 22~23일 이틀에 걸쳐 과거청산, 기록, 진실규명 등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22일에는 국가폭력과 민주항쟁에 관한 장기적 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연구자 모임 ‘5·18학회’ 출범식도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