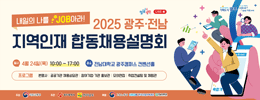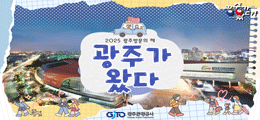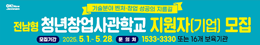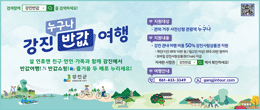가만한바람 - 박용수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
완도 금당, 천당 밑에 금당도에서 처음 마주친 것은 갑오징어도 전복도 아니었다. 산중 도라지꽃이었다. 흰색과 연보랏빛 도라지꽃이 알숭달숭 산을 수놓고 있었다. 실로 반백 년 전, 어린 시절 뒷산 앞산에서 본 꽃이었다. 그때 산에는 어디든 이런 도라지꽃들이 나무꾼 눈 호강을 시켜줬었다.
그때, 배낭을 맨 등산객이 무더기로 하산하고 있었다. 섬 구경 온 줄 알았는데 약초꾼이 많단다. 꽃 보러 왔으면 좋으련만 도라지 뿌리를 캐러 이 멀고 깊은 섬까지 온다고 하니, 세상이 야박하게 보였다.
봄이 되면 나도 산에 간다. 가만히 있고 싶은데 산이 자꾸 나를 부른다. 조붓한 오솔길을 걷다 보면 꽃만 만나는 게 아니다. 가만한 바람에 박새나 다람쥐도 만난다. 연둣빛 숲에 누워있으면 구름이 다가오고 햇살이 속삭여주고 이슬이 노래를 불러준다.
간간이 찔레순도 꺾어 먹는다. 칡순이나 청미래덩굴 새순이 간직한 에너지를 먹고 잎에 스민 숲의 정령들을 먹으며 자연을 내 안으로 깊이 영접한다. 산은 하산하는 내 등에 향긋한 고사리나 취나물 몇 잎, 두릅이나 옻 순 몇 줌도 넣어준다.
며칠 전이었다. 하산하는데 경찰차가 나를 막아섰다. 놀라 주춤 섰는데 웬 사내가 내 배낭을 냅다 가로채더니 내용물을 확인하고 다짜고짜 경찰서로 가잔다.
처음 보는 중실한 사내였다. 눈초리도 매섭고 화를 낸 표정이 얼음보다 차가웠다. 산에 단 1초도 살지 않은 사람처럼 난폭했다. 자기 두릅을 꺾어간 도둑을 이제 잡았다며 덤터기라도 씌우겠다는 듯 경찰에게 설레발을 쳤다.
나는 이 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했다. 여기 있는 산도 내 친구, 계곡도 내 친구, 나무도 내 친구라고 했다.
그딴 변명은 필요 없다고 그가 말했다. 재작년에 이 산을 샀기 때문에 이 산의 것은 자기 것이란다. 그때 두릅을 심었는데 누가 몰래 꺾어간단다.
우습지만 참았다. 그리고 산이 내어준 곳으로 가서 그 흔적들을 보여주었다. 우리 산소 옆의 양지바른 데서 자란 것이었다. 그것도 여간 조심해서 따낸 것이어서 몇 개 내준 그 나무는 튼튼한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경찰이 먼저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 사내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어디 가고 없었다.
섬이나 무인도까지 가서 도라지나 하수오 등을 무더기로 캐서 파는 일은 옳지 않다. 어느 산이나 주인이 있고 소중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일은 이 땅을 사는 이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다. 하지만 산도 개인의 것 이전에 사회적 자산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언제부터 산의 흙과 돌, 그리고 거기서 난 한갓 쑥이나 달래 같은 것도 주인의 것이란 말인가.
보릿고개 시절, 산짐승 들짐승이 먹고 난 것도 우리는 기꺼이 나눠 먹었다.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해도 햇볕과 바람과 이슬이 키운 것조차 자기 소유라고 하지는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산 뒷산, 어느 산이고 가서 쑥이고 칡을 캐서 먹었고 푸나무나 갈퀴나무를 해서 추운 겨울을 보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거기에 발도 내딛지 못하게 했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색해졌는가.
시애틀 추장의 연설이 생각난다. 어떻게 이 공기와 구름, 그리고 산을 사고팔 수 있단 말인가. 저절로 난 풀 한 포기조차 법이 개입하여 그 소유가 정해진다면 나는 그 법을 신뢰하고 싶지 않다. 풀 한 포기 나뭇가지 하나 공유하지 않는 천박한 인간이라면, 거기 물욕에 물든 자본주의부터 제일 먼저 추방하고 싶다.
그 땅을 누구에겐가 샀듯이 또 누군가에게 이전될 것이다. 잠시 기대어 살고 쓰다 갈 뿐이다. 그곳에서 자라는 꽃들과 풀, 나무들의 것이고 거기서 식량을 구하고 보금자리를 튼 토끼나 새들의 것이다. 가만한 바람의 것이다. 그들에게 경계가 없듯 우리에게도 애초 경계고 소유도 없는 자연은 자연히 모두의 것이다. 산만 구매할 게 아니라 산, 곧 자연이 인간에게 베푼 사랑, 시애틀 추장의 정신,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사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지나치게 자기 소유라고 독식하지도 말고 또 사람들은 씨가 마르도록 채취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넉넉한 자연처럼 사람들도 좀 늡늡하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이 준 선물이고 교훈은 아닐까.
그때, 배낭을 맨 등산객이 무더기로 하산하고 있었다. 섬 구경 온 줄 알았는데 약초꾼이 많단다. 꽃 보러 왔으면 좋으련만 도라지 뿌리를 캐러 이 멀고 깊은 섬까지 온다고 하니, 세상이 야박하게 보였다.
간간이 찔레순도 꺾어 먹는다. 칡순이나 청미래덩굴 새순이 간직한 에너지를 먹고 잎에 스민 숲의 정령들을 먹으며 자연을 내 안으로 깊이 영접한다. 산은 하산하는 내 등에 향긋한 고사리나 취나물 몇 잎, 두릅이나 옻 순 몇 줌도 넣어준다.
처음 보는 중실한 사내였다. 눈초리도 매섭고 화를 낸 표정이 얼음보다 차가웠다. 산에 단 1초도 살지 않은 사람처럼 난폭했다. 자기 두릅을 꺾어간 도둑을 이제 잡았다며 덤터기라도 씌우겠다는 듯 경찰에게 설레발을 쳤다.
나는 이 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했다. 여기 있는 산도 내 친구, 계곡도 내 친구, 나무도 내 친구라고 했다.
그딴 변명은 필요 없다고 그가 말했다. 재작년에 이 산을 샀기 때문에 이 산의 것은 자기 것이란다. 그때 두릅을 심었는데 누가 몰래 꺾어간단다.
우습지만 참았다. 그리고 산이 내어준 곳으로 가서 그 흔적들을 보여주었다. 우리 산소 옆의 양지바른 데서 자란 것이었다. 그것도 여간 조심해서 따낸 것이어서 몇 개 내준 그 나무는 튼튼한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경찰이 먼저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 사내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어디 가고 없었다.
섬이나 무인도까지 가서 도라지나 하수오 등을 무더기로 캐서 파는 일은 옳지 않다. 어느 산이나 주인이 있고 소중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일은 이 땅을 사는 이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다. 하지만 산도 개인의 것 이전에 사회적 자산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언제부터 산의 흙과 돌, 그리고 거기서 난 한갓 쑥이나 달래 같은 것도 주인의 것이란 말인가.
보릿고개 시절, 산짐승 들짐승이 먹고 난 것도 우리는 기꺼이 나눠 먹었다.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해도 햇볕과 바람과 이슬이 키운 것조차 자기 소유라고 하지는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산 뒷산, 어느 산이고 가서 쑥이고 칡을 캐서 먹었고 푸나무나 갈퀴나무를 해서 추운 겨울을 보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거기에 발도 내딛지 못하게 했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색해졌는가.
시애틀 추장의 연설이 생각난다. 어떻게 이 공기와 구름, 그리고 산을 사고팔 수 있단 말인가. 저절로 난 풀 한 포기조차 법이 개입하여 그 소유가 정해진다면 나는 그 법을 신뢰하고 싶지 않다. 풀 한 포기 나뭇가지 하나 공유하지 않는 천박한 인간이라면, 거기 물욕에 물든 자본주의부터 제일 먼저 추방하고 싶다.
그 땅을 누구에겐가 샀듯이 또 누군가에게 이전될 것이다. 잠시 기대어 살고 쓰다 갈 뿐이다. 그곳에서 자라는 꽃들과 풀, 나무들의 것이고 거기서 식량을 구하고 보금자리를 튼 토끼나 새들의 것이다. 가만한 바람의 것이다. 그들에게 경계가 없듯 우리에게도 애초 경계고 소유도 없는 자연은 자연히 모두의 것이다. 산만 구매할 게 아니라 산, 곧 자연이 인간에게 베푼 사랑, 시애틀 추장의 정신,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사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지나치게 자기 소유라고 독식하지도 말고 또 사람들은 씨가 마르도록 채취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넉넉한 자연처럼 사람들도 좀 늡늡하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이 준 선물이고 교훈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