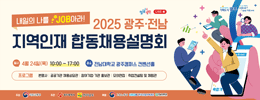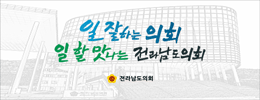진주성과 호남 의병 - 강대석 시인·장성군 정책자문 위원장
 |
호남은 의(義)의 고장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땐 의병으로 일어서 국난 극복에 앞장섰고 군부 독재 시절엔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다. 며칠 전 동호인 모임에서 진주성에 들렀다가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을 지키다 순국한 호남 의병들의 기록을 보며 일행들과 나눈 결론이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충주를 거쳐 서울로 향했다. 왕은 충주 탄금대의 패전 소식을 듣고 야반도주하듯 서울을 버렸고, 사흘 뒤인 5월 2일 왜군은 무주공산이 된 서울에 무혈 입성했다. 무능한 왕과 비겁한 신료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달랐다. 왕의 피난 소식이 전해지자 왜군의 직접 피해가 없던 호남에서 의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나라와 왕을 구하겠다는 근왕병들이었다.
호남에선 제일 먼저 나주의 김천일이 나섰다. 5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격문을 돌려 의병을 규합했다. 그는 여러 고을의 수령을 거친 문신으로 수원부사 시절 탈세를 일삼던 토호들에게 농민과 균등하게 세금을 매겼다가 모함을 받고 파직되어 향리에 은거한 선비였다. 매천 황현의 말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의리는 없었다. 그러나 300여 명의 의병을 모아 왕과 나라를 구하겠다며 의주를 향해 돌진했다. 강화도와 수원 독산성에서 왜적을 맞아 싸우는 등 많은 전과를 올리고 이듬해 진주성 2차 전투에 참전하여 성이 함락되자 아들 상건과 함께 남강에 몸을 던져 순절했다.
광주의 고경명은 담양에서 유팽로, 안영 등과 거병하여 의주로 향하다 금산 전투에서 차남 고인후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때 살아남은 장남 고종후는 복수를 다짐하며 이듬해 전주성 2차 전투에 참전하여 끝내 항전하다 김천일과 함께 순절했다.
최경회는 모친의 시묘살이 중 파천 소식을 듣고 두 형님과 함께 화순 삼천리에서 의병을 모아 전투에 나섰다. 장형 최경운은 오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는 진주성 2차 전투에서 순절했다. 그의 후처인 논개는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여 남편의 원수를 갚았다.
장성의 김경수는 고경명의 순절 소식을 듣고 기효간, 김제민 등과 함께 장성 남문에서 창의했다. 그의 아들 김극후, 김극순은 의병대장 김제민과 함께 용인까지 출격하여 싸우고 이듬해 진주성 2차 전투에 참전하여 끝내 항전하다 순절했다. 이외에도 임계영, 장윤, 강희열·희보 형제 등 수많은 호남 의병들이 진주성에서 목숨을 바쳤다. 진주성은 호남 의병들의 충혼이 잠든 성지로 의미가 깊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 의병은 무려 1346명(전남 978명, 전북 368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왜적이 있는 곳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싸웠다. 이순신 장군의 휘하 장교 143명 중 호남 출신이 136명으로 주축을 이루었고 전라좌수영의 수군들은 대부분 여수, 순천, 고흥, 보성 등의 향민들로 이 지역 선비, 농민, 어민, 승려 등의 의기와 충무공의 지략이 응집되어 23전 23승이라는 불멸의 신화를 이룬 것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한 것은 호남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일컬은 것이지만 한편으로 호남의 의병 정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충주를 거쳐 서울로 향했다. 왕은 충주 탄금대의 패전 소식을 듣고 야반도주하듯 서울을 버렸고, 사흘 뒤인 5월 2일 왜군은 무주공산이 된 서울에 무혈 입성했다. 무능한 왕과 비겁한 신료들의 모습이었다.
호남에선 제일 먼저 나주의 김천일이 나섰다. 5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격문을 돌려 의병을 규합했다. 그는 여러 고을의 수령을 거친 문신으로 수원부사 시절 탈세를 일삼던 토호들에게 농민과 균등하게 세금을 매겼다가 모함을 받고 파직되어 향리에 은거한 선비였다. 매천 황현의 말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의리는 없었다. 그러나 300여 명의 의병을 모아 왕과 나라를 구하겠다며 의주를 향해 돌진했다. 강화도와 수원 독산성에서 왜적을 맞아 싸우는 등 많은 전과를 올리고 이듬해 진주성 2차 전투에 참전하여 성이 함락되자 아들 상건과 함께 남강에 몸을 던져 순절했다.
최경회는 모친의 시묘살이 중 파천 소식을 듣고 두 형님과 함께 화순 삼천리에서 의병을 모아 전투에 나섰다. 장형 최경운은 오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는 진주성 2차 전투에서 순절했다. 그의 후처인 논개는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여 남편의 원수를 갚았다.
장성의 김경수는 고경명의 순절 소식을 듣고 기효간, 김제민 등과 함께 장성 남문에서 창의했다. 그의 아들 김극후, 김극순은 의병대장 김제민과 함께 용인까지 출격하여 싸우고 이듬해 진주성 2차 전투에 참전하여 끝내 항전하다 순절했다. 이외에도 임계영, 장윤, 강희열·희보 형제 등 수많은 호남 의병들이 진주성에서 목숨을 바쳤다. 진주성은 호남 의병들의 충혼이 잠든 성지로 의미가 깊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 의병은 무려 1346명(전남 978명, 전북 368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왜적이 있는 곳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싸웠다. 이순신 장군의 휘하 장교 143명 중 호남 출신이 136명으로 주축을 이루었고 전라좌수영의 수군들은 대부분 여수, 순천, 고흥, 보성 등의 향민들로 이 지역 선비, 농민, 어민, 승려 등의 의기와 충무공의 지략이 응집되어 23전 23승이라는 불멸의 신화를 이룬 것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한 것은 호남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일컬은 것이지만 한편으로 호남의 의병 정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