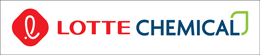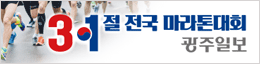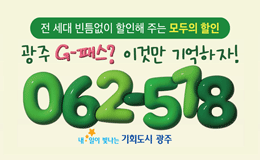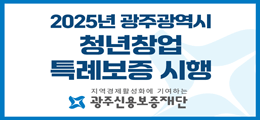[수필의 향기] 그 길목 능소화- 김향남 수필가
 |
틈나는 대로 밭에 간다.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 주말농장이다. 밭에는 지금 고구마가 뿌리를 내렸고 들깻잎 상추 케일 치커리 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고추와 가지도 쑥쑥 커 가고 엊그제 뿌린 열무 씨도 싹이 돋기 시작했다. 풀들은 더 기운차게 자라고 있다.
오늘도 사방이 고요하다.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지만 하나도 시끄럽지 않다. 새들은 점점 더 크고 야단스럽게 이곳이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듯하다. 나는 순한 짐승처럼 엎드려 소리를 듣고 햇볕을 느끼며 푸름 속에 잠긴다. 오뉴월의 들판에는 바람결도 싱그럽다.
상추는 그새 어른 손바닥만큼이나 잎이 퍼졌고 열무는 솎아내야 할 정도로 수북하게 올라왔다. 이파리를 따내고 새순을 솎아내다 새삼 땅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에 생각이 미친다. 푸성귀 몇 가지만 있어도 반찬 걱정이 없을뿐더러 저절로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상추가 잘 컸다고 아낄 일도 아니고 두고 볼 일도 아니다. 그랬다가는 이도 저도 안 된다. 따내고 나누고 바로바로 맛있게 먹는 것이 이들 푸성귀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이리라.
오가는 길가에 배롱나무가 즐비하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석 달 열흘은 좋이 붉어 있을 것이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날마다 새날처럼 거듭날 것이다. 우거진 수풀 속에 개망초는 하얗게, 애기똥풀은 노랗게 피어 있다. 무성한 살갈퀴는 점점이 자주꽃을 피웠고, 싸리꽃 찔레꽃은 벌써 져버리고 안 보인다.
또 하나, 능소화가 피었었다. 밭으로 들어서는 길목, 높은 나무 위였다. 어느 날 문득 눈에 띈 이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여름 내내 환했다. 부러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굵은 소나무 우듬지에 창창한 하늘을 뒷배 삼아 휘영청 늘어져 있었다. 희소식을 안고 온 천사의 나팔처럼, 춤추는 무희의 상기된 얼굴처럼 교태로우면서도 단아한 맵시였다. 한낮 땡볕도 아랑곳없는 돌올한 현시나 농익은 황홍색의 도발적인 화안(花顔)이, 지나가는 내 발길을 붙잡고 한참씩이나 쳐다보게 할 만큼 매혹적인 꽃이었다.
세상에 질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꽃이라는 이름일 것이다. 꽃은 미적 대상이지 시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라 최고의 미인 수로부인도 절벽 위의 꽃을 욕심내기는 했어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내지 않았다. 그 꽃 꺾어 바치오리다 했던 노옹의 헌사도, 탐내는 그 심중을 향한 지극한 옹호였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으리라.
푸른 솔을 휘감고 오른 공중의 능소화도 수로부인의 꽃처럼 아득한 꽃이었다. 손길도 발길도 닿을 수 없는, 눈길만이 허용되는 멀리 있는 꽃이었다. 닿을 수 없어 더 고아하고 서늘한 꽃이었으며, 내 안의 숨은 미의식 혹은 마음의 순도를 높여 주는 심미의 꽃이었다. 높이 켠 등불처럼 위안이 되는, 자꾸만 우러러보게 되는 동경의 꽃이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어울림을 생각해 보는 꽃이기도 했다.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덩굴진 몸으로, 고공 행진하듯이 그토록 높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나무가 제 몸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꽃줄기도 다행히 그 마음을 알았던지 끝까지 힘을 놓지 않았다. 늘어진 끄트머리쯤을 애써 치켜올려 긴장감을 유지했으며, 줄을 타듯이 낭창낭창 생의 열락을 맛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살아 있는 순간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절대 방기하지 않겠다는 생에 대한 의지이자 예의였던 것일까.
능소화는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아직 싱싱한 채였다. 한 차례 소낙비가 왔다 가거나 바람이라도 세게 불고 난 후면 지레 떨군 꽃송이들이 바닥에 수북했다. 가야 할 때를 아는 것처럼 낙화의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않는, 높은 데서도 낮은 데서도 생글생글 명랑한 꽃이었다.
그러나 이제 지난여름의 그 호사는 누릴 수 없다 한다. 푸성귀를 가꾸며 느끼는 오지게 좋은 마음도 그만 내려놓으라 한다. 며칠 전부터 하필 능소화가 있는 길목으로 덤프트럭이 오가고 땅이 파헤쳐지고 나무가 베어져 있다. 꽃줄기를 밀어 올리던 늠름한 소나무도 예외 없이 고꾸라져 있다. 그렇게 가차 없이 베어질 줄이야. 주말농장도 폐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추와 상추 대신, 새와 나무들 대신 아파트 숲이 들어선다고 한다. 호미질하는 손에 힘이 다 빠진다.
덕분에 아쉽게 추억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인가? 쌓이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오늘도 사방이 고요하다.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지만 하나도 시끄럽지 않다. 새들은 점점 더 크고 야단스럽게 이곳이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듯하다. 나는 순한 짐승처럼 엎드려 소리를 듣고 햇볕을 느끼며 푸름 속에 잠긴다. 오뉴월의 들판에는 바람결도 싱그럽다.
또 하나, 능소화가 피었었다. 밭으로 들어서는 길목, 높은 나무 위였다. 어느 날 문득 눈에 띈 이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여름 내내 환했다. 부러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굵은 소나무 우듬지에 창창한 하늘을 뒷배 삼아 휘영청 늘어져 있었다. 희소식을 안고 온 천사의 나팔처럼, 춤추는 무희의 상기된 얼굴처럼 교태로우면서도 단아한 맵시였다. 한낮 땡볕도 아랑곳없는 돌올한 현시나 농익은 황홍색의 도발적인 화안(花顔)이, 지나가는 내 발길을 붙잡고 한참씩이나 쳐다보게 할 만큼 매혹적인 꽃이었다.
세상에 질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꽃이라는 이름일 것이다. 꽃은 미적 대상이지 시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라 최고의 미인 수로부인도 절벽 위의 꽃을 욕심내기는 했어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내지 않았다. 그 꽃 꺾어 바치오리다 했던 노옹의 헌사도, 탐내는 그 심중을 향한 지극한 옹호였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으리라.
푸른 솔을 휘감고 오른 공중의 능소화도 수로부인의 꽃처럼 아득한 꽃이었다. 손길도 발길도 닿을 수 없는, 눈길만이 허용되는 멀리 있는 꽃이었다. 닿을 수 없어 더 고아하고 서늘한 꽃이었으며, 내 안의 숨은 미의식 혹은 마음의 순도를 높여 주는 심미의 꽃이었다. 높이 켠 등불처럼 위안이 되는, 자꾸만 우러러보게 되는 동경의 꽃이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어울림을 생각해 보는 꽃이기도 했다.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덩굴진 몸으로, 고공 행진하듯이 그토록 높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나무가 제 몸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꽃줄기도 다행히 그 마음을 알았던지 끝까지 힘을 놓지 않았다. 늘어진 끄트머리쯤을 애써 치켜올려 긴장감을 유지했으며, 줄을 타듯이 낭창낭창 생의 열락을 맛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살아 있는 순간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절대 방기하지 않겠다는 생에 대한 의지이자 예의였던 것일까.
능소화는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아직 싱싱한 채였다. 한 차례 소낙비가 왔다 가거나 바람이라도 세게 불고 난 후면 지레 떨군 꽃송이들이 바닥에 수북했다. 가야 할 때를 아는 것처럼 낙화의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않는, 높은 데서도 낮은 데서도 생글생글 명랑한 꽃이었다.
그러나 이제 지난여름의 그 호사는 누릴 수 없다 한다. 푸성귀를 가꾸며 느끼는 오지게 좋은 마음도 그만 내려놓으라 한다. 며칠 전부터 하필 능소화가 있는 길목으로 덤프트럭이 오가고 땅이 파헤쳐지고 나무가 베어져 있다. 꽃줄기를 밀어 올리던 늠름한 소나무도 예외 없이 고꾸라져 있다. 그렇게 가차 없이 베어질 줄이야. 주말농장도 폐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추와 상추 대신, 새와 나무들 대신 아파트 숲이 들어선다고 한다. 호미질하는 손에 힘이 다 빠진다.
덕분에 아쉽게 추억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인가? 쌓이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