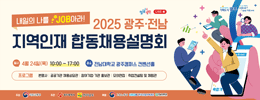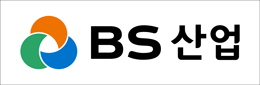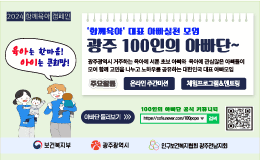오래 전 어느 봄날- 고성혁 시인
 |
한 달 남짓 병원에 있다 퇴원했다. 세상에! 그동안 사방 천지에 벚꽃이 찬란하게 피었다. 기후변화를 탓하며 마음이 이울던 끝, 산골짝의 싱그러운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쨌거나 봄이다. 봄이구나. 봄날엔 꽃 안개 아름다운 꿈속에서 처음 그대를 만났네. 길게 울려 퍼지는 트럼펫 소리. 참나무 우듬지 위, 별이 담긴 하늘을 찍었다. 그러다 다친 허리가 아파 와 그대로 누웠다. 돌이켜보노라니 내 삶의 희로애락이 뜬구름 같고 남겨진 삶마저 애잔했다. 누운 채 휴대폰에 글을 적었다. 병원에서 내려다 본 그 저녁 풍경이 떠올랐다.
1주일쯤 지나 겨우 화장실 길이 트였을 때 수액 거치대를 끌고 병실 끝에 섰다. 거리가 내려다보였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포차와 횟집, 치킨 집과 국밥집. 얼마 전까지 붉은 얼굴로 옷자락을 끌었던 거리였다. 흙냄새 물씬거릴 땅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묵직한 고통 때문이었을 것이다.
문득 육십 년 전 어느 봄날 풍경이 불쑥 다가섰다. 쏜살같은 세월. 그 시절 목포에는 뒷개라는 곳이 있었다. 지금은 북항이라는 아름다운 미명(美名)으로 바뀌었지만 그땐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는 험한 빈민촌이었다. 블록으로 거칠게 지은 막집들 사이, 양철과 판자로 얼기설기 엮은 집들도 있었다. 근처 피난민촌은 얼마나 골목이 좁던지 사람들이 비켜 지나가지 못해 한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서 있어야만 했다. 공동 수도 하나에 온 동네 사람이 매달렸던 시절이었으니 어느 곳 사정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곳 ‘뒷개 뻘바탕’의 삶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고단하기는 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눈밭에서 시금치를 캤다. 여름에는 먼 농촌 마을까지 농사일을 하러 다니거나 공사장 잡부, 혹은 다라이 공장의 심부름꾼으로 우리 두 형제를 먹였다. 아버지가 없었으니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도 꽤 고달픈 축에 들었을 것은 뻔한 이치,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사무친다. 우리는 거기서 방 한 칸에 살았다. 초등학생 때부터 저녁밥을 해놓고 어머니를 기다렸다. 어느 날엔 아무 것도 없는 식량 자루를 망연자실 들여다보다 왕겨에 불을 붙여 풀무를 돌렸다. 물이 끓어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배고프다고 울던 동생은 개다리소반 위 말라붙은 김치 보시기 위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다. 그날따라 더욱 늦은 어머니는 먼지 낀 수건을 털다 하얗게 말라붙은 동생 눈가의 눈물자국을 보고 울음을 터트렸다. 우리 이웃도 이웃의 이웃도 모두 그렇게 살았다.
그 동네 아이들은 동네 옆의 들판에서 놀았다. 개펄을 다진 허허벌판이었다. 김장 배추 수확을 끝낸 겨울이면 다음해 농사를 위해 인분을 뿌려 놓았다. 겨우내 삭은 똥 냄새가 풀풀거렸다. 들판 옆으로는 유달산으로부터 시작된 큰 개천이 있었고 개천가 삼각주처럼 꺾인 넓은 땅에 부랑아 보호소가 있었다. 봄이 가까울 무렵 우리는 거기, 바람막이 보호소 담장 옆에서 가오리연과 방패연을 날렸다. 하늘을 가로 세로 날던 연들의 군무가 마치 겨울 판타지처럼 선연하다. 풀로 유리가루를 먹인 실은 마침내 누군가의 연실을 잘랐다. 하늘 속으로 둥실 떠오르는 연. 저 멀리 끊어져 날아가는 연을 잡기 위해 내달리던 아이들. 바로 그 들판을 달렸다. 몇 달 숙성됐다고는 해도 거죽만 검을 뿐 속은 똥이었으니 내달리던 아이들은 속절없이 미끄러졌다. 어떤 놈은 울고 어떤 놈은 웃고.
그때 담장 옆에서 그 모양을 보고 있던 내게 무슨 소리가 들렸다. 신음소리 같았다. 부랑아 보호소 담벼락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였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높은 담장엔 유리 파편까지 박혀 들여다볼 수 없었다. 역전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잡혀 온 아이들이 그 안에 갇혀 있었다. 우리 모두 봉고차에서 내리며 겁먹은 얼굴로 두리번거리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배추 끌텅이라도 주랴? 그래, 형, 줘! 그걸 먹으면 채독에 걸린다는 걸 알면서도 우린 누가 시킨 것처럼 배추 뿌리를 캐 담장 안으로 던졌다. 아직은 겨울 끝자락이었다.
앉지 못하는 고통에야 비로소 떠오른 그때 아이들. 한 치 앞을 못 보는 삶이라도 생명은 귀한 것이다. 성남, 송파의 모녀들, 다음 소희, 김용균들, 성폭과 학폭 피해자들, 부당하게 대접받는 외국인 노동자들. 버스기사의 800원 횡령은 유죄, 아들을 통해 받은 곽상도의 50억 수수는 무죄. 그래서 T. S. 엘리엇(Elliott)의 사월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다. 담장 너머까지 고루 볕이 들어야 진정한 봄이다.
문득 육십 년 전 어느 봄날 풍경이 불쑥 다가섰다. 쏜살같은 세월. 그 시절 목포에는 뒷개라는 곳이 있었다. 지금은 북항이라는 아름다운 미명(美名)으로 바뀌었지만 그땐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는 험한 빈민촌이었다. 블록으로 거칠게 지은 막집들 사이, 양철과 판자로 얼기설기 엮은 집들도 있었다. 근처 피난민촌은 얼마나 골목이 좁던지 사람들이 비켜 지나가지 못해 한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서 있어야만 했다. 공동 수도 하나에 온 동네 사람이 매달렸던 시절이었으니 어느 곳 사정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곳 ‘뒷개 뻘바탕’의 삶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고단하기는 했을 것이다.
그 동네 아이들은 동네 옆의 들판에서 놀았다. 개펄을 다진 허허벌판이었다. 김장 배추 수확을 끝낸 겨울이면 다음해 농사를 위해 인분을 뿌려 놓았다. 겨우내 삭은 똥 냄새가 풀풀거렸다. 들판 옆으로는 유달산으로부터 시작된 큰 개천이 있었고 개천가 삼각주처럼 꺾인 넓은 땅에 부랑아 보호소가 있었다. 봄이 가까울 무렵 우리는 거기, 바람막이 보호소 담장 옆에서 가오리연과 방패연을 날렸다. 하늘을 가로 세로 날던 연들의 군무가 마치 겨울 판타지처럼 선연하다. 풀로 유리가루를 먹인 실은 마침내 누군가의 연실을 잘랐다. 하늘 속으로 둥실 떠오르는 연. 저 멀리 끊어져 날아가는 연을 잡기 위해 내달리던 아이들. 바로 그 들판을 달렸다. 몇 달 숙성됐다고는 해도 거죽만 검을 뿐 속은 똥이었으니 내달리던 아이들은 속절없이 미끄러졌다. 어떤 놈은 울고 어떤 놈은 웃고.
그때 담장 옆에서 그 모양을 보고 있던 내게 무슨 소리가 들렸다. 신음소리 같았다. 부랑아 보호소 담벼락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였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높은 담장엔 유리 파편까지 박혀 들여다볼 수 없었다. 역전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잡혀 온 아이들이 그 안에 갇혀 있었다. 우리 모두 봉고차에서 내리며 겁먹은 얼굴로 두리번거리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배추 끌텅이라도 주랴? 그래, 형, 줘! 그걸 먹으면 채독에 걸린다는 걸 알면서도 우린 누가 시킨 것처럼 배추 뿌리를 캐 담장 안으로 던졌다. 아직은 겨울 끝자락이었다.
앉지 못하는 고통에야 비로소 떠오른 그때 아이들. 한 치 앞을 못 보는 삶이라도 생명은 귀한 것이다. 성남, 송파의 모녀들, 다음 소희, 김용균들, 성폭과 학폭 피해자들, 부당하게 대접받는 외국인 노동자들. 버스기사의 800원 횡령은 유죄, 아들을 통해 받은 곽상도의 50억 수수는 무죄. 그래서 T. S. 엘리엇(Elliott)의 사월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다. 담장 너머까지 고루 볕이 들어야 진정한 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