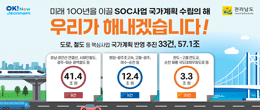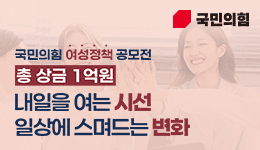4월엔 깃발을 들자- 이순화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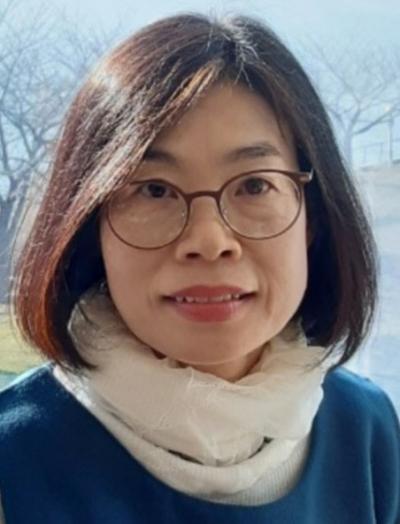 |
황무지에서도 화려한 꽃을 피우는 가장 잔인한 계절이 4월이라고 어느 시인은 노래했다. 4월은 어느 한 날도 허투루 살기는 어렵다. 제주 4·3항쟁, 4·16 세월호 참사, 4·19혁명 그리고 4·20 장애인의 날이 있는 달이다. 장애인 당사자인 나는 체육관에 모여서 기념식을 하고 점심식사를 나누거나 나들이를 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를 외치는 박제화된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 되어야 한다.
22년 전 중증 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며 폭발적으로 투쟁한 것은 ‘중중 장애인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광주에서도 작년 4월 20일에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약칭 420공투단)을 조직하여 거리 행진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장애인 정책을 광주광역시와 정당에 전달했다. 그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에게 전달했던 장애인 정책은 특별한 것이 아닌 광주시민으로써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보장 요구안이었다.
2022년에 요구했던 광주 지역 장애인 정책을 돌아보며 1년 동안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지난해 장애인 단체 등이 광주시에 요구했던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광주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시 추가 지원체계 개편 및 지원 확대 등), 둘째 광주광역시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및 실효성 있는 제2차 광주광역시 탈시설 자립생활 5개년 계획 (22년~26년) 시행(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탈시설·자립 지원 전담팀 구성 및 전문관 배치 등), 셋째 광주광역시 여성 장애인 기본 조례 제정, 넷째 실효성 있는 제4차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이행 방안 마련, 다섯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여섯째 광주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 실시(공공일자리 200개 마련), 일곱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면 개정, 여덟째 감염병 관련 장애인 종합 지원 대책 마련 등이다.
세상은 벌써 화려한 꽃 잔치로 마스크까지 벗고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삶을 화사한 봄을 누리기는커녕 생존을 위한 싸움을 이어 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비문명적인 사회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장애인이 되어 가는 과정을 살고 있다. 나이가 들면 걷는 것이나 보고 듣고 말하는 것도 힘이 든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 삶의 마지막에는 누구나 장애를 경험하고 산다. 그래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 교통약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이동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이 해당 된다. 광주시민들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장 힘들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으로, 시민으로, 지역 주민으로 살고 싶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가 왜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올해 다시 ‘420 정책 요구안’을 준비하고 있다. 1년 동안 광주시장이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문명 안에서 함께 살아갈 것을 요구하며, 이 문명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혁되기를 바랄뿐이다.
지난해 장애인 단체 등이 광주시에 요구했던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광주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시 추가 지원체계 개편 및 지원 확대 등), 둘째 광주광역시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및 실효성 있는 제2차 광주광역시 탈시설 자립생활 5개년 계획 (22년~26년) 시행(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탈시설·자립 지원 전담팀 구성 및 전문관 배치 등), 셋째 광주광역시 여성 장애인 기본 조례 제정, 넷째 실효성 있는 제4차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이행 방안 마련, 다섯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여섯째 광주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 실시(공공일자리 200개 마련), 일곱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면 개정, 여덟째 감염병 관련 장애인 종합 지원 대책 마련 등이다.
세상은 벌써 화려한 꽃 잔치로 마스크까지 벗고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삶을 화사한 봄을 누리기는커녕 생존을 위한 싸움을 이어 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비문명적인 사회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장애인이 되어 가는 과정을 살고 있다. 나이가 들면 걷는 것이나 보고 듣고 말하는 것도 힘이 든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 삶의 마지막에는 누구나 장애를 경험하고 산다. 그래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 교통약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이동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이 해당 된다. 광주시민들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장 힘들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으로, 시민으로, 지역 주민으로 살고 싶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가 왜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올해 다시 ‘420 정책 요구안’을 준비하고 있다. 1년 동안 광주시장이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문명 안에서 함께 살아갈 것을 요구하며, 이 문명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혁되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