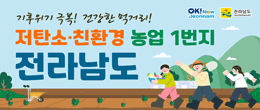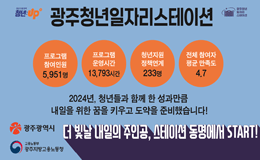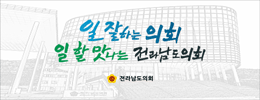이효복 시인 ‘달밤, 국도 1번’ 발간
“국도 1번에 담긴 시대정신 고향 장성 애환의 발자취 담아”
교사로 재직…35년만에 시집 펴내
농촌 풍경·나눔의 정 이미지화
광주의 오월·코로나 현실 등 조명
“시는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탯줄”
교사로 재직…35년만에 시집 펴내
농촌 풍경·나눔의 정 이미지화
광주의 오월·코로나 현실 등 조명
“시는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탯줄”
 |
시인에게 고향은 원초적 공간이다. 어느 시인도 창작을 하는 동안 자신이 태어난 고향의 자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고향은 존재를 규정하고 존재를 지지한다. 고향이 생래적인 공간이라면 발을 딛고 선 현실은 현존의 공간이다. 현존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장성 출신 이효복 시인의 시에는 늘 특정 공간이 나온다. 백수인 시인(조선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은 “이 장소가 화자의 체험과 과거의 기억을 통해 재구될 때 비로소 장소성을 갖게 된다”며 “그가 시적 의미의 틀로 설정한 공간의 장소성은 ‘꿈’의 전개 방식과 유사하게 언술된다”고 평한다.
이효복 시인이 35년만에 창작집 ‘달밤, 국도 1번’(문학들)을 펴냈다.
시집에는 고향 장성과 살고 있는 광주, 그리고 정읍 등 국도 1번에 자리한 도시와 공간 등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다수 수록돼 있다.
오랫동안 시를 써왔지만 정작 시집으로 엮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앞으로 나서기보다 ‘있는 듯 없는 듯’ 뒷전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내는 스타일이다.
“시는 나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탯줄입니다. 시는 세상에 대한 연민이며 요람이기도 하구요. 또한 시는 뜻이고 마음입니다. 시를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것, 절박함이 시를 이룬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 90년대 초반에 시집을 펴낸 이후 시인은 오랫동안 시를 쓰지 않았다. 아니 시를 쓰지 않았다기보다 끊임없이 시를 썼지만 거의 활자화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고,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을 강의하기도 했다. “학생들과 시 모음집도 만들고 시화전을 개최하기도 하면서” 늘 문학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어쩌면 이번 시들에 붙은 ‘꿈’이라는 부제는 ‘끈’으로 치환할 수도 있겠다.
그는 시는 나 자신과의 약속인 동시에 시의 원천은 길 잃음에 있다고 말한다. “세상에 무엇엔가 홀려 자꾸 길을 잃는데 나를 온전히 잃음(파괴)으로 나는 다시 창조”되는 이치와 같다는 얘기다.
언급했다시피 이번 시집은 특정 공간의 기억을 현재로 소환해 그것을 새롭게 시인의 눈으로 재구성하는 데 특징이 있다. 시인은 그 공간들 속에서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찾아내 각각의 존재와 기억들에 의미를 붙여주는 것 같다.
“고향 장성의 뼈아픈 애환의 발자취를 더듬었어요. ‘자라뫼 마을’의 농촌 풍경과 소소한 나눔의 정을 이미지화하고 장성 백비에서 마음을 추스르는 시도 있습니다. 고향 마을 어르신을 만나 6·25의 참상을 듣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몰살’ 집안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는 시로 쓴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고향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달밤, 국도 1번’을 오가며 바라보고 생각하며 느낀 세상에 대한 단상을 이미지화 한 작품들도 있다. 시인은 “자꾸만 죽고 사라져 가는 생명 사상과 연계해” 시로 형상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1980년 당시 목포경찰서장이었던 작은아버지 이준규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작은 아버지의 생애는 ‘90일간의 구금과 그로 인한 사망’으로 압축된다.
“1980년 5월/ 목포경찰서장 이준규/ 90일간의 구금과 파면/ 그 흔적조차 아득하다// 어느 시인이 내게 전해 준/ ‘안병하 평전’을 읽다가/ 사진 한 잔을 본다//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5·18 당시 안병하/ 도경국장의 지시에 따라 무기 사전 대피 등 시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합수부에 끌려가 고문과/ 구속, 파면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4년 후 사망했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꿈이었다.”
‘이준규-목포’라는 시는 80년 5월의 고통과 상흔이 여전한 현실임을 보여준다. “시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고문과 구속을 당하고 파면을 당해야 했던 작은아버지의 삶은 시대의 격랑에 무참하게 스러져야 했던 한 인물의 역사를 고스란히 대변한다.
50여 편의 시에서 시인은 곡진하게 꿈의 기억, 체험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론 시대정신을 노래한다. 국도 1번에 드리워진 시대정신을 특유의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광주 중앙여고에서 양성우 시인을 만났고, 대학에서 문병란 선생님을 만났고, 졸업 후엔 조태일 선생님을 만났다”는 말과 일정 부분 연계된다.
이번 시집을 발간하면서 남편 박현우 시인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89년에 ‘부부교사 부부시인’으로 TV에 소개되기도 했다. “남편이 많이 읽어주고 격려도 아끼지 않아 용기를 냈다”는 말에서 시를 매개로 한 부부시인의 행로가 그려진다.
한편 이효복 시인은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1976년 ‘시문학’에 ‘눈동자’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부부시집 ‘풀빛도 물빛도 하나로 만나’, ‘나를 다 가져오지 못했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성 출신 이효복 시인의 시에는 늘 특정 공간이 나온다. 백수인 시인(조선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은 “이 장소가 화자의 체험과 과거의 기억을 통해 재구될 때 비로소 장소성을 갖게 된다”며 “그가 시적 의미의 틀로 설정한 공간의 장소성은 ‘꿈’의 전개 방식과 유사하게 언술된다”고 평한다.
 |
시집에는 고향 장성과 살고 있는 광주, 그리고 정읍 등 국도 1번에 자리한 도시와 공간 등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다수 수록돼 있다.
오랫동안 시를 써왔지만 정작 시집으로 엮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앞으로 나서기보다 ‘있는 듯 없는 듯’ 뒷전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내는 스타일이다.
지난 90년대 초반에 시집을 펴낸 이후 시인은 오랫동안 시를 쓰지 않았다. 아니 시를 쓰지 않았다기보다 끊임없이 시를 썼지만 거의 활자화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고,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을 강의하기도 했다. “학생들과 시 모음집도 만들고 시화전을 개최하기도 하면서” 늘 문학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어쩌면 이번 시들에 붙은 ‘꿈’이라는 부제는 ‘끈’으로 치환할 수도 있겠다.
그는 시는 나 자신과의 약속인 동시에 시의 원천은 길 잃음에 있다고 말한다. “세상에 무엇엔가 홀려 자꾸 길을 잃는데 나를 온전히 잃음(파괴)으로 나는 다시 창조”되는 이치와 같다는 얘기다.
언급했다시피 이번 시집은 특정 공간의 기억을 현재로 소환해 그것을 새롭게 시인의 눈으로 재구성하는 데 특징이 있다. 시인은 그 공간들 속에서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찾아내 각각의 존재와 기억들에 의미를 붙여주는 것 같다.
“고향 장성의 뼈아픈 애환의 발자취를 더듬었어요. ‘자라뫼 마을’의 농촌 풍경과 소소한 나눔의 정을 이미지화하고 장성 백비에서 마음을 추스르는 시도 있습니다. 고향 마을 어르신을 만나 6·25의 참상을 듣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몰살’ 집안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는 시로 쓴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고향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달밤, 국도 1번’을 오가며 바라보고 생각하며 느낀 세상에 대한 단상을 이미지화 한 작품들도 있다. 시인은 “자꾸만 죽고 사라져 가는 생명 사상과 연계해” 시로 형상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1980년 당시 목포경찰서장이었던 작은아버지 이준규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작은 아버지의 생애는 ‘90일간의 구금과 그로 인한 사망’으로 압축된다.
“1980년 5월/ 목포경찰서장 이준규/ 90일간의 구금과 파면/ 그 흔적조차 아득하다// 어느 시인이 내게 전해 준/ ‘안병하 평전’을 읽다가/ 사진 한 잔을 본다//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5·18 당시 안병하/ 도경국장의 지시에 따라 무기 사전 대피 등 시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합수부에 끌려가 고문과/ 구속, 파면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4년 후 사망했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꿈이었다.”
‘이준규-목포’라는 시는 80년 5월의 고통과 상흔이 여전한 현실임을 보여준다. “시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고문과 구속을 당하고 파면을 당해야 했던 작은아버지의 삶은 시대의 격랑에 무참하게 스러져야 했던 한 인물의 역사를 고스란히 대변한다.
50여 편의 시에서 시인은 곡진하게 꿈의 기억, 체험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론 시대정신을 노래한다. 국도 1번에 드리워진 시대정신을 특유의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광주 중앙여고에서 양성우 시인을 만났고, 대학에서 문병란 선생님을 만났고, 졸업 후엔 조태일 선생님을 만났다”는 말과 일정 부분 연계된다.
이번 시집을 발간하면서 남편 박현우 시인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89년에 ‘부부교사 부부시인’으로 TV에 소개되기도 했다. “남편이 많이 읽어주고 격려도 아끼지 않아 용기를 냈다”는 말에서 시를 매개로 한 부부시인의 행로가 그려진다.
한편 이효복 시인은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1976년 ‘시문학’에 ‘눈동자’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부부시집 ‘풀빛도 물빛도 하나로 만나’, ‘나를 다 가져오지 못했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