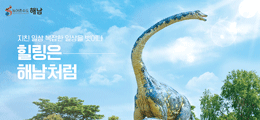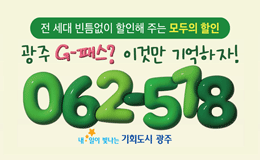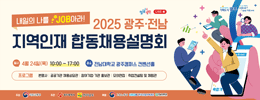세 번째 코로나 봄
“갯벌에 봄이 찾아왔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얼마 전 보성 벌교 인근 갯벌을 찾았을 때 한 주민에게 물었다. 주민의 대답은 ‘찔렁게’였다. 그곳에서는 칠게를 ‘찔렁게’라고 부른다. 눈길을 갯벌로 돌려보니 많은 칠게들이 눈에 띄었다. 두 발로 부지런히 뭔가를 집어먹으면서 가끔씩 기지개를 켜듯 만세 동작을 반복했다. 긴 겨울잠을 자고 나온 칠게들의 활기찬 움직임은 마치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달려 나온 학생들과 다름없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1817~1862)는 1852년부터 2년 2개월 여 동안 월든(walden) 호수 주변 오두막집에서 홀로 머물렀다. 그는 해빙(解氷)되는 호수를 보며 비로소 봄이 오는 것을 알았다. 3월 중순께 처음으로 새소리가 들리고 3월 말~4월 초에 두껍게 얼었던 호수가 풀렸다. 그는 10여 년 후 펴낸 ‘월든’에서 “점잖은 설득력을 가진 해동(解凍)이 망치를 든 ‘우레의 신’ 토르보다 힘이 더 세다”며 “전자는 살살 녹이지만 후자는 산산조각으로 부숴 버릴 뿐이다”라고 했다.
코로나19와 함께 세 번째 봄을 맞았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감염병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다. 이전 두 해의 봄은 너무나 굳어버린 마음 탓에 그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집안에 갇히다시피 살면서 사람들은 집 근처에 있는 숲과 나무, 식물 등 초록 빛깔이 발산하는 위로와 힐링의 효과를 뒤늦게 깨달았다.
올해도 여전히 마스크를 쓴 풍경은 변함없지만 이전과 달리 곳곳이 상춘객들로 붐빈다. 무등산 너덜겅 진달래꽃과 구례 화엄사 흑매(黑梅), 나주 목사내아 벚꽃, 금사정(錦社亭) 동백꽃 등 ‘마음속에 간직한’ 봄 풍경을 호젓하게 찾는 이들도 많다.
세 해째 접어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소로우의 ‘월든’을 다시 펼쳤다. 170여 년 전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의 우리들 역시 코로나19 속에서 대자연을 예찬하고 물질 만능의 문명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코로나에 빼앗긴 마음에도 봄은 찾아왔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kwangju.co.kr
올해도 여전히 마스크를 쓴 풍경은 변함없지만 이전과 달리 곳곳이 상춘객들로 붐빈다. 무등산 너덜겅 진달래꽃과 구례 화엄사 흑매(黑梅), 나주 목사내아 벚꽃, 금사정(錦社亭) 동백꽃 등 ‘마음속에 간직한’ 봄 풍경을 호젓하게 찾는 이들도 많다.
세 해째 접어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소로우의 ‘월든’을 다시 펼쳤다. 170여 년 전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의 우리들 역시 코로나19 속에서 대자연을 예찬하고 물질 만능의 문명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코로나에 빼앗긴 마음에도 봄은 찾아왔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