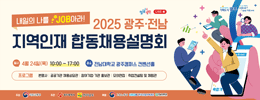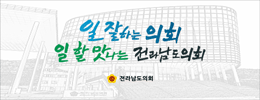도시계획의 실패
어쩌다가 광주는 온통 고층 아파트로 뒤덮인 도시가 됐는가. 서울의 아파트는 어찌하여 평범한 직장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 초고가 주거 공간이 돼 버렸는가. 인구 정체인 지방 대도시와 북적이는 수도 서울은 왜 똑같은 부동산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급증한 주거 비용이 과연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행정기관이 토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면 당연히 땅값은 올라간다. 자연녹지나 산업단지, 저층 주거지 등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개발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용도가 바뀌면서 ㎡당 10만 원 안팎이었던 땅값은 순식간에 100만 원 넘게 뛴다.
아파트 개발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주도하는데 시행사는 이러한 ‘토지 작업’을, 시공사는 ‘건축’을 맡는다. 시행사는 용도 변경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시공사는 아무런 견제 없이 분양가를 계속 올리면서 또 한 번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그 이익을 환수하고, 분양가 공개와 건축 원가 조사를 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미 한몫 단단히 챙긴 투기꾼들이 광주를 비롯해 전국 도시를 돌고, 여기에 지역 자생 투기 세력들까지 합세해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았음에도 수수방관했다.
도시를 오로지 부동산 시장으로 보고, 주택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급 중심의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하며, 민간에 내맡긴 결과가 지금의 이 모습이다. 그런데도 전국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이 부족한 서울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일률적인 정책 탓에 인구도, 여건도, 정체성도 너무 다른 지방 도시 광주에 고층 아파트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도시계획에서 실패한 것이다. 도시들이 각각의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공원, 광장, 보행로 등을 확보하고, 지역 주택 수요를 감안해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며, 행정 행위로 상승한 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했어야 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해결책이 보인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kwangju.co.kr
아파트 개발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주도하는데 시행사는 이러한 ‘토지 작업’을, 시공사는 ‘건축’을 맡는다. 시행사는 용도 변경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시공사는 아무런 견제 없이 분양가를 계속 올리면서 또 한 번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그 이익을 환수하고, 분양가 공개와 건축 원가 조사를 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미 한몫 단단히 챙긴 투기꾼들이 광주를 비롯해 전국 도시를 돌고, 여기에 지역 자생 투기 세력들까지 합세해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았음에도 수수방관했다.
사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도시계획에서 실패한 것이다. 도시들이 각각의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공원, 광장, 보행로 등을 확보하고, 지역 주택 수요를 감안해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며, 행정 행위로 상승한 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했어야 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해결책이 보인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