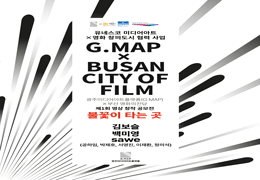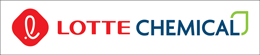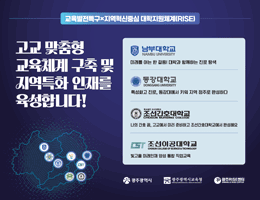‘김원기 선생님’을 찾습니다
30년 전 영화 주인공 같았던
포기를 모르는 고집 센 의사
포기를 모르는 고집 센 의사
 채 희 종 편집부국장·사회부장 |
누구나 사는 동안 잊지 못하는 사람 한둘은 있을 것이다. 인생의 진로를 밝혀 준 스승이나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멘토, 부족한 나를 당치않은 믿음으로 지지해 준 친구…. 낙엽이 떨어지는 이맘때면 첫사랑 순이도 있겠고, 부모나 배우자를 여읜 사람이라면 의당 그리움에 눈시울을 적시지 않은 채 이 가을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30년 전인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어려운 형편 탓에 사회에 대한 반발심이 강했던 20대 초반, 세상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 준 이가 있었다. 올 한 해 의료 파업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더욱 생각나는 사람이다.
그해 겨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조선대병원에 입원하셨다. 약물 치료 과정에서 독성 간염이 생겨 내과병동 2인실을 사용했는데 병실에는 20대 후반의 청년이 먼저 와 있었다. 병명은 기억나지 않는데, 수만 명 가운데 한 명 정도 발생하는 희귀병으로 시력을 잃어 가는 질환이라고 했다.
어느 날 밤, 우리 병실에서 담당 주치의(내과 레지던트 2년차로 기억함)와 그의 선배로 추정되는 안과의사가 심한 언쟁을 벌였다. 안과의사는 청년 쪽을 한번 쳐다본 뒤, “김 선생, 저 사람은 끝났어요. 대책이 없다니까 그러네”라고 말했다. 그러자 내과 의사는 “제가 어제부터 여러 자료를 봤는데, 드물지만 내과적 원인으로 시력이 약해진 것일 수 있어요. 제가 보도록 해 주세요”라고 응수했다. 대화 말미에 안과의사가 “김 선생, 진짜 고집 세네. 그래요. 알아서 한번 해 보시오” 라며 나가는 것이었다.
그로써 논쟁은 끝이 났지만 흡사 메디컬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열연하는 모습을 본 듯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과 함께 콧날이 시큰해졌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주치의 이름은 아직 생생히 기억한다. 김원기 선생님. 이후 신문기자가 된 뒤 외부 강의를 하거나 의사들을 만날 때면 김원기 선생님 얘기를 자주 했다.
의료 담당 기자로서 취재를 하거나 만난 의사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이는 광주 광천동의 한 내과 원장이다. 이름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성명을 밝히지는 않겠다. 알레르기를 전공한 그는 대기 환자가 많아도 한 명당 상담 시간이 20분을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종합병원의 정밀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전화까지 걸어 재촉하고, 환자가 위중한 상황일 때는 종합병원 의사에게 연락해 상태를 직접 듣는 등 환자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보인다.
그동안 훌륭한 의사 말고 각종 비리나 범죄에 연루된 불량 의사들도 많이 봤다. 범죄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나쁜 의사’도 있다.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환자가 ‘체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불같이 화를 냈다. “‘체한다’는 말이 뭐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라며 짜증을 내는 것이었다. 환자는 교수의 말보다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 더욱 기분 나빴다고 한다.
‘체하다’는 국어대사전에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배 속에 답답하게 처져 있다’는 뜻으로 등재된 어엿한 표준어이다. 환자가 의학용어를 모르고, 설혹 표현을 잘못했더라도 환자의 눈높이에서 상담하는 게 의사의 기본 아닌가. 그 교수에게 묻고 싶다. “소화가 안 되고 오목가슴이 답답한데, 혹시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인가요? 아니면 맹장염의 징조인가요?”라면서 잘난 체하는 환자가 혹시 오게 되면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번 여름 모 대학병원 응급실 밖에서 생긴 일이다. 병원 지리를 잘 모르는 여든 가까운 할머니가 “아저씨, 주차장이 어디요?”라고 젊은 의사에게 물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네 번을 물어도 모른 체하자 할머니는 차를 돌려 의사 옆에 세운 뒤 또다시 물었다. 그러자 못마땅한 어조로 “저 아저씨 아닌데요”라고 말하더니 주차장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화가 났지만 아들도 의사인지라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 평일 밤 응급실을 지키는 젊은 의사면 전공의일 텐데, 젊은 나이에 노인들에게까지 존칭을 들으려는 이런 ‘버르장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 부여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물론 재응시 기회 부여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의료 개혁에 대한 의·정 대립과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적성과 실력을 떠나 고교생이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직업이 의사이다. 믿음과 선망의 대상인 만큼 의사의 일탈 행위와 실망스러운 태도에 대한 비난 강도는 거셀 수밖에 없다. 지금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으로 ‘코로나19’를 이겨 내고 있음에 감사한다. 하지만 의사들은 국민이 의사보다 정부 편에 서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김원기 선생님! 아버지를 잘 치료해 주셨는데 30년 전에는 제가 어려서 고맙다는 말씀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조선대병원에 입원하셨다. 약물 치료 과정에서 독성 간염이 생겨 내과병동 2인실을 사용했는데 병실에는 20대 후반의 청년이 먼저 와 있었다. 병명은 기억나지 않는데, 수만 명 가운데 한 명 정도 발생하는 희귀병으로 시력을 잃어 가는 질환이라고 했다.
어느 날 밤, 우리 병실에서 담당 주치의(내과 레지던트 2년차로 기억함)와 그의 선배로 추정되는 안과의사가 심한 언쟁을 벌였다. 안과의사는 청년 쪽을 한번 쳐다본 뒤, “김 선생, 저 사람은 끝났어요. 대책이 없다니까 그러네”라고 말했다. 그러자 내과 의사는 “제가 어제부터 여러 자료를 봤는데, 드물지만 내과적 원인으로 시력이 약해진 것일 수 있어요. 제가 보도록 해 주세요”라고 응수했다. 대화 말미에 안과의사가 “김 선생, 진짜 고집 세네. 그래요. 알아서 한번 해 보시오” 라며 나가는 것이었다.
의료 담당 기자로서 취재를 하거나 만난 의사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이는 광주 광천동의 한 내과 원장이다. 이름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성명을 밝히지는 않겠다. 알레르기를 전공한 그는 대기 환자가 많아도 한 명당 상담 시간이 20분을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종합병원의 정밀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전화까지 걸어 재촉하고, 환자가 위중한 상황일 때는 종합병원 의사에게 연락해 상태를 직접 듣는 등 환자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보인다.
그동안 훌륭한 의사 말고 각종 비리나 범죄에 연루된 불량 의사들도 많이 봤다. 범죄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나쁜 의사’도 있다.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환자가 ‘체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불같이 화를 냈다. “‘체한다’는 말이 뭐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라며 짜증을 내는 것이었다. 환자는 교수의 말보다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 더욱 기분 나빴다고 한다.
‘체하다’는 국어대사전에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배 속에 답답하게 처져 있다’는 뜻으로 등재된 어엿한 표준어이다. 환자가 의학용어를 모르고, 설혹 표현을 잘못했더라도 환자의 눈높이에서 상담하는 게 의사의 기본 아닌가. 그 교수에게 묻고 싶다. “소화가 안 되고 오목가슴이 답답한데, 혹시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인가요? 아니면 맹장염의 징조인가요?”라면서 잘난 체하는 환자가 혹시 오게 되면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번 여름 모 대학병원 응급실 밖에서 생긴 일이다. 병원 지리를 잘 모르는 여든 가까운 할머니가 “아저씨, 주차장이 어디요?”라고 젊은 의사에게 물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네 번을 물어도 모른 체하자 할머니는 차를 돌려 의사 옆에 세운 뒤 또다시 물었다. 그러자 못마땅한 어조로 “저 아저씨 아닌데요”라고 말하더니 주차장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화가 났지만 아들도 의사인지라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 평일 밤 응급실을 지키는 젊은 의사면 전공의일 텐데, 젊은 나이에 노인들에게까지 존칭을 들으려는 이런 ‘버르장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 부여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물론 재응시 기회 부여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의료 개혁에 대한 의·정 대립과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적성과 실력을 떠나 고교생이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직업이 의사이다. 믿음과 선망의 대상인 만큼 의사의 일탈 행위와 실망스러운 태도에 대한 비난 강도는 거셀 수밖에 없다. 지금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으로 ‘코로나19’를 이겨 내고 있음에 감사한다. 하지만 의사들은 국민이 의사보다 정부 편에 서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김원기 선생님! 아버지를 잘 치료해 주셨는데 30년 전에는 제가 어려서 고맙다는 말씀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