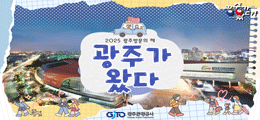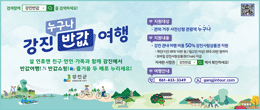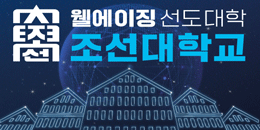[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빵돌이 빵순이
 |
최근 몇 년 간 통계를 보면 한국인 1인당 밀가루 소비량은 연간 30~35킬로그램 정도다. 밀가루가 주식인 미국이나 이탈리아의 절반 정도다. 섭취량이 적은 아이와 노인을 빼면 소비량이 상당하다. 성인 기준으로 매일 라면 한 개 이상을 먹는 셈이니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전부냐. 아니다. 과자나 면으로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소비하는 양도 꽤 될 것이다.
더 있다. 직접 먹는 건 아니지만 가축의 사료로 쓰는 게 또 그만큼의 양이다. 그 가축 고기는 우리가 먹는 것이니 크게 보면 소비량이 두 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우리가 얼마나 빵을 좋아하면 어느 고위 정부인사는 한 지역방송국 사장으로 근무할 때 법인카드로 다량의 빵을 구매하기도 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화가 나서 붙여준 별명이 빵순이다.
사실 빵순이라는 말을 그에게 붙인 건 적절하지 않다. 빵순이, 빵돌이는 빵 좋아하는 이들의 애칭이고 절대 비판의 용어로 쓰지 않기 때문이다. 빵! 나는 어렸을 때 책에서 이 낱말만 나오면 아주 힘들었다. 먹고 싶은데 빵 살 돈이 없었다. 유료 급식으로 나오는 빵도 사먹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빵이란 말을 들으면 설레고 침이 고인다. 그 빵을 부끄럽게 한 사람이여!
우리나라는 왕년에 밀을 꽤 심었다. 하지만 쌀 중심 농업은 밀 재배 면적을 밀어냈다. 사실 모를 내고 물을 넣어 기르는 벼는 면적당 소출이 밀보다 높다. 좁은 토지의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면 쌀을 얻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밀은 별미였다. 돈 있는 사람들이 점심으로 밀국수를 내어 먹었다. 요새 인기 있고 비싼 메밀 냉면은 과거에는 밀국수보다 더 낮은 음식이었다. 밀이 더 귀중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빵의 시대를 맞은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일본은 국가의 목표를 일찍이 서구로 잡았고 큰 체구를 위해서는 고기와 빵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문화가 조선으로 들어왔다. 단팥빵이 한국 대표 빵이 된 것은 그런 연유다. 동양적 팥을 서양의 빵에 넣어서 동서절충식으로 개발한 게 일본인이었던 까닭이다.
이렇듯 단팥빵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배경을 갖고 있으나 빵이야 뭔 죄가 있나. 나는 지금도 툭 하면 단팥빵을 사먹는다. 맛있는 단팥빵이 있다면 어디든 간다. 잘 발효되어 폭신하고 겉은 윤기가 좌르르 돌아서 식욕을 돋우는 그런 단팥빵을 좋아한다. 질 좋은 팥을 아끼지 않아서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단팥빵은 오랜 기간 고급 빵이었는데 돈 없는 서민은 찐빵집에서 만든 걸 사먹었다. 오븐에 구운 것이 아니고 발효 반죽에 팥소를 조금 넣고 찐 것이라 값이 쌌다. 만두와 함께 흰 김을 뿜으며 솥에서 탄생하던 그 장면은 잊을 수 없다. 한동안 거의 사라졌다가 복고풍으로 다시 시장이나 동네에 보인다. 유명한 안흥찐빵(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서 탄생)도 그런 빵의 일종이다. 막걸리로 발효한, 어쩌면 한국식 빵의 조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은 쌀 부족과 극심한 식량난에 직면했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은 식량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때부터 미국은 식량 원조의 일환으로 대량의 밀가루를 한국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미군정 시절부터 시작된 이 원조는 1950년대 내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밀가루는 단순한 대체식량이 아니라 한국인의 식생활 구조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 1955년 미국의 PL480(공공법 480호, 일명 식량원조법)에 따라 한국에 밀가루가 무상 또는 저가로 대량 공급되었고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제빵소를 크게 늘렸다. 빵은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시대의 산물로 사랑을 받기 시작한 셈이다. 이후 제빵회사들이 급증했고 동네 가게마다 빵이 깔렸다. 빵이 가득 든 리어카를 끌고 동네마다 배달하던 아저씨들이 기억난다.
선행으로 유명한 대전의 한 빵집이 직접 우리 밀을 심기 시작했다. 우리 밀은 한때 점유율 3퍼센트 가까이 늘어나다가 지금은 많이 위축되어 1퍼센트가 안된다. 이런 위기에 대형 빵집의 뜻 있는 의도는 칭찬받아야 한다. 너도나도 더 많은 빵집에서 우리밀을 쓰고 거기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식 칼럼리스트>
사실 빵순이라는 말을 그에게 붙인 건 적절하지 않다. 빵순이, 빵돌이는 빵 좋아하는 이들의 애칭이고 절대 비판의 용어로 쓰지 않기 때문이다. 빵! 나는 어렸을 때 책에서 이 낱말만 나오면 아주 힘들었다. 먹고 싶은데 빵 살 돈이 없었다. 유료 급식으로 나오는 빵도 사먹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빵이란 말을 들으면 설레고 침이 고인다. 그 빵을 부끄럽게 한 사람이여!
우리가 빵의 시대를 맞은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일본은 국가의 목표를 일찍이 서구로 잡았고 큰 체구를 위해서는 고기와 빵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문화가 조선으로 들어왔다. 단팥빵이 한국 대표 빵이 된 것은 그런 연유다. 동양적 팥을 서양의 빵에 넣어서 동서절충식으로 개발한 게 일본인이었던 까닭이다.
이렇듯 단팥빵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배경을 갖고 있으나 빵이야 뭔 죄가 있나. 나는 지금도 툭 하면 단팥빵을 사먹는다. 맛있는 단팥빵이 있다면 어디든 간다. 잘 발효되어 폭신하고 겉은 윤기가 좌르르 돌아서 식욕을 돋우는 그런 단팥빵을 좋아한다. 질 좋은 팥을 아끼지 않아서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단팥빵은 오랜 기간 고급 빵이었는데 돈 없는 서민은 찐빵집에서 만든 걸 사먹었다. 오븐에 구운 것이 아니고 발효 반죽에 팥소를 조금 넣고 찐 것이라 값이 쌌다. 만두와 함께 흰 김을 뿜으며 솥에서 탄생하던 그 장면은 잊을 수 없다. 한동안 거의 사라졌다가 복고풍으로 다시 시장이나 동네에 보인다. 유명한 안흥찐빵(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서 탄생)도 그런 빵의 일종이다. 막걸리로 발효한, 어쩌면 한국식 빵의 조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은 쌀 부족과 극심한 식량난에 직면했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은 식량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때부터 미국은 식량 원조의 일환으로 대량의 밀가루를 한국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미군정 시절부터 시작된 이 원조는 1950년대 내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밀가루는 단순한 대체식량이 아니라 한국인의 식생활 구조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 1955년 미국의 PL480(공공법 480호, 일명 식량원조법)에 따라 한국에 밀가루가 무상 또는 저가로 대량 공급되었고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제빵소를 크게 늘렸다. 빵은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시대의 산물로 사랑을 받기 시작한 셈이다. 이후 제빵회사들이 급증했고 동네 가게마다 빵이 깔렸다. 빵이 가득 든 리어카를 끌고 동네마다 배달하던 아저씨들이 기억난다.
선행으로 유명한 대전의 한 빵집이 직접 우리 밀을 심기 시작했다. 우리 밀은 한때 점유율 3퍼센트 가까이 늘어나다가 지금은 많이 위축되어 1퍼센트가 안된다. 이런 위기에 대형 빵집의 뜻 있는 의도는 칭찬받아야 한다. 너도나도 더 많은 빵집에서 우리밀을 쓰고 거기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식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