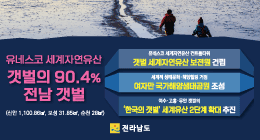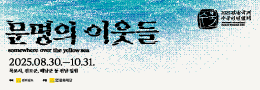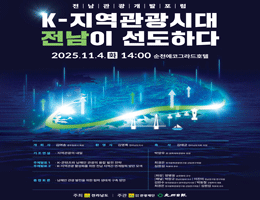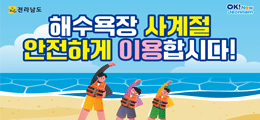AI시대, 대학의 존재 이유- 김해연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3년
 |
요즘은 리포트를 쓸 때마다 ChatGPT를 먼저 실행한다. 내가 다루고 싶은 주제와 분량만 입력하면 순식간에 매끄럽고 논리적인 초안이 완성된다. 지난 학기 밤을 새워 과제를 쓰던 내가 무색해진다. 리포트의 주제 선정부터 관련 논문 검색, 문장 다듬기까지의 힘든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편리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AI로 과제를 마무리한 후에는 공허함이 밀려온다. 분명 ‘완성’이라는 말은 어울리지만 그 속에 내가 들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마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숙제를 손쉽게 끝낸 것처럼 나만의 고민과 생각이 제대로 녹아들지 않은 느낌이다.
이럴 때마다 문득 생각하게 된다. AI가 과제를 대신할 수 있는 시대, 우리는 왜 여전히 대학을 다니고 있을까?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 충분한 세상이 아닌가.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강의실에서 모여앉고 토론하고 때로는 혼란 속에서 방황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지식이 더 이상 인간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 AI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심지어 창의적인 작업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과 학습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수업 중 교수님의 질문에 AI의 설명을 그대로 읊은 학생이 답을 얻지 못하고 멈칫한 장면이 떠오른다. AI의 설명을 그대로 옮긴 학생에게 교수님은 조용히 물었다. “그게 정말 네 생각이니?” 정답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스스로의 사고는 담기지 않았다.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늘 시험대에 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 정답보다 질문을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다.
AI는 정답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왜 그 답이 옳은가’, ‘그 답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 구석에서 고민에 빠져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돌아오는 날들, 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실패 속에서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러한 경험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실패는 불안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학습의 시간이다. 강의실에서 엉뚱한 의견을 냈다가 웃음을 샀던 기억, 발표 중 논리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고 머쓱해졌던 순간들.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든다. 실패를 허락하고 질문이 존중되는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터전이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렇기에 대학은 ‘모름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장소여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재도전을 겪으며 살아가야 한다. 대학은 이러한 삶의 리허설을 경험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강의실에 앉아 있어야 하며 때로는 답을 몰라도 손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향한 나만의 목소리를 만들어간다.
AI가 과제를 대신하는 시대,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의 축적지’가 아니다. 오히려 ‘질문이 허락되는 공간’ ‘실패가 연습되는 시간’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 정답이 아닌 질문을 사랑하고 속도가 아닌 사유를 견디는 힘을 기르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대학에 있어야 하는 이유다.
AI는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삶의 방향은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하고 흔들리며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대학은 그러한 시간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학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고된 리포트 속에서 문장을 붙들고 씨름한 기억이고 시험을 망친 날 친구와 나눴던 허탈한 웃음이다. 그것이 대학을 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우리는 정답보다 진심을, 속도보다 방향을 배워야 한다. 대학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 충분한 세상이 아닌가.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강의실에서 모여앉고 토론하고 때로는 혼란 속에서 방황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수업 중 교수님의 질문에 AI의 설명을 그대로 읊은 학생이 답을 얻지 못하고 멈칫한 장면이 떠오른다. AI의 설명을 그대로 옮긴 학생에게 교수님은 조용히 물었다. “그게 정말 네 생각이니?” 정답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스스로의 사고는 담기지 않았다.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늘 시험대에 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 정답보다 질문을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다.
AI는 정답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왜 그 답이 옳은가’, ‘그 답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 구석에서 고민에 빠져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돌아오는 날들, 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실패 속에서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러한 경험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실패는 불안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학습의 시간이다. 강의실에서 엉뚱한 의견을 냈다가 웃음을 샀던 기억, 발표 중 논리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고 머쓱해졌던 순간들.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든다. 실패를 허락하고 질문이 존중되는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터전이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렇기에 대학은 ‘모름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장소여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재도전을 겪으며 살아가야 한다. 대학은 이러한 삶의 리허설을 경험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강의실에 앉아 있어야 하며 때로는 답을 몰라도 손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향한 나만의 목소리를 만들어간다.
AI가 과제를 대신하는 시대,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의 축적지’가 아니다. 오히려 ‘질문이 허락되는 공간’ ‘실패가 연습되는 시간’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 정답이 아닌 질문을 사랑하고 속도가 아닌 사유를 견디는 힘을 기르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대학에 있어야 하는 이유다.
AI는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삶의 방향은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하고 흔들리며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대학은 그러한 시간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학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고된 리포트 속에서 문장을 붙들고 씨름한 기억이고 시험을 망친 날 친구와 나눴던 허탈한 웃음이다. 그것이 대학을 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우리는 정답보다 진심을, 속도보다 방향을 배워야 한다. 대학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