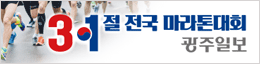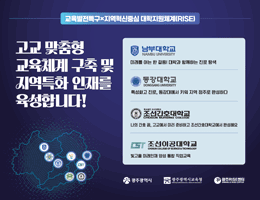오월의 햇살 - 유제관 편집담당1국장
“어두운 밤 함께 하던 젊은 소리가 허공에 흩어져가고 / 아침이 올 때까지 노래하자던 내 친구 어디로 갔나 / 머물다간 순간들 남겨진 너의 그 목소리 / 오월의 햇살 가득한 날 우리 마음 따스하리.” 이선희의 ‘오월의 햇살’은 1980년 5월 26일의 광주를 떠올리게 한다. 43년 전 오늘. 5월 항쟁의 마지막 밤을.
전남도청엔 이제 곧 계엄군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300여 명이었다. 그들은 왜 총을 들었을까. 왜 끝까지 남았을까. 카빈 소총을 들고 정예 공수부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밤이 끝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날 도청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5월 광주의 의미는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이슬비가 어둠을 적셨다. 잠 못 드는 밤은 새벽까지 이어지고, 3시 50분께 도청 옥상 스피커에서는 애절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면 ‘5월 광주’를 지울 테니까. 살아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세상에 알려 달라는 것이다.
애끓는 목소리가 멈추자 이번에는 총소리가 울렸다. 3공수 특공조가 작전을 개시한 것이다. 탕 탕 탕, 드르륵… 탕 탕 탕, 드르륵 드르륵…. 시민군의 항전은 길지 않았다. 불과 2시간 정도. 그러나 가족, 친구, 이웃을 도청에 두고 집에서 그 총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나긴 시간이었다. 잔인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금남로에 탱크와 장갑차가 들어오고, 공수부대원들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승전가를 불렀다. “안되면 되게 하라 특전부대 용사들…” 그렇게 열흘간의 항쟁이 끝났다.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는 이 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7년 뒤 6월 항쟁을 이끌었다고 말한다.
어두운 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청을 지킨 그들은 어떤 세상을 꿈꿨을까. 우리는 지금 그들이 꿈꾼 세상을 살고 있을까.
/유제관 편집담당1국장 jkyou@kwangju.co.kr
이슬비가 어둠을 적셨다. 잠 못 드는 밤은 새벽까지 이어지고, 3시 50분께 도청 옥상 스피커에서는 애절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면 ‘5월 광주’를 지울 테니까. 살아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세상에 알려 달라는 것이다.
어두운 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청을 지킨 그들은 어떤 세상을 꿈꿨을까. 우리는 지금 그들이 꿈꾼 세상을 살고 있을까.
/유제관 편집담당1국장 jk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