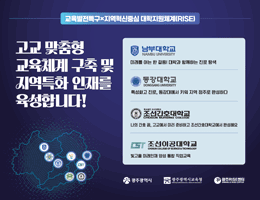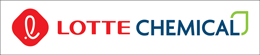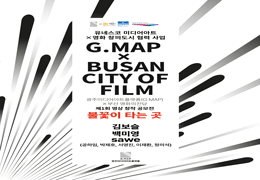고향 풍경 속의 그녀- 이중섭 소설가
 |
몇 달 전부터 밥 한 끼 산다는 그녀를 만났다. 조그만 횟집이었다.
“환갑이 다 되어 좋은 친구를 알게 됐어.”
차가운 바깥에서 막 들어와서인지 그녀의 두 볼이 빨갰다. 그녀에게 남자 친구가 생겼다는 말인가?
“여기 소설에 사인해 줘.”
그녀는 내 소설책 두 권을 내놓았다. 주문한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책을 펼쳐보니 군데군데 메모와 줄이 그어져 있었다. 다른 페이지에는 어디에다 줄을 그었는지 호기심이 일었다. 처음부터 천천히 책을 넘겼다. 모둠회를 포함한 음식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왜 그래? 부끄럽게.”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내 책에는 어디에다 줄을 긋는지 궁금해서….”
소주도 한 병을 주문했지만 배가 고파 밑반찬에 먼저 손이 갔다. 밑줄을 그은 부분은 내 생각과 달랐다. 힘을 줘 썼던 부분이 아니라 조금 다른 곳이었다. 사유보다 풍경이 그려진 문장에 더 많이 그어져 있었다. 단편소설 ‘직박구리가 사는 은행나무’의 마지막 부분에도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 부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
섬뜩했다며 살짝 몸을 떨었다. 죽은 선배가 직박구리가 되어 날아와 나무 위에서 화자가 있는 창가 쪽을 쳐다보는 장면이었다. 약간 의도하여 썼지만 그 정도였나 싶었다. 가만 보니 풍경 속의 나무와 새 그리고 꽃들이 그려진 부분에 밑줄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긴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도시에 와 사는 우리 나이 때의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을 듯싶었다. 그러고 보니 그녀의 걸어온 길이 나와 거의 비슷했다. 초등과 중학교를 고향에서 다녔고 고등학교부터는 광주에서 자취 생활을 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시골에 부모가 있어 자주 내려가는 그런 삶들이 비슷한데 서로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겠는가. 한 고장의 풍습이 한 사람의 삶을 형성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임이 틀림없다.
“산으로 동창 모임으로 다 돌아다녔는데 맘에 들지 않았어. 이제야 진정한 친구를 얻었어. 책처럼 좋은 친구가 없더라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속에 있는 한 문장이 떠올랐다.
“이 세상 도처에서 쉴 곳을 찾아보았으되 마침내 찾아낸, 책이 있는 구석방보다 나은 곳은 없더라.”
구석방, 다락방, 도서관. 책이 있는 모든 공간은 고단한 영혼의 안식처가 분명했다.
이 횟집은 소라와 전복이 싱싱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허기진 상태라 사실 모든 음식이 다 맛있었다. 그녀가 게걸스럽게 먹는 나를 쳐다보며 웃었다.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우리 시대의 남녀 사이는 지금처럼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다. 광주에서 등하교할 때 마주쳐도 서로 눈빛으로 알은척만 할 뿐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제 내 소설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속물 같은 나는 속으로 왠지 굳건한 독자를 한 명 확보했다는 이익 계산을 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무명 소설가다운 어쭙잖은 생각이었다.
“인세 많이 받았을 거 같은데….”
그녀가 부러운 표정으로 확신하듯이 말했다. 그녀에게 출판 시장의 현실을 말해야 하는 내 처지가 조금 구질구질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조그만 기쁨이 반짝거렸다.
배가 불러 음식을 많이 남겼다. 횟집을 나와 우리는 천천히 걸어 가까운 서점에 들렀다. 그녀가 읽고 좋아할 만한 소설을 한 권을 골랐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브 키터리지’다. 최근에 후속작인 ‘오, 윌리엄!’이 출판되었고 아내에게 권할 정도로 독자층이 꽤 넓은 작가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해지는 생의 후반에 외로움과 적막함과 두려움 가운데에도 인생은 축복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책이다. 쇠락한 육신과 해진 마음에도 사랑이 깃들고 노인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담담하게 보여주는 소설이다. 그녀는 나를 전철역까지 바래다 주었다.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꼭 어깨를 웅크리며 걸어가는 우리 나이대의 그녀 어머니 모습이 되어 눈앞에서 흔들렸다.
“환갑이 다 되어 좋은 친구를 알게 됐어.”
차가운 바깥에서 막 들어와서인지 그녀의 두 볼이 빨갰다. 그녀에게 남자 친구가 생겼다는 말인가?
“여기 소설에 사인해 줘.”
그녀는 내 소설책 두 권을 내놓았다. 주문한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책을 펼쳐보니 군데군데 메모와 줄이 그어져 있었다. 다른 페이지에는 어디에다 줄을 그었는지 호기심이 일었다. 처음부터 천천히 책을 넘겼다. 모둠회를 포함한 음식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내 책에는 어디에다 줄을 긋는지 궁금해서….”
소주도 한 병을 주문했지만 배가 고파 밑반찬에 먼저 손이 갔다. 밑줄을 그은 부분은 내 생각과 달랐다. 힘을 줘 썼던 부분이 아니라 조금 다른 곳이었다. 사유보다 풍경이 그려진 문장에 더 많이 그어져 있었다. 단편소설 ‘직박구리가 사는 은행나무’의 마지막 부분에도 줄이 그어져 있었다.
섬뜩했다며 살짝 몸을 떨었다. 죽은 선배가 직박구리가 되어 날아와 나무 위에서 화자가 있는 창가 쪽을 쳐다보는 장면이었다. 약간 의도하여 썼지만 그 정도였나 싶었다. 가만 보니 풍경 속의 나무와 새 그리고 꽃들이 그려진 부분에 밑줄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긴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도시에 와 사는 우리 나이 때의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을 듯싶었다. 그러고 보니 그녀의 걸어온 길이 나와 거의 비슷했다. 초등과 중학교를 고향에서 다녔고 고등학교부터는 광주에서 자취 생활을 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시골에 부모가 있어 자주 내려가는 그런 삶들이 비슷한데 서로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겠는가. 한 고장의 풍습이 한 사람의 삶을 형성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임이 틀림없다.
“산으로 동창 모임으로 다 돌아다녔는데 맘에 들지 않았어. 이제야 진정한 친구를 얻었어. 책처럼 좋은 친구가 없더라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속에 있는 한 문장이 떠올랐다.
“이 세상 도처에서 쉴 곳을 찾아보았으되 마침내 찾아낸, 책이 있는 구석방보다 나은 곳은 없더라.”
구석방, 다락방, 도서관. 책이 있는 모든 공간은 고단한 영혼의 안식처가 분명했다.
이 횟집은 소라와 전복이 싱싱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허기진 상태라 사실 모든 음식이 다 맛있었다. 그녀가 게걸스럽게 먹는 나를 쳐다보며 웃었다.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우리 시대의 남녀 사이는 지금처럼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다. 광주에서 등하교할 때 마주쳐도 서로 눈빛으로 알은척만 할 뿐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제 내 소설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속물 같은 나는 속으로 왠지 굳건한 독자를 한 명 확보했다는 이익 계산을 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무명 소설가다운 어쭙잖은 생각이었다.
“인세 많이 받았을 거 같은데….”
그녀가 부러운 표정으로 확신하듯이 말했다. 그녀에게 출판 시장의 현실을 말해야 하는 내 처지가 조금 구질구질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조그만 기쁨이 반짝거렸다.
배가 불러 음식을 많이 남겼다. 횟집을 나와 우리는 천천히 걸어 가까운 서점에 들렀다. 그녀가 읽고 좋아할 만한 소설을 한 권을 골랐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브 키터리지’다. 최근에 후속작인 ‘오, 윌리엄!’이 출판되었고 아내에게 권할 정도로 독자층이 꽤 넓은 작가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해지는 생의 후반에 외로움과 적막함과 두려움 가운데에도 인생은 축복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책이다. 쇠락한 육신과 해진 마음에도 사랑이 깃들고 노인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담담하게 보여주는 소설이다. 그녀는 나를 전철역까지 바래다 주었다.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꼭 어깨를 웅크리며 걸어가는 우리 나이대의 그녀 어머니 모습이 되어 눈앞에서 흔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