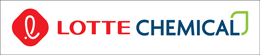역사와 과학-한헌수 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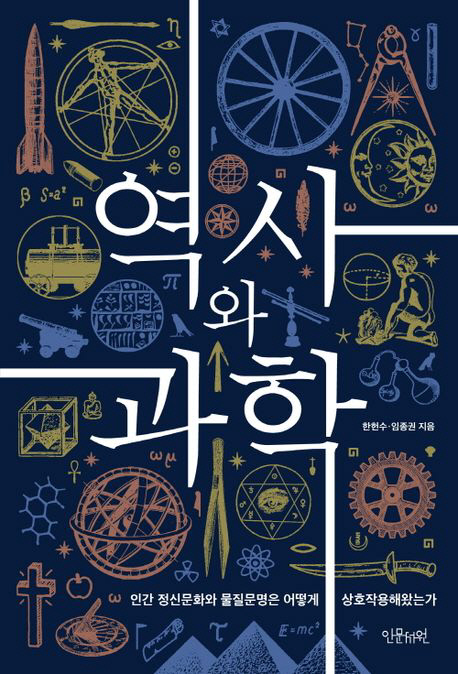 |
옛사람들이 부딪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주와 자연의 법칙이었다. 폭설과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뿐 아니라 해와 달과 같은 천문, 기상과 같은 날씨는 고대 사람들에게 주요 관심사였다. 자연스럽게 신화와 종교가 발생했다.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한 신이 등장하는데,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기저에 종교가 자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처럼 고대에는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이원화돼 있지 않았다. 정신과 자연이 본디 하나라는 관념이 지배했다. 다시 말하면 “고대 그리스 지식인들이 자연철학이라고 한 바와 같이 과학과 철학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상호 융합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하게 된 것은 농경생활을 하면서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튀르기예와 시리아 중간지역에서 발견된 많은 동물뼈는 다른 사실을 알려준다. 1만2000년경으로 밝혀진 뼈는 당시 신전에 바쳐진 제물로 그동안 알려졌던 문명 탄생의 원인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었다.
즉 인류가 농경을 하면서 정착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위해 정착하다 보니 농사를 짓게 됐다는 논리다. 거대한 신전을 짓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피라미드를 비롯해 도시 건축물, 모헨조다로의 도시 등에서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정신문화의 기초가 됐다는 주장이다.
인류의 1만 년 역사를 개괄한 책 ‘역사와 과학’은 역사와 과학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융합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한헌수 숭실사이버대 총장과 임종권 한국국제학연구원 원장이 집필했다.
저자들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본디 하나의 학문이었다는 논지 외에도 서양 중심 문명론은 역사적 허구라고도 강조한다. 서양역사가들은 동양 문명을 과소평가하거나 왜곡해왔는데 과학문명이 유럽에서 일어났다는 자부심으로 인류문명사를 유럽에 맞춰 기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이 근대 과학문명을 일으킨 데는 동양의 우수한 문명을 수용한 덕분이라는 게 저자들의 견해다. 15세기까지 중국은 자연과학과 기술면에서 유럽보다 발전한 상태였다. 자석나침반을 비롯해 항해술, 종이, 인쇄술, 도자기, 화학이 그러했는데, 이는 후일 유럽 문명을 일깨운 요인이 됐다.
그런데 왜 동양은 유럽보다 근대화가 늦었을까. 유럽은 토지가 척박해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니면 약탈이나 정복과 같은 전쟁을 통해 끊임없이 바다와 육지로 나아가야 했다. 그에 비해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는 물자를 자급자족했기에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지 않아도 됐다. 역설적으로 종이와 인쇄술은 지배층이 독점했으며, 한자의 어려움은 지식 보급의 장애로 작용했다.
유럽은 르네상스와 맞물려 종교개혁,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술력이 배가됐다. 신의 섭리와 자연의 섭리, 우주 섭리를 이해하는 노력이 기초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명나라는 마음의 수양을 강조한 나머지 주자학을 모토로 쇄국정책을 시행한 탓에 과학기술의 진보를 막았다.
과학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과학혁명을 토대로 한 산업혁명은 인류 문명이 진보할 수 있다는 신념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의 20세기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비롯해 태양전지, 게놈해독, 빅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면서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다. 현대 과학은 문명의 이기가 될 지 흉기가 될지 현재로선 단언할 수 없다.
<인문서원·3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하게 된 것은 농경생활을 하면서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튀르기예와 시리아 중간지역에서 발견된 많은 동물뼈는 다른 사실을 알려준다. 1만2000년경으로 밝혀진 뼈는 당시 신전에 바쳐진 제물로 그동안 알려졌던 문명 탄생의 원인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었다.
인류의 1만 년 역사를 개괄한 책 ‘역사와 과학’은 역사와 과학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융합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한헌수 숭실사이버대 총장과 임종권 한국국제학연구원 원장이 집필했다.
 |
그러나 유럽이 근대 과학문명을 일으킨 데는 동양의 우수한 문명을 수용한 덕분이라는 게 저자들의 견해다. 15세기까지 중국은 자연과학과 기술면에서 유럽보다 발전한 상태였다. 자석나침반을 비롯해 항해술, 종이, 인쇄술, 도자기, 화학이 그러했는데, 이는 후일 유럽 문명을 일깨운 요인이 됐다.
그런데 왜 동양은 유럽보다 근대화가 늦었을까. 유럽은 토지가 척박해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니면 약탈이나 정복과 같은 전쟁을 통해 끊임없이 바다와 육지로 나아가야 했다. 그에 비해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는 물자를 자급자족했기에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지 않아도 됐다. 역설적으로 종이와 인쇄술은 지배층이 독점했으며, 한자의 어려움은 지식 보급의 장애로 작용했다.
유럽은 르네상스와 맞물려 종교개혁,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술력이 배가됐다. 신의 섭리와 자연의 섭리, 우주 섭리를 이해하는 노력이 기초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명나라는 마음의 수양을 강조한 나머지 주자학을 모토로 쇄국정책을 시행한 탓에 과학기술의 진보를 막았다.
과학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과학혁명을 토대로 한 산업혁명은 인류 문명이 진보할 수 있다는 신념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의 20세기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비롯해 태양전지, 게놈해독, 빅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면서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다. 현대 과학은 문명의 이기가 될 지 흉기가 될지 현재로선 단언할 수 없다.
<인문서원·3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