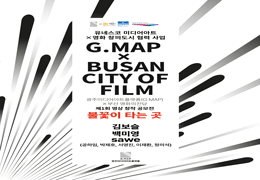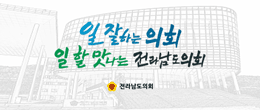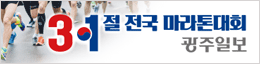코로나19와 ‘재난인문학’
 |
예정되어 있던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졸업이든 입학이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는 가기가 망설여지고, 가족 또는 지인들과 환담을 즐기며 함께하던 식사까지도 어쩐지 두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안겨준 재난 상황의 일상이다. 모든 평범한 일상이 파괴되고 그 자리를 온통 두려움과 걱정이 차지하게 됐다.
재난의 폐해는 단순히 일상의 파괴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와 국가 전체가 입은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영세 상인부터 생산 시설을 멈추는 기업,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에 이르기까지 재난으로 인한 충격과 피해에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 인류의 역사는 곧 재난의 역사라는 말이 있는 이유다. 재난은 바로 인간의 문제이자 삶의 문제,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설정한 ‘동아시아 재난의 기억, 서사, 치유-재난인문학의 정립’이 중요한 인문학 연구 아젠다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다.
재난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일은 무엇일까? ‘재난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학문을 세상에 내놓기 위한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재난에 대한 접근이 인문학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과연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일이다. 만일 인문학이 전통적으로 그 중심을 ‘인간’에 두고 있으며, ‘인간적인 것’ 또는 ‘사람다움’에 대한 성찰과 사유를 핵심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본다면, ‘재난인문학’ 역시 재난을 경험한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인간적 가치 또는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묻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난인문학이 대상으로 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우선 재난인문학은 재난에 대한 인간의 기억과 기록 및 인식의 변화 등을 하나의 영역으로 삼을 수 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 또는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닥치고 말 미래의 시간을 축으로 재난을 온몸으로 경험한 인간과 공동체가 기억 또는 기록하고 있는 재난의 역사와 함께, 재난 및 그 원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내는 작업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정한 시공간에서 일어난 재난의 모습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차원에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작업도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재난 관련 자료를 활용한 대규모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토대로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재난인문학에서 다루어야 할 또 다른 영역은 ‘재난의 서사’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난의 서사’란 인간이 재난의 역사 또는 재난에 대한 기억과 인식을 어떻게 재현해 내고 형상화하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새삼 강조하여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경험한 실로 다양한 재난들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다양한 장르의 문학 텍스트를 비롯한 예술 작품에 그려내었다. 따라서 재난인문학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다양한 장르의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을 통하여 재난을 재현하고 형상화해 내고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과 함께 그러한 작품들에서 그려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 혹은 인간성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재난인문학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층위는 바로 ‘재난의 치유’이다. 당연히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재난을 수습하고 재건하는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재난의 수습과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배려와 돌봄, 정신적 패닉 상태에 대한 진심 어린 소통이다. 따라서 재난인문학은 재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공동체가 재난으로부터 받은 충격과 심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인문학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인문학 자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인간의 삶을, 그것도 그냥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재난인문학은 재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바라보고 그 흔적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는지 방법론을 찾으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인문학은 재난에 대한 기억을 안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의 가능성 속에서 이를 연대의 단서로 삼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 한다. 이러한 인문학이야말로 위기의 인문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설정한 ‘동아시아 재난의 기억, 서사, 치유-재난인문학의 정립’이 중요한 인문학 연구 아젠다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다.
그렇다면 재난인문학이 대상으로 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우선 재난인문학은 재난에 대한 인간의 기억과 기록 및 인식의 변화 등을 하나의 영역으로 삼을 수 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 또는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닥치고 말 미래의 시간을 축으로 재난을 온몸으로 경험한 인간과 공동체가 기억 또는 기록하고 있는 재난의 역사와 함께, 재난 및 그 원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내는 작업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정한 시공간에서 일어난 재난의 모습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차원에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작업도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재난 관련 자료를 활용한 대규모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토대로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재난인문학에서 다루어야 할 또 다른 영역은 ‘재난의 서사’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난의 서사’란 인간이 재난의 역사 또는 재난에 대한 기억과 인식을 어떻게 재현해 내고 형상화하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새삼 강조하여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경험한 실로 다양한 재난들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다양한 장르의 문학 텍스트를 비롯한 예술 작품에 그려내었다. 따라서 재난인문학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다양한 장르의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을 통하여 재난을 재현하고 형상화해 내고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과 함께 그러한 작품들에서 그려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 혹은 인간성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재난인문학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층위는 바로 ‘재난의 치유’이다. 당연히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재난을 수습하고 재건하는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재난의 수습과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배려와 돌봄, 정신적 패닉 상태에 대한 진심 어린 소통이다. 따라서 재난인문학은 재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공동체가 재난으로부터 받은 충격과 심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인문학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인문학 자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인간의 삶을, 그것도 그냥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재난인문학은 재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바라보고 그 흔적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는지 방법론을 찾으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인문학은 재난에 대한 기억을 안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의 가능성 속에서 이를 연대의 단서로 삼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 한다. 이러한 인문학이야말로 위기의 인문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