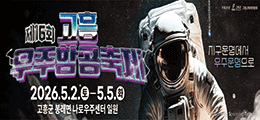[정세완 원불교 농성교당 교무] 자주, 자활 그리고 자립
 |
오랜만에 무등산 등산을 했습니다. 산행을 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육신은 힘들지만 마음속의 모든 잡념들이 사라집니다. 평소에 많은 생각으로 복잡했던 일들이 정리가 됩니다. 머릿속이 정리되면 행동의 방향들이 가닥이 잡힙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하면 산행을 합니다.
원효사에서 출발해 중봉에 도착하면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입석대 반대편인 중봉에서 서석대 방향으로 마지막 험로의 코스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 내 몸이지만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다리가 풀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이 듭니다. 조금 오르다가 쉬기를 반복합니다.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 생각과 육신이 따로 행동합니다.
오늘 산행은 정신도 힘이 있어야 하지만 육신도 힘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산행입니다.
원불교 3대 종법사인 대산 종사는 공부인들은 3가지 힘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사용합니다. 날마다 사용하는 마음은 대부분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닌 화나고 괴롭고 또한 즐거운 외부의 상태에 의해 지배받습니다. 화가 날 때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즐거울 때는 유쾌한 마음으로 생활하지만 원망하는 마음과 유쾌한 마음이 나의 참 마음이 아닌 밖의 경계들에 의하여 지배받는 마음들입니다.
아랫마을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연히 처녀의 부모는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다그칩니다. 처녀는 덕망 있는 윗동네 절의 스님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의 부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스님을 찾아가서 당신 자식이니 잘 키우라고 아이를 절에다 두고 내려갑니다. 스님은 허허 하고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서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진짜 아이 아빠를 찾았으니 아이를 데리고 간다며 아이와 함께 절을 내려갑니다. 스님은 허허하고 웃기만 합니다.
정신의 자주력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나의 마음입니다. 참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참마음은 물들고, 묶이지 않는 텅 빈 마음입니다. 텅 비었으므로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허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이 되고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대기로 개를 때리면 개는 막대기를 물지만 사자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음의 자주력이 있는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하여 참 달을 바라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자활이 확보되지 않으면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원하는 일들을 일부는 포기해야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립이 되지 않으면 힘 있는 요인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종속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힘이 없으면 타인이나 힘 있는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자신의 인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늘은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들의 인권을 찾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으면서 바라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여전히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형국입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개인과 국가 관계에서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자주, 자활, 자립의 말들이 생각나는 삼월의 아침입니다.
원효사에서 출발해 중봉에 도착하면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입석대 반대편인 중봉에서 서석대 방향으로 마지막 험로의 코스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 내 몸이지만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다리가 풀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이 듭니다. 조금 오르다가 쉬기를 반복합니다.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 생각과 육신이 따로 행동합니다.
원불교 3대 종법사인 대산 종사는 공부인들은 3가지 힘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입니다.
아랫마을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연히 처녀의 부모는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다그칩니다. 처녀는 덕망 있는 윗동네 절의 스님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의 부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스님을 찾아가서 당신 자식이니 잘 키우라고 아이를 절에다 두고 내려갑니다. 스님은 허허 하고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서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진짜 아이 아빠를 찾았으니 아이를 데리고 간다며 아이와 함께 절을 내려갑니다. 스님은 허허하고 웃기만 합니다.
정신의 자주력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나의 마음입니다. 참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참마음은 물들고, 묶이지 않는 텅 빈 마음입니다. 텅 비었으므로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허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이 되고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대기로 개를 때리면 개는 막대기를 물지만 사자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음의 자주력이 있는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하여 참 달을 바라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자활이 확보되지 않으면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원하는 일들을 일부는 포기해야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립이 되지 않으면 힘 있는 요인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종속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힘이 없으면 타인이나 힘 있는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자신의 인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늘은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들의 인권을 찾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으면서 바라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여전히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형국입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개인과 국가 관계에서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자주, 자활, 자립의 말들이 생각나는 삼월의 아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