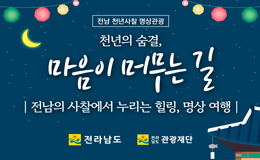하청노동자 위협하는 중대산업재해 개선 절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3명 중 2명꼴로 하청노동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가 2년간의 소송끝에 원·하청 실명이 포함된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결과인데 최초 공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전남에선 62명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했는데 62.9%인 39명이 하청노동자였다. 2022년 3월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사망자 가운데 3명이 하청노동자였는데 나중에 기소된 9명 중 원청인 여천NCC 대표는 빠지고 하청업체 대표 등만 형사책임을 졌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고가 나면 현장에 투입된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형사책임도 하청업체 대표가 지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도 도입의 의미가 없다.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서 사고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원청 책임과 도급 구조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시민단체가 2년간의 소송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 자료를 받을 정도라는 것을 보면 정부의 의지도 의심스럽다. 제도 개선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내용과 유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당시 사망자 가운데 3명이 하청노동자였는데 나중에 기소된 9명 중 원청인 여천NCC 대표는 빠지고 하청업체 대표 등만 형사책임을 졌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고가 나면 현장에 투입된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형사책임도 하청업체 대표가 지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도 도입의 의미가 없다.
시민단체가 2년간의 소송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 자료를 받을 정도라는 것을 보면 정부의 의지도 의심스럽다. 제도 개선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내용과 유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