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의 향기] 무각사와 두 여인 -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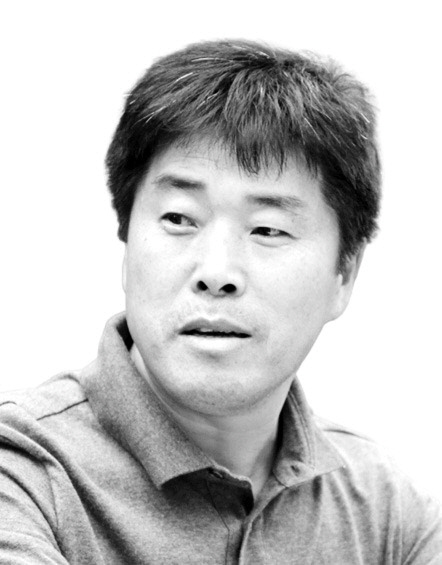 |
1970년 초, 광주 사람들조차 모르는 무각사를 김호남이 찾아든다. 박정희의 첫째 부인이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낯선 광주까지 온 걸까.
지금과 달리 무각사(無覺寺)는 상무대라는 군부대 사찰이다. ‘무’는 무심, 무위, 무아, 무념 등 절대적이자 까마득한 경지를, ‘각’은 궁극의 깨달음인 해탈의 경지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다. 무와 각은 전혀 같지 않은 반의어이면서 같은 의미를 지닌 동의어다. 이 무각사에는 현대사에 잘 알려진 여인과 철저히 감춰진 여인에 얽힌 아픈 이야기가 서려 있다.
불교에서 6 바라밀은 생사고해를 건너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실천 수행 방법이다. 재물이나 불법을 베푸는 보시, 철저히 계율을 지키는 지계, 온갖 번뇌를 참고 언짢은 마음을 견디는 일이 인욕, 그리고 부단한 정진을 통해 선정과 반야에 들 수 있다.
김호남은 해인사와 연호사, 부산 등지의 경상도 여러 사찰을 떠돈다. 남편이었던 박정희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집권했으니, 그가 누린 영광의 이면에 첫째 부인이었던 김호남에 대한 감시는 여간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도 한때 왕의 여자가 아닌가.
그런데 그때마다 육영수가 찾아와 도움을 준다. 그것도 몇 년, 오랫동안 청와대 감시는 물론, 육영수의 도움은 그녀로서 그리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훌훌 벗어나고 싶었을 게다. 한 명은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감시했고, 또 한 명은 지긋지긋하게 찾아왔다. 그 지독한 사람 감옥에서 벗어날 곳은 어디일까. 호남(好南), 이름부터 운명이었는지 모른다.
바로 무각사다. 무각사는 1971년 구산(九山) 스님이 막 창건한 사찰이다. 민간인과 단절된 사찰은 김호남에게 자신을 감추며 ‘인욕’ 하기에 안성맞춤이었을 것 같다. 게다가 대구에서 멀고도 낯선 곳이다. 호남은 아니 무각사는 김호남이 택할 수 있는 최고 선택지였는지 모른다.
그런데 김호남의 뜻은 여기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영수의 발길은 질기게 이곳까지 이어진다. 부처님 손바닥 안, 사찰조차 사찰한 절대권력을 피할 수 없었다. 덕분에 무각사는 짧은 시간에 번창했다. 왜 육영수는 그렇게 그녀를 따라다니며 도왔을까. 혹시 자신에게 곧 닥칠 미래를 예측했던 걸까. 아니면 자신도 견딜 ‘인욕’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얼마 후 1974년 육영수는 8·15 광복절 기념식 날 급사한다. 5년 후, 1979년 10월 26일에는 박정희도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부하의 총탄에 비명횡사한다. 둘 다 예상치 못한 최후다.
어쩌면 그녀는 이 무각사에서 그녀의 최후를 알았을 것 같다. 그리고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온 시민군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때 그녀 심정은 어땠을까. 상무대는 1994년 장성 삼서면 일대로 옮긴다. 무각사는 군대라는 심산유곡에서 벗어나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1991년, 독재의 막이 내릴 즈음, 그녀 역시 시난고난한 칠십 여 생을 마감한다.
그녀의 생은 ‘인욕’의 삶이었다. 환영받지 못한 결혼과 출산, 초지일관 남편의 외면, 더는 견딜 수 없던 그녀는 더 맹렬히 인욕 하고자 부처님 품에 귀의했다. 열여섯에 결혼하여 딸 하나 낳고 죽을 때까지 반백 년이 훌쩍 넘는 인욕의 기간, 특히 그가 집권한 장장 17년 동안 그녀는 시시각각 촌각을 다투며 법당에서 간절하게 선정과 지혜를 염원했을 것 같다. 그 선정과 반야가 바로 ‘깨달음 외에 아무것도 없는’ ‘무각’ 아니던가.
박정희는 1963년 5대 대선에서 호남에서 35만 표 차의 몰표를 얻어서 15만 표 차로 당선되었다. 그렇지만 집권 이후 아내를 끝까지 외면했고, 철저히 호남을 배제했다. 시종일관 김호남을 미워했던 것처럼 호남을 배척한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정권을 유지한 것이다.
그런 그의 공식적인 부인 둘이 만난 지점이 바로 광주 무각사다. 한 치 앞 삶도 보지 못한 게 인간이라더니, 그가 외면한 아니 배신한 광주 한복판에서 그의 전처와 후처가 서로 연민을 주고받으며 화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부하에게 버림받은 대통령, 그리고 광적인 욕망에 쌓인 지아비와 얽힌 두 여인이 생의 실타래를 풀려고 했던, 생의 많은 교훈을 주는 무각사. 오늘은 이곳에서 미워한 죄, 그 삶의 ‘무각’을 깨워본다.
지금과 달리 무각사(無覺寺)는 상무대라는 군부대 사찰이다. ‘무’는 무심, 무위, 무아, 무념 등 절대적이자 까마득한 경지를, ‘각’은 궁극의 깨달음인 해탈의 경지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다. 무와 각은 전혀 같지 않은 반의어이면서 같은 의미를 지닌 동의어다. 이 무각사에는 현대사에 잘 알려진 여인과 철저히 감춰진 여인에 얽힌 아픈 이야기가 서려 있다.
김호남은 해인사와 연호사, 부산 등지의 경상도 여러 사찰을 떠돈다. 남편이었던 박정희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집권했으니, 그가 누린 영광의 이면에 첫째 부인이었던 김호남에 대한 감시는 여간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도 한때 왕의 여자가 아닌가.
바로 무각사다. 무각사는 1971년 구산(九山) 스님이 막 창건한 사찰이다. 민간인과 단절된 사찰은 김호남에게 자신을 감추며 ‘인욕’ 하기에 안성맞춤이었을 것 같다. 게다가 대구에서 멀고도 낯선 곳이다. 호남은 아니 무각사는 김호남이 택할 수 있는 최고 선택지였는지 모른다.
그런데 김호남의 뜻은 여기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영수의 발길은 질기게 이곳까지 이어진다. 부처님 손바닥 안, 사찰조차 사찰한 절대권력을 피할 수 없었다. 덕분에 무각사는 짧은 시간에 번창했다. 왜 육영수는 그렇게 그녀를 따라다니며 도왔을까. 혹시 자신에게 곧 닥칠 미래를 예측했던 걸까. 아니면 자신도 견딜 ‘인욕’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얼마 후 1974년 육영수는 8·15 광복절 기념식 날 급사한다. 5년 후, 1979년 10월 26일에는 박정희도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부하의 총탄에 비명횡사한다. 둘 다 예상치 못한 최후다.
어쩌면 그녀는 이 무각사에서 그녀의 최후를 알았을 것 같다. 그리고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온 시민군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때 그녀 심정은 어땠을까. 상무대는 1994년 장성 삼서면 일대로 옮긴다. 무각사는 군대라는 심산유곡에서 벗어나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1991년, 독재의 막이 내릴 즈음, 그녀 역시 시난고난한 칠십 여 생을 마감한다.
그녀의 생은 ‘인욕’의 삶이었다. 환영받지 못한 결혼과 출산, 초지일관 남편의 외면, 더는 견딜 수 없던 그녀는 더 맹렬히 인욕 하고자 부처님 품에 귀의했다. 열여섯에 결혼하여 딸 하나 낳고 죽을 때까지 반백 년이 훌쩍 넘는 인욕의 기간, 특히 그가 집권한 장장 17년 동안 그녀는 시시각각 촌각을 다투며 법당에서 간절하게 선정과 지혜를 염원했을 것 같다. 그 선정과 반야가 바로 ‘깨달음 외에 아무것도 없는’ ‘무각’ 아니던가.
박정희는 1963년 5대 대선에서 호남에서 35만 표 차의 몰표를 얻어서 15만 표 차로 당선되었다. 그렇지만 집권 이후 아내를 끝까지 외면했고, 철저히 호남을 배제했다. 시종일관 김호남을 미워했던 것처럼 호남을 배척한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정권을 유지한 것이다.
그런 그의 공식적인 부인 둘이 만난 지점이 바로 광주 무각사다. 한 치 앞 삶도 보지 못한 게 인간이라더니, 그가 외면한 아니 배신한 광주 한복판에서 그의 전처와 후처가 서로 연민을 주고받으며 화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부하에게 버림받은 대통령, 그리고 광적인 욕망에 쌓인 지아비와 얽힌 두 여인이 생의 실타래를 풀려고 했던, 생의 많은 교훈을 주는 무각사. 오늘은 이곳에서 미워한 죄, 그 삶의 ‘무각’을 깨워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