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섬 살리기’ 정부 의지에 달렸다 - 김지을 사회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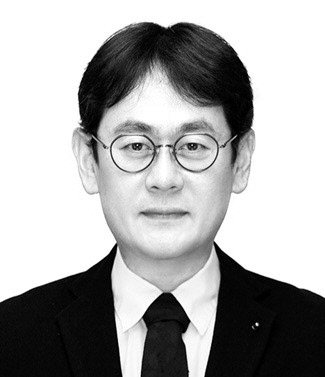 |
#. 흑산의 파시는 조기 어황따라 시작된다. 3월이면 조용했던 예리항에 고깃배가 몰리기 시작하고 선창가에 늘어선 60여개의 선술집이 하나둘 동면에서 깨어난다.….예리항 부두에 몰리는 어선은 많을 때는 2000척에 달한다. 방파제 안으로 빽빽히 들어서면 안에 닿은 배는 빠져나갈 수 없는 사태가 나고 상주인구 2000여명의 예리항 유동인구는 1만명을 넘게 된다. 밤이면 1000척의 배가 불을 밝히고 서 있어 해상에 큰 도시가 생긴듯한 감을 갖게 한다.
바다도, 섬도 이상하다
‘섬·섬사람’(김정호·1991년)이라는 책을 다시 찾아 읽었다. 향토사학자 김정호가 1971년 전남 250여개의 섬을 답사한 기록이다.
‘아침은 보리죽, 점심은 고구마, 저녁은 파래죽’, ‘약방도 병원도 없고 병이 나면 저절로 낫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척박한 섬과 섬 주민 실태를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150여척의 배를 갈아타며 계속해 돌아다니며 접한 기록이다.
50년 전 책인데 그다지 달라진 게 없는 내용도 있다.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고 도선마저 없는 섬이 전남에만 118개나 된다’는 내용은 50년 간 숫자만 바뀐 듯했다.
여전히 전국 480개의 유인도 중 74개 섬은 아예 여객선 항로에서 제외됐고 절반이 넘는 41개 섬이 전남 지역이다.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은 섬은 70여개가 넘는다’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남 24곳 섬 주민들은 연륙교(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놓였음에도 우편물(온라인쇼핑몰)을 주문할 때 ‘섬 추가 배송비’를 내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수준으로 조금 변한 게 전부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에서 나온 내용이다.
바다는 이상하게 바뀌었다. ‘초봄과 늦가을에 갈치가 많이 잡히고 정월부터 5월 중순까지 조기가 많이 잡혔으며 5월 이후 6~7개월 간 계속 전갱이가 잡혔다’는 흑산 바다의 어장 지도는 50년 전 옛 이야기다.
서해 바다 표층 온도도 25년 전인 2000년 15.43도였지만 2021년엔 16.12도, 지난해에는 17.12도까지 올랐다.
바다 온도가 오르면서 고기들은 다른 바다로 떠났다. 조기 파시는 커녕 특산물인 홍어조차 잡히지 않다보니 평생 터전으로 삼았던 섬 주민들이 바다에 남아있을 리 없다. 다른 서남해안 섬도 비슷하다. 18만 5000명이 넘었던 섬 인구(2015년)는 25년 만에 15만 5000명선으로 내려앉았다. 자발적 공도(空島·섬을 비움)가 이뤄지는 셈이다.
섬을 찾는 관광객 발길도 줄어들었다. 5년 전 651만 5000명이던 전남 섬 방문객은 지난해 504만 6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섬 사람들의 삶이 위협받고 섬의 미래가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2026년 9월 5일~11월 4일)는 주목할만하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한 지구촌 최초의 섬 박람회다.
육지와 단절된 섬에 대한 경제·환경·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특유의 전통문화와 생태자원이 보존된 전남지역 보물 섬들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든다는 게 박람회조직위 구상이다.
위기의 섬을 기회의 섬으로
전 세계인들과 기후 위기 최전선에 놓인 섬의 지속가능한 보전·개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박람회 성공은 섬의 미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내외 관람객 300만명 유치 목표를 위한 핵심 시설인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성공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필리핀·일본·베트남·마다가스카르·팔라우·동티모르·세네갈·피지·페루·그리스·프랑스·케냐 등 12개국 13개 도시의 참가가 확정된 상태지만 중점 유치 대상 37개국까지는 아직 미흡하다.
섬박람회 기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섬과 섬을 오가는 킬러콘텐츠로 활용하려던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기술 실증과 비행 시연 등도 운용사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불투명한 상태다.
다도해 풍광과 섬 자원을 활용해 섬을 따라 항해하는 연안 크루즈 운항도 불투명하고 박람회 기간 여객선 운임을 반값으로 내려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계획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입장권 판매 목표액(96억원) 달성도 힘겨울 수밖에 없다.
전남도의회도 이같은 점을 감안, 최근 42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정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냈다. 기후 변화를 마주한 위기의 섬을 살려야한다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로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섬·섬사람’(김정호·1991년)이라는 책을 다시 찾아 읽었다. 향토사학자 김정호가 1971년 전남 250여개의 섬을 답사한 기록이다.
‘아침은 보리죽, 점심은 고구마, 저녁은 파래죽’, ‘약방도 병원도 없고 병이 나면 저절로 낫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척박한 섬과 섬 주민 실태를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150여척의 배를 갈아타며 계속해 돌아다니며 접한 기록이다.
50년 전 책인데 그다지 달라진 게 없는 내용도 있다.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고 도선마저 없는 섬이 전남에만 118개나 된다’는 내용은 50년 간 숫자만 바뀐 듯했다.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은 섬은 70여개가 넘는다’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남 24곳 섬 주민들은 연륙교(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놓였음에도 우편물(온라인쇼핑몰)을 주문할 때 ‘섬 추가 배송비’를 내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수준으로 조금 변한 게 전부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에서 나온 내용이다.
바다는 이상하게 바뀌었다. ‘초봄과 늦가을에 갈치가 많이 잡히고 정월부터 5월 중순까지 조기가 많이 잡혔으며 5월 이후 6~7개월 간 계속 전갱이가 잡혔다’는 흑산 바다의 어장 지도는 50년 전 옛 이야기다.
서해 바다 표층 온도도 25년 전인 2000년 15.43도였지만 2021년엔 16.12도, 지난해에는 17.12도까지 올랐다.
바다 온도가 오르면서 고기들은 다른 바다로 떠났다. 조기 파시는 커녕 특산물인 홍어조차 잡히지 않다보니 평생 터전으로 삼았던 섬 주민들이 바다에 남아있을 리 없다. 다른 서남해안 섬도 비슷하다. 18만 5000명이 넘었던 섬 인구(2015년)는 25년 만에 15만 5000명선으로 내려앉았다. 자발적 공도(空島·섬을 비움)가 이뤄지는 셈이다.
섬을 찾는 관광객 발길도 줄어들었다. 5년 전 651만 5000명이던 전남 섬 방문객은 지난해 504만 6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섬 사람들의 삶이 위협받고 섬의 미래가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2026년 9월 5일~11월 4일)는 주목할만하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한 지구촌 최초의 섬 박람회다.
육지와 단절된 섬에 대한 경제·환경·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특유의 전통문화와 생태자원이 보존된 전남지역 보물 섬들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든다는 게 박람회조직위 구상이다.
위기의 섬을 기회의 섬으로
전 세계인들과 기후 위기 최전선에 놓인 섬의 지속가능한 보전·개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박람회 성공은 섬의 미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내외 관람객 300만명 유치 목표를 위한 핵심 시설인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성공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필리핀·일본·베트남·마다가스카르·팔라우·동티모르·세네갈·피지·페루·그리스·프랑스·케냐 등 12개국 13개 도시의 참가가 확정된 상태지만 중점 유치 대상 37개국까지는 아직 미흡하다.
섬박람회 기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섬과 섬을 오가는 킬러콘텐츠로 활용하려던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기술 실증과 비행 시연 등도 운용사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불투명한 상태다.
다도해 풍광과 섬 자원을 활용해 섬을 따라 항해하는 연안 크루즈 운항도 불투명하고 박람회 기간 여객선 운임을 반값으로 내려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계획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입장권 판매 목표액(96억원) 달성도 힘겨울 수밖에 없다.
전남도의회도 이같은 점을 감안, 최근 42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정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냈다. 기후 변화를 마주한 위기의 섬을 살려야한다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로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