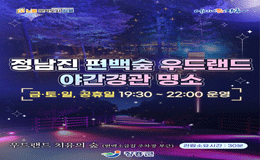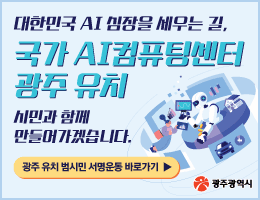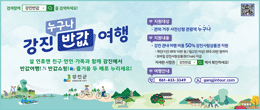[전영애의 ‘여백서원에서’] 내가 짓는 세계 -괴테의 프로메테우스에 대하여
 |
많기도 많은 그리스 신화의 인물들 중에서 눈길 끄는 인물 하나가 프로메테우스이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다고 설정된 인물-프로메테우스. 불멸인 신들의 전유물이던 불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다니. 살아있는 동안 내내,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다가 조만간 죽고마는 인간 군상을 떠올려보라. 그 이름처럼 “앞서 생각하며”, 한 세계의 룰을 과감히 깨고 나서서 또 하나의 세계를 밝혀 열어주는 한 인물 덕분에 인간의 문명 세계가 비롯되었다는 생각은, 문명의 어느 단계에서 돌아보든, 참으로 매력적인 우화일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그 많은 신화의 인물들 중 프로메테우스가 괴테의 관심도 유별나게 끌었던 것 같다. 괴테는 한 평생을 두고 네 차례나 작품화를 시도했다.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괴테가 프로메테우스라는 캐릭터에서 눈 여겨 본 것은-그저 불을 가져다 주는 시혜자가 아니라-무엇보다 기존의 질서를 깨는 반항아, 그리고 그저 저항에 그치지 않고 대안으로, 진흙에서 인간을 빚어 또 하나의 세계의 창조주가 되는 프로메테우스이다. 창조적 인간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다.
첫 시도이자 대표적인 작품은, 괴테 자신뿐만 아니라 독일 문학의 질풍노도기 대표 시라 부를 수 있는 청년기 시 ‘프로메테우스’(1770-1774경 집필, 1789년 출판)이고, 다음 작품화 시도는 이 시에 담긴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미완성 드라마, 단편(斷片) ‘프로메테우스’(1773년 집필, 1774년 초연)이다.
역시 미완성 드라마인 ‘판도라’(1807-1808년경 집필, 1810년 출판)에서도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아우에피메테우스와 더불어 중심인물이다. 네 번째 시도, 오랫동안 집필 계획에 들어 있었던 드라마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는 끝내 쓰이지 못했다.
완성된 첫 시 ‘프로메테우스’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남고 그 핵심이, 실패하거나 미완성인 작품들에도 녹아 있다. “너의 하늘은 덮으라, 제우스여/ 구름안개로!/ 그리고 엉겅퀴/ 목을 똑똑 따는 소년처럼/ 참나무와 산 언덕과 겨루어 보라!/ 하지만 내 땅은/ 그대로 두라/ 네가 지어주지 않은/ 내 오두막도 그대로 두라.”라는 당당한 청산으로 시작되어긴 시는 선언으로 끝난다. “나 여기 앉아/ 내 모습에 따라 인간을 빚노니/ 이 족속 나를 닮아/ 괴로워하고 울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너를 아랑곳하지 않으리/ 나처럼.”
일반화된 신과 인간의 결정적 차이는 ‘운명’이다. 즉 인간은 시간에 매여 유한하고 필멸인 존재이고, 신은 운명을 벗어난, 즉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는 것이 모든 신화의 근본 구도이다. 넘지 못할 선이 ‘시간’으로 확실하게 그어져 있다. 그 분수를 잊고 인간이 신과 동급인양 오만(휘브리스)을 저지를 때 온갖 징벌과 불행이 초래된다는 것이 신화의 핵심 도덕율이다.
그런데 청년 괴테에게서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질서에 속하면서 경계를 넘는다. 신들도 ‘운명’이 있다고, 즉 시간에 종속된다고 단언하는가하면, 나아가, 자기도 인간을 만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반항에 그치지 않고 창조자가 되는데, 이 점에 괴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2막인 미완성 드라마 ‘프로메테우스’의 첫 막은 시 ‘프로메테우스’를 산문 대사로 펼쳐 놓은 듯, 창조적인 반항아 프로메테우스를 그리고, 둘째 막은그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아버지처럼 나타나는 너그러운 창조주의 모습을 담는다. 프로메테우스에 의해 창조된 첫 인간들 가운데서 소유와 폭력이 생겨나며, 그들이 차츰 희로애락을 알아가는 과정도 그려진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 투성이인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빚어본다는 건 얼마나 마음을 끄는 일인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물며 그것이 생명일 때, 더구나 사람일 때, 한 세계일 때…. 그래서 생각하게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보잘 것 없지만, 하나의 작은 세계를 짓는 일이면 좋겠다고.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역시 미완성 드라마인 ‘판도라’(1807-1808년경 집필, 1810년 출판)에서도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아우에피메테우스와 더불어 중심인물이다. 네 번째 시도, 오랫동안 집필 계획에 들어 있었던 드라마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는 끝내 쓰이지 못했다.
완성된 첫 시 ‘프로메테우스’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남고 그 핵심이, 실패하거나 미완성인 작품들에도 녹아 있다. “너의 하늘은 덮으라, 제우스여/ 구름안개로!/ 그리고 엉겅퀴/ 목을 똑똑 따는 소년처럼/ 참나무와 산 언덕과 겨루어 보라!/ 하지만 내 땅은/ 그대로 두라/ 네가 지어주지 않은/ 내 오두막도 그대로 두라.”라는 당당한 청산으로 시작되어긴 시는 선언으로 끝난다. “나 여기 앉아/ 내 모습에 따라 인간을 빚노니/ 이 족속 나를 닮아/ 괴로워하고 울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너를 아랑곳하지 않으리/ 나처럼.”
일반화된 신과 인간의 결정적 차이는 ‘운명’이다. 즉 인간은 시간에 매여 유한하고 필멸인 존재이고, 신은 운명을 벗어난, 즉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는 것이 모든 신화의 근본 구도이다. 넘지 못할 선이 ‘시간’으로 확실하게 그어져 있다. 그 분수를 잊고 인간이 신과 동급인양 오만(휘브리스)을 저지를 때 온갖 징벌과 불행이 초래된다는 것이 신화의 핵심 도덕율이다.
그런데 청년 괴테에게서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질서에 속하면서 경계를 넘는다. 신들도 ‘운명’이 있다고, 즉 시간에 종속된다고 단언하는가하면, 나아가, 자기도 인간을 만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반항에 그치지 않고 창조자가 되는데, 이 점에 괴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2막인 미완성 드라마 ‘프로메테우스’의 첫 막은 시 ‘프로메테우스’를 산문 대사로 펼쳐 놓은 듯, 창조적인 반항아 프로메테우스를 그리고, 둘째 막은그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아버지처럼 나타나는 너그러운 창조주의 모습을 담는다. 프로메테우스에 의해 창조된 첫 인간들 가운데서 소유와 폭력이 생겨나며, 그들이 차츰 희로애락을 알아가는 과정도 그려진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 투성이인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빚어본다는 건 얼마나 마음을 끄는 일인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물며 그것이 생명일 때, 더구나 사람일 때, 한 세계일 때…. 그래서 생각하게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보잘 것 없지만, 하나의 작은 세계를 짓는 일이면 좋겠다고.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