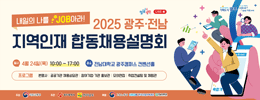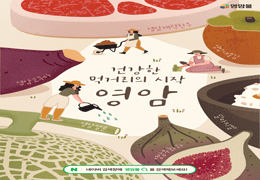논물에 서서 기록한 ‘쌀밥의 서사’
꽃이 밥이 되다-김혜형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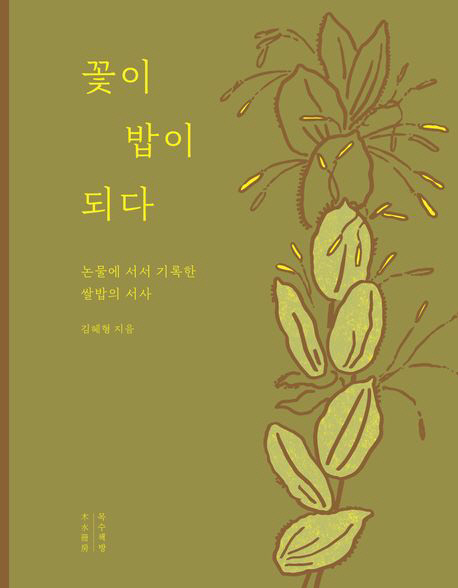 |
서울에서 중견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던 그는 ‘삶을 재배치하고 싶다’는 마음에 “도시에서 몸을 쑥 뽑아내 곧장 시골 흙에 옮겨 심고” 농사꾼이 됐다. 남편, 아이와 함께 전셋집을 얻어 정착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은 그는 “내가 감각한 세계로 지은 알곡을 찧어 첫 햅쌀로 밥을 해 먹은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결실이 있기까지는 고단한 일상과 힘든 노동이 있었을 테지만, 무엇보다“발가락 사이로 밀려 올라오는 고운 진흙의 촉감, 벼와 피를 구분하는 미세한 감각, 구수한 나락 냄새”까지 그가 ‘오감’을 활짝 열고 받아들였던 세계도 있었다.
‘노동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김혜형의 새 책 ‘꽃이 밥이 되다-논물에 서서 기록한 쌀밥의 서사’는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쌀밥의 이야기이자 논물에 발을 담그고 사는 농부의 분투기’다.
‘흙일’을 하며 산 지 20여년이 된 저자는 벼가 쌀밥이 되는 과정과 농부로서의 삶, 정을 나누는 이웃 사람들과 논에 함께 사는 생물 이야기까지 담아 아름다운 ‘농사일기’를 펴냈다. 빈 논에 퇴비를 넣어 써레질을 하는 일로 시작해 ‘노란색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따뜻하고 꽉 찬 황금빛’ 나락을 추수하고, 밥 한그릇을 지어내는 과정을 유려한 문체로 풀어낸 책은 농사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에게도 흥미롭게 읽힌다.
강화도에서 10여년을 산 그는 귀농 선배의 소개로 1800평의 땅을 사 곡성으로 내려온 후 야산을 깎아 만든 척박한 돌밭에서 농사를 시작한다. 농사는 생활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었기에, 농약과 제초제는 쓰지 않기로 마음 먹었고 그 원칙을 지키며 농사를 이어간다. 또 토양의 생태환경을 지키고 탄소 배출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무경운 배농사’도 실천한다.
농사는 “오직 보살피고, 아끼고, 북돋는 과정”이고 “볍씨가 이룰 가을의 성과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쌀밥의 무게로 온다”고 말하는 대목은 왠지 농부로서의 신성함을 느끼게 해준다.
저자는 수매 가격 등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도 잃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농부는 “소득이 노동력 투여량에 비례하지 않고, 자연재해의 불확실성과 맹목의 정치에 영향을 받으며, 최선의 노력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지 미지수인 직업”이다.
책 속에는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저자는 웬만한 어른보다 농사일을 잘하는 고1, 고3 심 이장네 두 아들과 아흔 둘인 어르신이 함께 손을 보태는 모습에서 뭉클함을 느낀다. 더불어 “기대지 않고 빚지지 않으며 힘닿는 대로 돕고자 하는” 어르신을 보며 “주어진 삶의 최대치를 소진하고 떠나는 삶”을 생각한다.
‘강하게 살고 싶어’ 스스로 ‘강은주’라는 이름을 지은 베트남 여인 은주씨, 선뜻 자기 못자리를 내준 옆 마을 이장 등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도 마음이 간다.
논에서 일하며 거머리와 피를 나누는 저자의 시선은 논둑에 알을 낳은 청둥오리, 모내기 직후 풀어넣은 어린 왕우렁이, 풍년을 예감케해준다는 설이 있어 이름이 붙은 풍년새우 등 함께 살아가는 생물들에게로도 향한다. 강인한 생명력을 보였던 한 마리의 긴꼬리투구새우가 ‘한 생애를 의탁했던’ 논이 자신의 논이었다는 데에서 약 안치고 농사짓는 보람도 느낀다.
책을 읽다 보면 프롤로그의 제목 ‘밥 한 술이 꽃 한다발’이나 ‘아기 볍씨가 눈 뜨는 날’, ‘한 알의 쌀이 잉태되는 순간’ 등 마치 싯구 같은 대목과 깊은 성찰이 돋보이는 글이 많아 밑줄을 긋고 싶어진다.
“도시에서 살 때는 책상머리 인생이었는데 여기서는 손발 노동이 삶을 떠받친다. 힘들기는 하지만 괴롭지는 않다고,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라면 꽤 괜찮은 인생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며 부럽기도 했다. <목수책방·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노동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김혜형의 새 책 ‘꽃이 밥이 되다-논물에 서서 기록한 쌀밥의 서사’는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쌀밥의 이야기이자 논물에 발을 담그고 사는 농부의 분투기’다.
‘흙일’을 하며 산 지 20여년이 된 저자는 벼가 쌀밥이 되는 과정과 농부로서의 삶, 정을 나누는 이웃 사람들과 논에 함께 사는 생물 이야기까지 담아 아름다운 ‘농사일기’를 펴냈다. 빈 논에 퇴비를 넣어 써레질을 하는 일로 시작해 ‘노란색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따뜻하고 꽉 찬 황금빛’ 나락을 추수하고, 밥 한그릇을 지어내는 과정을 유려한 문체로 풀어낸 책은 농사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에게도 흥미롭게 읽힌다.
농사는 “오직 보살피고, 아끼고, 북돋는 과정”이고 “볍씨가 이룰 가을의 성과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쌀밥의 무게로 온다”고 말하는 대목은 왠지 농부로서의 신성함을 느끼게 해준다.
 가을 하늘 아래 익어가는 곡성 논의 벼.
<목수책방 제공> |
책 속에는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저자는 웬만한 어른보다 농사일을 잘하는 고1, 고3 심 이장네 두 아들과 아흔 둘인 어르신이 함께 손을 보태는 모습에서 뭉클함을 느낀다. 더불어 “기대지 않고 빚지지 않으며 힘닿는 대로 돕고자 하는” 어르신을 보며 “주어진 삶의 최대치를 소진하고 떠나는 삶”을 생각한다.
‘강하게 살고 싶어’ 스스로 ‘강은주’라는 이름을 지은 베트남 여인 은주씨, 선뜻 자기 못자리를 내준 옆 마을 이장 등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도 마음이 간다.
논에서 일하며 거머리와 피를 나누는 저자의 시선은 논둑에 알을 낳은 청둥오리, 모내기 직후 풀어넣은 어린 왕우렁이, 풍년을 예감케해준다는 설이 있어 이름이 붙은 풍년새우 등 함께 살아가는 생물들에게로도 향한다. 강인한 생명력을 보였던 한 마리의 긴꼬리투구새우가 ‘한 생애를 의탁했던’ 논이 자신의 논이었다는 데에서 약 안치고 농사짓는 보람도 느낀다.
책을 읽다 보면 프롤로그의 제목 ‘밥 한 술이 꽃 한다발’이나 ‘아기 볍씨가 눈 뜨는 날’, ‘한 알의 쌀이 잉태되는 순간’ 등 마치 싯구 같은 대목과 깊은 성찰이 돋보이는 글이 많아 밑줄을 긋고 싶어진다.
“도시에서 살 때는 책상머리 인생이었는데 여기서는 손발 노동이 삶을 떠받친다. 힘들기는 하지만 괴롭지는 않다고,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라면 꽤 괜찮은 인생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며 부럽기도 했다. <목수책방·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