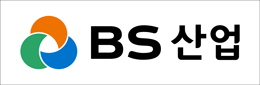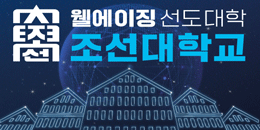[‘5·18 특별 기고’ 히라야마 나루미 서일본신문 기자] 민주주의 지킨 광주는 빛났다
광주시민 트라우마 여전
광주일보 기자들 비상계엄에
문 잠그고 호외 제작 ‘감동’
광주일보 기자들 비상계엄에
문 잠그고 호외 제작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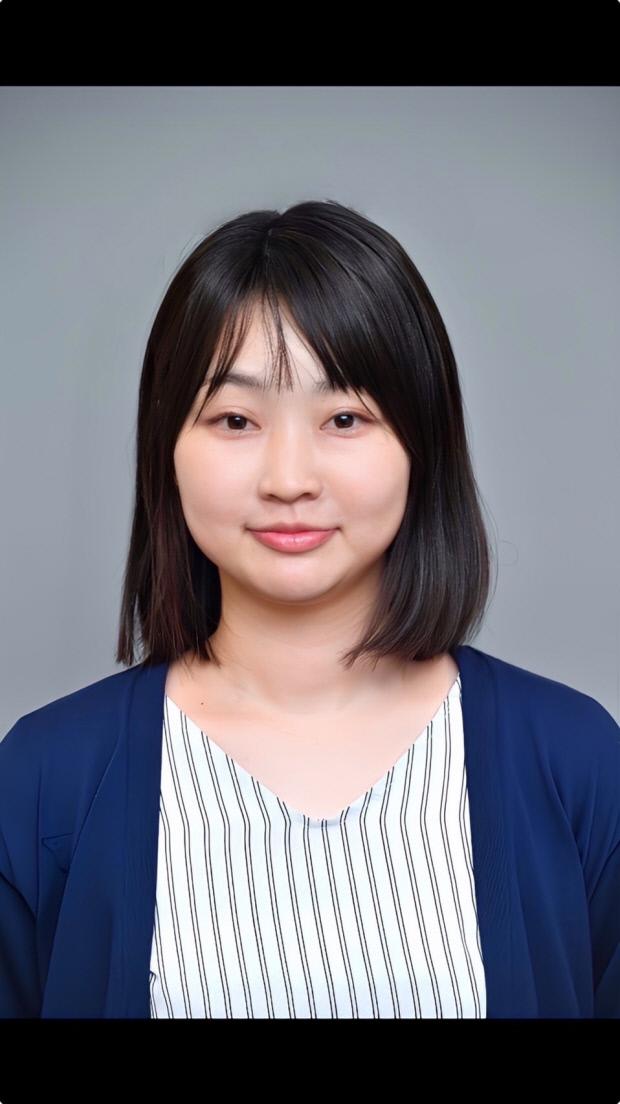 |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날을 되돌아보며 광주 사람들은 “군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당시 나에게는 그 위기감이 실감 나지 않았다. 민주화를 요구하며 군부에 끝까지 맞서 싸웠고 수많은 시민이 총탄에 쓰러졌던 ‘5·18의 공포’와 그것을 보도조차 할 수 없었던 언론인들의 통한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광주에서의 취재를 통해 45년 전의 사건이 남긴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깊은 트라우마임을 깨달았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호외 제작을 결정한 광주의 지역 신문사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광주일보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서일본신문은 지난해 12월 14일 자 기사에 ‘보도해야 할 의무, 각오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이 상황을 전했다.
당시의 취재 노트를 되짚어 따라가 봤다.
군이 오면 더는 기사를 쓸 수 없다/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계엄군의 움직임/회사 근처에 육군 제31사단 사령부/사옥 셔터를 내리고 문에 자물쇠/카카오톡에 ‘신문 제작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군이 오면 동료에게 알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 수시로 큰길에 나가 경계/선배 기자에게서 “광주는 더 이상 희생을 내면 안 된다”는 메시지 등.
그날의 긴박감과 호외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움직였던 기자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취재에 응한 기자들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에 “가짜 뉴스인가?”라며 혼란스러웠다고 털어놨다. 경제 성장을 거치며 민주주의가 성숙된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일이? 그러나 나 역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군이 들이닥칠 것을 상상하며 두려워하기는 어려웠다. 솔직히 말해 너무 과장된 반응이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기자들의 움직임을 들을 때마다 그 공포는 실제였음을 서서히 이해하게 됐다.
5·18 당시 군에 굴복해야 하고 윤전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기자들의 통한은 지금의 보도 현장에도 분명히 전해지고 있었다.
최권일 광주일보 편집국장은 인터뷰에서 당시 선배 기자들이 제출했던 사직서를 보여줬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고 쓰여 있었다.
짧지만 무거운 이 사직서는 그 어떤 설명보다도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그리고 여러 번 읽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영화 ‘택시운전사’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보도가 통제된 가운데 모든 걸 독일 기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광주 기자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이었다.
광주일보(옛 전남일보)의 1980년 6월 2일 자 사고(社告)에는 “알려야 할 의무마저 다하지 못하는 자책과 자성”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신문 발행이 중단된 12일을 지나 다시 신문이 나온 그날의 기사였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기자들을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은 슬프게도 5·18의 깊은 트라우마였다. 그리고 총구를 겨눴던 상처가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는 ‘광주’라는 도시의 특별함을 절감하게 됐다.
5·18 당시의 서일본신문 기사에는 ‘광주 폭동’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된 사건의 성격이 그대로 지면에 반영돼 있었다. 5월 27일 석간에는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이라는 제목과 함께 ‘민주화의 길 좌절’이라는 부제목이 실렸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일본어로 번역한 사람도 서일본신문 기자다. 선배들이 인연을 맺은 광주와 나 역시 작게나마 인연을 느끼게 됐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부여받은 일본. 반면에 한국은 피를 대가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같은 말이지만 한일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뿌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에 합류하고 목소리를 낸 모습은 일본에서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졌다. 나에게도 새롭게 보였고 역시 낯설었다. 시위 현장에서 일부러 젊은이들에게 말을 걸며 그들의 생각을 물어봤다.
취재에 응해준 젊은이들 대다수는 광주를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아픈 역사를 단순한 지식이 아닌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랬기에 더욱이 윤 전 대통령의 말은 너무 가볍게 들렸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작년 12월 12일의 대통령 담화다. 그 말을 광주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광주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나에게는 어쩐지 멀고 오래된 일로만 여겨졌던 광주 사건이 내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5·18로 귀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지금 이 순간 일본에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당시의 취재 노트를 되짚어 따라가 봤다.
군이 오면 더는 기사를 쓸 수 없다/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계엄군의 움직임/회사 근처에 육군 제31사단 사령부/사옥 셔터를 내리고 문에 자물쇠/카카오톡에 ‘신문 제작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군이 오면 동료에게 알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 수시로 큰길에 나가 경계/선배 기자에게서 “광주는 더 이상 희생을 내면 안 된다”는 메시지 등.
취재에 응한 기자들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에 “가짜 뉴스인가?”라며 혼란스러웠다고 털어놨다. 경제 성장을 거치며 민주주의가 성숙된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일이? 그러나 나 역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군이 들이닥칠 것을 상상하며 두려워하기는 어려웠다. 솔직히 말해 너무 과장된 반응이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기자들의 움직임을 들을 때마다 그 공포는 실제였음을 서서히 이해하게 됐다.
5·18 당시 군에 굴복해야 하고 윤전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기자들의 통한은 지금의 보도 현장에도 분명히 전해지고 있었다.
최권일 광주일보 편집국장은 인터뷰에서 당시 선배 기자들이 제출했던 사직서를 보여줬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고 쓰여 있었다.
짧지만 무거운 이 사직서는 그 어떤 설명보다도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그리고 여러 번 읽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영화 ‘택시운전사’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보도가 통제된 가운데 모든 걸 독일 기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광주 기자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이었다.
광주일보(옛 전남일보)의 1980년 6월 2일 자 사고(社告)에는 “알려야 할 의무마저 다하지 못하는 자책과 자성”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신문 발행이 중단된 12일을 지나 다시 신문이 나온 그날의 기사였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기자들을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은 슬프게도 5·18의 깊은 트라우마였다. 그리고 총구를 겨눴던 상처가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는 ‘광주’라는 도시의 특별함을 절감하게 됐다.
5·18 당시의 서일본신문 기사에는 ‘광주 폭동’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된 사건의 성격이 그대로 지면에 반영돼 있었다. 5월 27일 석간에는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이라는 제목과 함께 ‘민주화의 길 좌절’이라는 부제목이 실렸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일본어로 번역한 사람도 서일본신문 기자다. 선배들이 인연을 맺은 광주와 나 역시 작게나마 인연을 느끼게 됐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부여받은 일본. 반면에 한국은 피를 대가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같은 말이지만 한일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뿌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에 합류하고 목소리를 낸 모습은 일본에서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졌다. 나에게도 새롭게 보였고 역시 낯설었다. 시위 현장에서 일부러 젊은이들에게 말을 걸며 그들의 생각을 물어봤다.
취재에 응해준 젊은이들 대다수는 광주를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아픈 역사를 단순한 지식이 아닌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랬기에 더욱이 윤 전 대통령의 말은 너무 가볍게 들렸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작년 12월 12일의 대통령 담화다. 그 말을 광주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광주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나에게는 어쩐지 멀고 오래된 일로만 여겨졌던 광주 사건이 내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5·18로 귀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지금 이 순간 일본에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