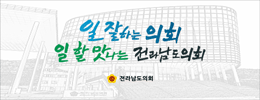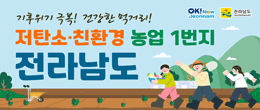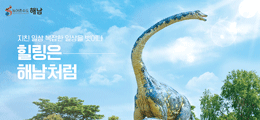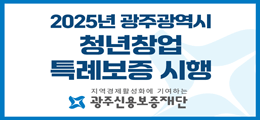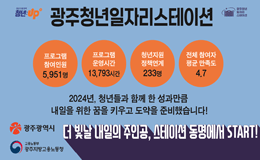망백(望百)의 시인 회두리판 시집을 읽으며- 황옥주 수필가
 |
진헌성 시인의 열여섯 번째 시집 ‘잘 살고 갑니다’를 받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글제만 보고 울컥해 보기는 예전엔 없었던 일이다. 유언서를 받은 기분이랄까 미지의 숲길을 걷다가 누군가의 새 무덤 비문을 대한 심회랄까. 숙연해진 마음에 눈물이라도 나올 것 같았다.
시집을 펼쳐 봤다. 표현이 눈에 익다. 그의 시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글자만 읽어서는 잡힐 듯 아닌 듯 보일락 말락 안갯속이다. 그의 시 세계 지평은 천문학에서부터 과학, 역사, 철학, 고전, 인문학 등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다.
글이 어렵다는 것은 독자의 지식과 사상이 작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눈으로 흡입하여 가슴으로 쓴 글은 읽기 편하나 머리로 빚어낸 글은 뜻 파악이 쉽지 않다.
사나운 험산도 간난 끝에 올라보면 골짜기까지 보인다. 오르기를 포기하고 쳐다보면 한쪽 윤곽만 보일뿐더러 고개가 아프다. 남이야 어쩐지 몰라도 머릿속이 텅 빈 내 수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처음엔 그분도 서정적 시를 많이 쓰셨다 한다. 회두리판에서, “1960년도 5·18까지는 순수 서정시였으나 5·18을 겪고 나서는 병원이 도청에서 가깝기 때문에 내 국군이 내 국민을 학살, 학대하는 현장을 직접 목도했기에 예술지상주의의 문학은 자홀의 사기라 자각, 사회·국가·민족 및 관념적 이념과 종교 조직의 동아리란 곧 권력자들의 노리개에 불과하며 그 노리개의 최고 깃발인 신들의 싸움 역사인 유신문명의 역사전쟁이라 봤다”고 했다.
진실이 아닌 글은 사기다. 아우구스티누스(고백론 7쪽)는 “거짓을 ‘참’ 인줄 알고 따라가는 어리석음! 참을 보고도 죄악의 심연에서 뒹굴어야 하는 인간의 비참”을 한탄했다.
‘잘 살고 갑니다’는 미래의 죽음까지를 성찰과 사유로 쓴 글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을 성찰한다는 것은 얼핏 모순 같아 보여도 문학은 무량세계다. 살아서는 내가 쓰고 죽은 뒤에는 남들이 다시 풀어쓴다.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만시(輓詩)가 있듯 자기 죽음을 미리 가정하고 성찰한 자만 시나 자만 사(詞)도 있다.
삶과 죽음은 거기서 거기다. 보이는 것이 이승이요 보이지 않은 게 저승이다. 신의 피조물인 우리 생은 시한부다. 그걸 알면서도 죽음은 예고가 없기에 한 치 앞을 모른 체 멍청하게 살고 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허방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살아있다고 자만할 일이 아니다.
죽음은 절망이다.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권력을 휘둘러 본 사람일수록 생에 대한 미련이 많다. 더 누리고 싶어 야차같이 권세 줄에 매달린다. 돈 범벅 속에 묻혀본 사람일수록 죽음을 애통해 한다. 나는 권력의 맛을 본 적도 재미로 돈을 만져 본 적도 없으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런 것 같다.
이러한 세태를 두고 진 시인은 “살고 싶다가 거게다. 마지못해 죽는 것이다”(마케 질문)라 했다. 교활한 재주꾼도 피할 길이 없어 죽는다. 고 이어령 교수는 “과일 속에 씨가 있듯이 생명 속에 죽음도 함께 있다.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생명이 있겠나. 죽음의 바탕이 있기에 생을 그릴 수 있다”고 했다. 인생을 값지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죽음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잘 살고 갑니다’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글이 없다. 옥안에 홍조를 띤, 이만하면 잘 산 삶이지 싶다.
진 시인은 철저한 무신론에 유물론자며 실존주의자다. “나 죽었다며/ 왜 절하니/ 내가 거기 있간디/ 꽃 한 송이도 꺾지 마/ 내가 보간디/ 나 좋단디/ 왜 네가 우냐”
‘내 유언’이란 시인데 남들이 생각지 못할 발상이다. 혼 잃고 땅에 묻힌 백(魄)이 성묘 온 사람을 기억해줄 리도, 꺾어온 꽃을 볼 리가 없다. 꺾인 꽃만 가엽다.
얼마 전 시제를 모시고 왔다. 열한 분을 모시는 시제인데 묘가 있는 곳도 모르면서 산기슭 길가에 돗자리를 펴고 상을 차렸다. 제일 윗분은 400년 전쯤의 조상이다. 산속 영들이 제사상 때문에 내려오셨을 것 같지도 않고 400년 뒤의 후손들을 보시고자 했을 리는 더욱 만무하다.
그렇다고 내려온 전통을 그만 둘 수도 없는 일,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이다. 금년 이후, 선산에 핀 진달래꽃을 몇 번이나 더 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설령 제사는 모시지 않더라도 욕되게 살지는 않아야 후손이다. 어디 무슨 ○씨라 자랑하기 전에 내가 떳떳해야 조상이 빛난다.
시집을 펼쳐 봤다. 표현이 눈에 익다. 그의 시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글자만 읽어서는 잡힐 듯 아닌 듯 보일락 말락 안갯속이다. 그의 시 세계 지평은 천문학에서부터 과학, 역사, 철학, 고전, 인문학 등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다.
사나운 험산도 간난 끝에 올라보면 골짜기까지 보인다. 오르기를 포기하고 쳐다보면 한쪽 윤곽만 보일뿐더러 고개가 아프다. 남이야 어쩐지 몰라도 머릿속이 텅 빈 내 수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진실이 아닌 글은 사기다. 아우구스티누스(고백론 7쪽)는 “거짓을 ‘참’ 인줄 알고 따라가는 어리석음! 참을 보고도 죄악의 심연에서 뒹굴어야 하는 인간의 비참”을 한탄했다.
‘잘 살고 갑니다’는 미래의 죽음까지를 성찰과 사유로 쓴 글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을 성찰한다는 것은 얼핏 모순 같아 보여도 문학은 무량세계다. 살아서는 내가 쓰고 죽은 뒤에는 남들이 다시 풀어쓴다.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만시(輓詩)가 있듯 자기 죽음을 미리 가정하고 성찰한 자만 시나 자만 사(詞)도 있다.
삶과 죽음은 거기서 거기다. 보이는 것이 이승이요 보이지 않은 게 저승이다. 신의 피조물인 우리 생은 시한부다. 그걸 알면서도 죽음은 예고가 없기에 한 치 앞을 모른 체 멍청하게 살고 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허방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살아있다고 자만할 일이 아니다.
죽음은 절망이다.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권력을 휘둘러 본 사람일수록 생에 대한 미련이 많다. 더 누리고 싶어 야차같이 권세 줄에 매달린다. 돈 범벅 속에 묻혀본 사람일수록 죽음을 애통해 한다. 나는 권력의 맛을 본 적도 재미로 돈을 만져 본 적도 없으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런 것 같다.
이러한 세태를 두고 진 시인은 “살고 싶다가 거게다. 마지못해 죽는 것이다”(마케 질문)라 했다. 교활한 재주꾼도 피할 길이 없어 죽는다. 고 이어령 교수는 “과일 속에 씨가 있듯이 생명 속에 죽음도 함께 있다.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생명이 있겠나. 죽음의 바탕이 있기에 생을 그릴 수 있다”고 했다. 인생을 값지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죽음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잘 살고 갑니다’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글이 없다. 옥안에 홍조를 띤, 이만하면 잘 산 삶이지 싶다.
진 시인은 철저한 무신론에 유물론자며 실존주의자다. “나 죽었다며/ 왜 절하니/ 내가 거기 있간디/ 꽃 한 송이도 꺾지 마/ 내가 보간디/ 나 좋단디/ 왜 네가 우냐”
‘내 유언’이란 시인데 남들이 생각지 못할 발상이다. 혼 잃고 땅에 묻힌 백(魄)이 성묘 온 사람을 기억해줄 리도, 꺾어온 꽃을 볼 리가 없다. 꺾인 꽃만 가엽다.
얼마 전 시제를 모시고 왔다. 열한 분을 모시는 시제인데 묘가 있는 곳도 모르면서 산기슭 길가에 돗자리를 펴고 상을 차렸다. 제일 윗분은 400년 전쯤의 조상이다. 산속 영들이 제사상 때문에 내려오셨을 것 같지도 않고 400년 뒤의 후손들을 보시고자 했을 리는 더욱 만무하다.
그렇다고 내려온 전통을 그만 둘 수도 없는 일,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이다. 금년 이후, 선산에 핀 진달래꽃을 몇 번이나 더 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설령 제사는 모시지 않더라도 욕되게 살지는 않아야 후손이다. 어디 무슨 ○씨라 자랑하기 전에 내가 떳떳해야 조상이 빛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