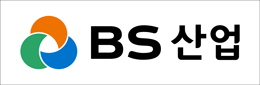감히 알려고 하는 용기에 대하여 -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
어제까지 옳다고 믿던 일이 자고 깨니 갑자기 잘못된 일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른 체 하는 것이 약일까, 아는 것이 힘이 될까. 요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탄식을 자주 듣는다. 삶이 뿌리를 둔 토대가 통으로 흔들리는 불안과 혼란의 표현일 것이다. 지금껏 살아온 세상이, 일상의 노동과 관계가, 가치 실현의 행위들이 부정당하며, 모멸당한다는 분노의 탄식이기도 하다.
특별히 우리 일상이 뒤틀리거나, 개인에게 불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안의 그림자는 일상 속으로 깊게 침습해오며 과연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누가 누구와 사돈을 맺었고, 누가 사는 동네가 어디고 하는 등의 시답지 않은 관음적 뉴스와 5년을 백수로 은둔하던 23살 청년의 잔인한 또래 살인, 한 노동자가 ‘조폭’으로 내몰리다 죽음을 택한 소식이 무심하게도 동시에 들려오는 나날들이다. 세상은 다시 천동설의 시계를 벽에 걸려고 하는 것일까.
16세기에 지동설로 대혼란을 일으킨 사람은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1473-1543)다. 그는 당시의 절대 진리인 지구 중심설 대신 태양 중심설, 즉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지동설(地動說)을 주장했다. 인간들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많은 행성 중에 하나라는 주장은 황당한 정도를 넘어서 불경한 것이었다. 결국 이 주장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갈릴레이가 다시 지동설을 주장하는 책을 썼다가 1633년에 종교 재판을 받았다. 다시는 지동설을 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풀려난 갈릴레이는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한 일화가 있다.
당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은 곧 하늘이 무너진다는 의미였다. ‘자신이 두 발로 분명히 서 있는’ 지구가 움직이다니! 하늘을 보면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이 금방 보이지 않는가! 움직이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어야 한다. 이런 확증의 태도는 소위 겉보기 운동의 직관성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따라서 자신을 판단의 중심에 둔다. 지동설은 사람이 신의 창조물이라는 믿음에 큰 의문을 품게 했고, 서양의 인간중심주의가 무너지는 발단이 되었다. 괴테의 말처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포기해야 했다. 세상일을 보는 방식도 같다. 직관성의 태도로 자신을 중심에 두면 세상 구별이 참 쉽다. 하지만 우주의 중심에 자신을 두려는 모든 시도는 한낱 무지에서 나온 만용이자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자신의 정신적인 중세의 천동설일 뿐이다. 그 누구도 혼자 우주의 중심을 차지할 수 없다.
세상일에 대한 무관심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은 원래 가짜들의 판속이고 진실은 알 수 없으며, 알아도 쓸모없다는 이유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불안과 혼란, 분노는 개인감정이 아니고, 시대적 징후이다. 알고 싶지 않다고, 결코 모른 척이 안 되는 데서 오는 불안이다. 모두가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지만 아무도 방향을 알지 못함에서 엄습하는 바로 그 불안이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돈다는 중세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길은 감히 알고자 하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니 과감하게 알려고 하라!”는 로마시인 호라티우스의 시구에서 온 표현이다. 여기에 ‘과감히’라는 표현이 꼭 필요한 것은, 알려고 하는 것은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려는 용기와 의지 때문이다. 두 눈에는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작 돌고 있는 것은 지구라는 것을 아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던가. 부르노 신부처럼, 때로는 목숨을 내놓은 용기를 요청받는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변방에 사는 이방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자 이들을 야만인으로 간주했다. 자신들이 가장 이성적이고 여긴 그리스인에게 낯선 이방인의 언어는 그저 무식한 ‘야만(바바)’의 것으로만 들렸다. 먼저 상대방을 야만인으로 규정하면 대화적인 관계는 불가능하다. 이 ‘나의 언어’가 곧 유일한 진리의 언어라고 믿는 미성숙한 독단의 세계에서는 지구 대신 아직도 태양이 돈다.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디, 과감하게 알고자 하자! 사페레 아우데!
당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은 곧 하늘이 무너진다는 의미였다. ‘자신이 두 발로 분명히 서 있는’ 지구가 움직이다니! 하늘을 보면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이 금방 보이지 않는가! 움직이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어야 한다. 이런 확증의 태도는 소위 겉보기 운동의 직관성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따라서 자신을 판단의 중심에 둔다. 지동설은 사람이 신의 창조물이라는 믿음에 큰 의문을 품게 했고, 서양의 인간중심주의가 무너지는 발단이 되었다. 괴테의 말처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포기해야 했다. 세상일을 보는 방식도 같다. 직관성의 태도로 자신을 중심에 두면 세상 구별이 참 쉽다. 하지만 우주의 중심에 자신을 두려는 모든 시도는 한낱 무지에서 나온 만용이자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자신의 정신적인 중세의 천동설일 뿐이다. 그 누구도 혼자 우주의 중심을 차지할 수 없다.
세상일에 대한 무관심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은 원래 가짜들의 판속이고 진실은 알 수 없으며, 알아도 쓸모없다는 이유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불안과 혼란, 분노는 개인감정이 아니고, 시대적 징후이다. 알고 싶지 않다고, 결코 모른 척이 안 되는 데서 오는 불안이다. 모두가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지만 아무도 방향을 알지 못함에서 엄습하는 바로 그 불안이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돈다는 중세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길은 감히 알고자 하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니 과감하게 알려고 하라!”는 로마시인 호라티우스의 시구에서 온 표현이다. 여기에 ‘과감히’라는 표현이 꼭 필요한 것은, 알려고 하는 것은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려는 용기와 의지 때문이다. 두 눈에는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작 돌고 있는 것은 지구라는 것을 아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던가. 부르노 신부처럼, 때로는 목숨을 내놓은 용기를 요청받는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변방에 사는 이방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자 이들을 야만인으로 간주했다. 자신들이 가장 이성적이고 여긴 그리스인에게 낯선 이방인의 언어는 그저 무식한 ‘야만(바바)’의 것으로만 들렸다. 먼저 상대방을 야만인으로 규정하면 대화적인 관계는 불가능하다. 이 ‘나의 언어’가 곧 유일한 진리의 언어라고 믿는 미성숙한 독단의 세계에서는 지구 대신 아직도 태양이 돈다.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디, 과감하게 알고자 하자! 사페레 아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