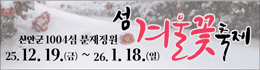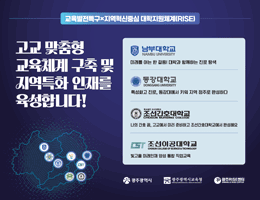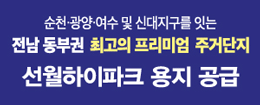[교단에서-김진구 일신중 교감] ‘털털털’
 |
볏짚으로 짚신을 삼아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이 부자(父子)는 만든 짚신을 5일장에 내다 팔았다. 농사철에는 놉이나 날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다가 농한기 겨울철에는 짚신을 삼는 것이 생업이었다. 그런데 똑같은 볏짚으로 함께 앉아 짚신을 만드는데 아버지가 만든 짚신은 아들 짚신보다 꼭 몇 푼씩 더 받았다. 비슷한 기술과 동일한 시간, 같은 재료로 만드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아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병석에 누웠다. 아들에게 3음절의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준 유언은 ‘털털털’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짚신 가격 차이는 마무리 손질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짚신을 다 삼은 후에 삐져나온 잔털 지푸라기를 손질하여 매끄럽게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짚신을 만들고 나서 후련하다는 듯이 바로 망태에 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특별한 기술도 아니요, 더구나 자식이니 불러다가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면 될 것을 무슨 대단한 비법이라고 털털털 하고 죽다니.
한옥을 지을 때 구들은 달밤에 놓는다는 어른들의 말씀도 있다. 개자리 만들기, 불길이 지나가는 고래의 폭과 깊이 등 오늘날 과학적 용어로 대류현상과 베르누이 법칙이 적용된 구들 놓기 기술은 절대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 일꾼은 물론 자식과 함께 일을 하더라도 구들장 나르기나 흙일은 낮에 함께 하고, 실제 구들 놓기는 비법이 노출될까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밤에 달빛 아래 혼자 구들을 놓았다고 한다.
학교에 일하러 오신 몇 분들을 보면서 떠오른 옛 이야기들이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의 관점에서 느끼는 차이가 있겠으나 어떤 일이고 마무리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돋보이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작년에 개교 이후 처음으로 소나무 전정을 하였다. 소나무 전정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쉽게 손댈 수 없기에 웃자라고, 뭉치고, 기울어진 소나무가 많았다. 전문가 부부가 와서 소나무를 손질하는데 손길이 지나가면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었다. 따라다니면서 몇 가지 물어보았으나 “소나무 전정은 이론보다는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며 웃을 뿐이었다. 군더더기를 잘라 낸 정갈한 소나무가 교정을 기품 있게 했다. 그런데 가지치기가 끝난 후 전정보다 더 깔끔한 일이 있었다. 여기저기 자른 가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들 부부는 타고 온 1톤 트럭에 흩어진 가지를 싣고는 선한 미소를 남긴 채 떠난 것이다.
얼마 전, 이 부부가 학교에 왔다. 일 년 만에 다시 찾아와 죽은 나무는 없는지, 심한 전정이나 병충해로 약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다. 경비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 일한 인연을 해를 넘겨서까지 이렇게 마무리 하니, 소문이 나서 이 분들을 학교에 모시려면 미리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발소나 미장원에서도 정성스런 마무리 손길에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다. 좋은 끝맺음은 끈끈한 여운으로 상대방을 당기는 힘이 있다
학년이 끝나고 허물처럼 남긴 빈 교실을 돌아보면서도 느낀 점이 많다. 깨끗하게 청소가 된 교실을 보면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고 일 년 동안 학급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이 한마음이 되어 잘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버려진 책이며, 청소함 곁에 쌓인 우산, 흐트러진 책걸상, 칠판 낙서 가득한 교실에 들어가면 ‘바쁜 와중에 그러려니’ 하면서도 아쉬운 한숨이 나온다. 학년 초에 잘 꾸며진 학급도 좋아 보이지만, 학년 말에 깔끔하게 마무리된 빈 교실의 학생과 담임 선생님이 더 가슴에 남는다.
연말을 앞두고 숨을 고르는 11월이다. 모든 분야가 빠르게 진행되고 소멸되는 요즈음 지난 일상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다. 신세 진 분들께 한 통의 전화나 두툼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아니면 진한 추어탕 한 그릇으로 우리들의 한 해 생활 마무리 ‘털털털’로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오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달빛 아래 전해줄 비법도 없지만 내손으로 뜯어내고 싶은 마무리 털이 한두 개 있어서 오늘도 짚신을 삼고 있다.
학교에 일하러 오신 몇 분들을 보면서 떠오른 옛 이야기들이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의 관점에서 느끼는 차이가 있겠으나 어떤 일이고 마무리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돋보이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작년에 개교 이후 처음으로 소나무 전정을 하였다. 소나무 전정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쉽게 손댈 수 없기에 웃자라고, 뭉치고, 기울어진 소나무가 많았다. 전문가 부부가 와서 소나무를 손질하는데 손길이 지나가면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었다. 따라다니면서 몇 가지 물어보았으나 “소나무 전정은 이론보다는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며 웃을 뿐이었다. 군더더기를 잘라 낸 정갈한 소나무가 교정을 기품 있게 했다. 그런데 가지치기가 끝난 후 전정보다 더 깔끔한 일이 있었다. 여기저기 자른 가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들 부부는 타고 온 1톤 트럭에 흩어진 가지를 싣고는 선한 미소를 남긴 채 떠난 것이다.
얼마 전, 이 부부가 학교에 왔다. 일 년 만에 다시 찾아와 죽은 나무는 없는지, 심한 전정이나 병충해로 약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다. 경비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 일한 인연을 해를 넘겨서까지 이렇게 마무리 하니, 소문이 나서 이 분들을 학교에 모시려면 미리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발소나 미장원에서도 정성스런 마무리 손길에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다. 좋은 끝맺음은 끈끈한 여운으로 상대방을 당기는 힘이 있다
학년이 끝나고 허물처럼 남긴 빈 교실을 돌아보면서도 느낀 점이 많다. 깨끗하게 청소가 된 교실을 보면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고 일 년 동안 학급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이 한마음이 되어 잘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버려진 책이며, 청소함 곁에 쌓인 우산, 흐트러진 책걸상, 칠판 낙서 가득한 교실에 들어가면 ‘바쁜 와중에 그러려니’ 하면서도 아쉬운 한숨이 나온다. 학년 초에 잘 꾸며진 학급도 좋아 보이지만, 학년 말에 깔끔하게 마무리된 빈 교실의 학생과 담임 선생님이 더 가슴에 남는다.
연말을 앞두고 숨을 고르는 11월이다. 모든 분야가 빠르게 진행되고 소멸되는 요즈음 지난 일상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다. 신세 진 분들께 한 통의 전화나 두툼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아니면 진한 추어탕 한 그릇으로 우리들의 한 해 생활 마무리 ‘털털털’로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오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달빛 아래 전해줄 비법도 없지만 내손으로 뜯어내고 싶은 마무리 털이 한두 개 있어서 오늘도 짚신을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