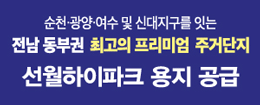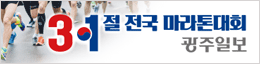[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제철 음식
 |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격세지감이다. 작년 이맘때는 너도나도 “이게 나라냐?”라며 탄식했으나 지금은 ‘나라다운 나라’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정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역동적인 나라다.
지난해에는 역사의 현장을 놓치고 싶지 않아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광화문으로 나갔다.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촛불 집회는 분노 대신 풍자가, 탄식 대신 감동이 넘쳤다. 하지만 너무 길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기온을 견디기 위해 중무장을 했지만 40대 후반에 접어든 부실한 몸은 수시로 한계에 부딪혔다. 중간중간 허기도 채우고 따뜻한 음료도 먹어 줘야 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는지 광화문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 등은 예상치 못한 ‘촛불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그날도 그랬다. 구호를 외치느라 목이 칼칼해지고 온몸에 한기가 몰려왔다. 함께 집회에 참석했던 친구는 광화문 정부 청사 뒤편에 있는 작은 카페로 나를 이끌었다. 주인장이 직접 내려 준 커피 한잔에 컨디션이 차츰 회복되었다.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동안 주인장은 맛이나 보라며 ‘홍시 스무디’를 내왔다. 잘 익은 홍시에 얼음만 넣고 갈아 낸 음료 한잔에 잠자고 있던 관능이 살아났다. 은은한 향과 고운 단맛.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 살이 여물고 가을 햇살 속에 녹진녹진 익어간 홍시만이 낼 수 있는 향과 맛이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국정 농단으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2016년의 가을을 ‘홍시 스무디’ 한잔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후로는 다시 그 맛을 보지 못했다. 숨 가쁘게 굴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겨울이 가고 봄을 맞았다. 더불어 홍시 스무디의 계절도 끝나고 말았다. 홍시를 얼린 퓨레를 사용하면 일 년 내내 그 맛을 볼 수 있으련만, 고집 센 주인장은 굳이 가을에 수확한 홍시만 고집했다.
그리고 다시 가을을 맞았다. 나는 더위가 가실 무렵부터 홍시 스무디를 기대했다. 다행히 고집 센 주인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중순께부터 홍시 스무디를 출시했다. 그런데 10월 중순에 벌써 홍시? 아니나 다를까 주인장은 홍시가 아니라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해 후숙한 연시로 만들었음을 솔직히 밝혔다. 숙성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이 맛과 향이 정점에 이른 연시와 아직 덜 아문 연시를 구분하지 못하는 걸 두고 닦달하는 모습까지 SNS를 통해 공개할 정도였다. 그리고 11월이 되어 진짜 홍시가 수확되자 그는 연시 대신 비싼 전라북도 부안의 대봉 홍시로 스무디를 만들었다. 덕분에 나는 올해도 가을의 향기와 달콤함을 유감없이 만끽했다. 이것저것에 ‘과일의 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적어도 내게는 얼음과 함께 곱게 갈린 홍시가 이 가을 진정한 과일의 왕이다.
그가 만약 연시와 홍시를 구분하지 않고, 연시 숙성에 유별날 정도로 까다롭지 않고, 냉동했거나 가공 과정을 거친 퓨레를 사용했더라면, 그래서 1년 내내 아무 때고 먹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저 평범한 음료일 뿐 가을을 기다리는 설렘과 가을을 맞는 기쁨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십수 년 전 전남 장흥군 회진면에 취재를 갔을 때 난생 처음 매생이국을 먹어 봤다. 고운 파래 같은 것이 듬뿍 든, 김이 모락모락 나지도 않는 국을 대수롭지 않은 듯 퍼먹었다. 뜨거운 열기를 속으로 품고 있던 매생이는 초짜의 입 속을 여지없이 헤집어 놓았다. 식겁은 했지만 그 여리고 개운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포기할 수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순식간에 국 한 사발을 비웠다. 그리고 맞았던 차가운 바닷바람이란!
매생이를 키우는 일은 비교적 간단했다. 대나무를 쪼개고 엮어서 만든 발을 바다에 세워 두면 자연스레 포자가 붙어 바다가 들고나며 키웠다. 하지만 섣달부터 이듬해 정월 대보름까지의 수확 과정은 살을 에는 듯한 바람과 싸워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다. 수온과 환경에 민감한 매생이는 뻘밭, 자갈, 바위, 나무 등에 붙어 자랐고 아무리 청정 해역이라도 물살이 세거나 수온이 높으면 자라지 않았다. 그래서 전라남도 고흥, 장흥, 강진, 해남, 완도 등 서남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겨울의 진미였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급속 냉동과 동결 건조 기술의 발달로 매생이는 이제 사시사철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되었다. 계절감을 잃은 매생이는 맛은 그대로지만 전과 같은 감동이 없다.
인간의 미각은 논리보다는 감성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언제 먹었는지 누구와 먹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먹었는지에 따라 같은 음식도 다른 의미로 기억된다. 결국 그 기억들이 축적되어 미각의 한 축을 형성한다.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린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먹을 게 없다’ ‘예전 그 맛이 아니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먹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절감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억이라는 미각의 한 축이 무너졌다는 의미다. 사시사철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것들에게선 감동도 설렘도 없다. 기다림의 여유와 애달픔 속에 맛이 깃든다. 음식을 통해 계절을 맞고 보내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풍류이고 삶을 즐기는 방편이다. 그러니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갖자.
점점 차가워지는 바람 속에서 기름이 오르는 바다 생선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으신가?
〈맛 칼럼니스트〉
지난해에는 역사의 현장을 놓치고 싶지 않아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광화문으로 나갔다.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촛불 집회는 분노 대신 풍자가, 탄식 대신 감동이 넘쳤다. 하지만 너무 길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기온을 견디기 위해 중무장을 했지만 40대 후반에 접어든 부실한 몸은 수시로 한계에 부딪혔다. 중간중간 허기도 채우고 따뜻한 음료도 먹어 줘야 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는지 광화문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 등은 예상치 못한 ‘촛불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그리고 다시 가을을 맞았다. 나는 더위가 가실 무렵부터 홍시 스무디를 기대했다. 다행히 고집 센 주인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중순께부터 홍시 스무디를 출시했다. 그런데 10월 중순에 벌써 홍시? 아니나 다를까 주인장은 홍시가 아니라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해 후숙한 연시로 만들었음을 솔직히 밝혔다. 숙성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이 맛과 향이 정점에 이른 연시와 아직 덜 아문 연시를 구분하지 못하는 걸 두고 닦달하는 모습까지 SNS를 통해 공개할 정도였다. 그리고 11월이 되어 진짜 홍시가 수확되자 그는 연시 대신 비싼 전라북도 부안의 대봉 홍시로 스무디를 만들었다. 덕분에 나는 올해도 가을의 향기와 달콤함을 유감없이 만끽했다. 이것저것에 ‘과일의 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적어도 내게는 얼음과 함께 곱게 갈린 홍시가 이 가을 진정한 과일의 왕이다.
그가 만약 연시와 홍시를 구분하지 않고, 연시 숙성에 유별날 정도로 까다롭지 않고, 냉동했거나 가공 과정을 거친 퓨레를 사용했더라면, 그래서 1년 내내 아무 때고 먹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저 평범한 음료일 뿐 가을을 기다리는 설렘과 가을을 맞는 기쁨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십수 년 전 전남 장흥군 회진면에 취재를 갔을 때 난생 처음 매생이국을 먹어 봤다. 고운 파래 같은 것이 듬뿍 든, 김이 모락모락 나지도 않는 국을 대수롭지 않은 듯 퍼먹었다. 뜨거운 열기를 속으로 품고 있던 매생이는 초짜의 입 속을 여지없이 헤집어 놓았다. 식겁은 했지만 그 여리고 개운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포기할 수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순식간에 국 한 사발을 비웠다. 그리고 맞았던 차가운 바닷바람이란!
매생이를 키우는 일은 비교적 간단했다. 대나무를 쪼개고 엮어서 만든 발을 바다에 세워 두면 자연스레 포자가 붙어 바다가 들고나며 키웠다. 하지만 섣달부터 이듬해 정월 대보름까지의 수확 과정은 살을 에는 듯한 바람과 싸워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다. 수온과 환경에 민감한 매생이는 뻘밭, 자갈, 바위, 나무 등에 붙어 자랐고 아무리 청정 해역이라도 물살이 세거나 수온이 높으면 자라지 않았다. 그래서 전라남도 고흥, 장흥, 강진, 해남, 완도 등 서남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겨울의 진미였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급속 냉동과 동결 건조 기술의 발달로 매생이는 이제 사시사철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되었다. 계절감을 잃은 매생이는 맛은 그대로지만 전과 같은 감동이 없다.
인간의 미각은 논리보다는 감성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언제 먹었는지 누구와 먹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먹었는지에 따라 같은 음식도 다른 의미로 기억된다. 결국 그 기억들이 축적되어 미각의 한 축을 형성한다.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린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먹을 게 없다’ ‘예전 그 맛이 아니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먹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절감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억이라는 미각의 한 축이 무너졌다는 의미다. 사시사철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것들에게선 감동도 설렘도 없다. 기다림의 여유와 애달픔 속에 맛이 깃든다. 음식을 통해 계절을 맞고 보내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풍류이고 삶을 즐기는 방편이다. 그러니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갖자.
점점 차가워지는 바람 속에서 기름이 오르는 바다 생선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으신가?
〈맛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