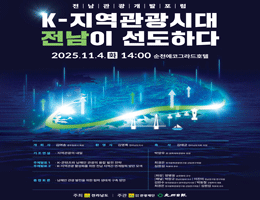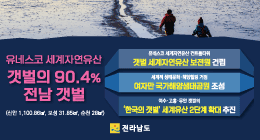[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조경(造景)에 대한 2% 아쉬움
어떤 건축물을 설계하든지 건축주의 생각을 충분히 듣는 게 첫째 요건이다. 다음은 현장을 분석한다. 자연적인 환경과 인문적 요소들을 잘 관찰하고 분석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서 땅이 요구하는 바람(?)을 느끼도록 노력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제한 사항 내에서 건축가의 철학으로 버무려낸다. 건축설계다. 긴 여정이다.
건축설계 과정에서 법적인 제한 사항은 수도 없이 많지만 조경(造景)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규정 중의 하나다. 조경은 규정을 넘어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살아 움직인다. 건축과 외부공간을 살릴 수도, 아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다.
백과사전에서 “조경은 회화·조각·산업디자인·건축·토목·도시계획 등의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조경은 예술이자 기술이고 사회적 수요의 산물이며, 심미성과 기능성과 공공성은 조경의 기본적 특성이자 조경이 지향해야 할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해가 쉽지 않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조경은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쓰임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생태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가끔은 ‘조경’을 했다고 하는 곳이‘조경’을 한 것이 아니라 ‘식재’(植栽)만 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식재란 식물을 심어 재배함 또는 나무를 심어 가꾸는 일’이라고 지식백과에서는 설명한다. 조경을 한다는 것과 식재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조성된 공원이나 공공건물의 조경공간들을 볼 때 아쉬운 2%가 큰 오점으로 다가온다. 최근에 마무리된 두 곳의 사례에 대한 의견이다.
광주향교 앞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비운, 녹지공간이 있다. 가려진 향교에 숨통을 열어줘 좋다. 그런데 조경디자인을 한 공원이라기보다는 식재만 한 녹지 공간이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의 이유만 들어 보자. 향교의 이념과 상징은 공자를 모시는 사당과 은행나무다. 특히 은행나무는 공자의 철학과 가르침을 상징한다. 이와 더불어 향교 입구는 비어진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입구엔 은행나무에 버금가는 커다란 소나무를 군집하여 심었다. 건축물로서의 향교와 향교의 기본철학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커다란 소나무를 심어 건물과 은행나무를 가리지는 않았어야 했다. 나무 중의 으뜸은 소나무라고 한다. 좋은 소나무로 빈 공간에 식재는 잘했지만 향교의 특성과 그 주변상황에 대한 고려는 아쉽다.
동구 동명동에 청년기술창업지원센터인 아이플렉스(I-PLEX)가 완공되었다. 이곳의 녹지공간도 좁지만 괜찮다. 그런데 커다란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건물에 너무 가까이 심었다. 나무는 자란다.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서로에게 안좋다. 건물과는 적절한 이격이 필요하다. 좋은 나무를 빈 공간에 식재는 잘했지만 제대로 된 조경디자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건축가로서 조경에 대한 몇 가지 느낀 점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입체적 환경 분석이 되어야 한다. 장소의 인문적 성격, 주변에 있는 건물과 기존의 식생을 조사 분석해야 한다. 도로와 접한 곳은 기존 가로수의 수종과 수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계획할 땅에만 치중하다보면 주변의 좋은 자산과 괴리가 생기는 녹지공간으로 전락한다. 특히 도심 속 조경일수록 더욱더 그렇다.
둘째, 나무는 성장한다. 양림동엔 100년의 역사에 가까운 선교사 사택이 있다. 바로 옆에 건물보다 훨씬 높은 나무가 무성하다. 당시엔 작은 나무였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집을 위한 나무가 반대로 주인이 되어 집에 피해를 준다. 나무는 자란다. 장기적으로 건축물과 관계를 고려하여 나무 종류와 위치를 각별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채우려는 욕심을 조금만 갖자. 도심공원이나 관공서 마당에 가면 튄 맛이 부족하다. 빈 곳을 두지 않는다. 나무를 빽빽이 심는다. 도심과 소규모 녹지에선 식재에 대한 욕심을 좀 버렸으면 한다. 법 규정에 식재 비율이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잔디밭에 심어진 한그루 나무만으로도 충분한 쉼의 공간과 여유로움을 만들 수 있다 것도 알아야 한다.
녹지공간은 필요하다. 식재만 한 녹지가 아니라, 잘 디자인되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서로 상생하는 생태예술로서 멋진 조경공간을 많이 만나고 싶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백과사전에서 “조경은 회화·조각·산업디자인·건축·토목·도시계획 등의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조경은 예술이자 기술이고 사회적 수요의 산물이며, 심미성과 기능성과 공공성은 조경의 기본적 특성이자 조경이 지향해야 할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해가 쉽지 않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조경은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쓰임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생태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광주향교 앞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비운, 녹지공간이 있다. 가려진 향교에 숨통을 열어줘 좋다. 그런데 조경디자인을 한 공원이라기보다는 식재만 한 녹지 공간이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의 이유만 들어 보자. 향교의 이념과 상징은 공자를 모시는 사당과 은행나무다. 특히 은행나무는 공자의 철학과 가르침을 상징한다. 이와 더불어 향교 입구는 비어진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입구엔 은행나무에 버금가는 커다란 소나무를 군집하여 심었다. 건축물로서의 향교와 향교의 기본철학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커다란 소나무를 심어 건물과 은행나무를 가리지는 않았어야 했다. 나무 중의 으뜸은 소나무라고 한다. 좋은 소나무로 빈 공간에 식재는 잘했지만 향교의 특성과 그 주변상황에 대한 고려는 아쉽다.
동구 동명동에 청년기술창업지원센터인 아이플렉스(I-PLEX)가 완공되었다. 이곳의 녹지공간도 좁지만 괜찮다. 그런데 커다란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건물에 너무 가까이 심었다. 나무는 자란다.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서로에게 안좋다. 건물과는 적절한 이격이 필요하다. 좋은 나무를 빈 공간에 식재는 잘했지만 제대로 된 조경디자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건축가로서 조경에 대한 몇 가지 느낀 점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입체적 환경 분석이 되어야 한다. 장소의 인문적 성격, 주변에 있는 건물과 기존의 식생을 조사 분석해야 한다. 도로와 접한 곳은 기존 가로수의 수종과 수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계획할 땅에만 치중하다보면 주변의 좋은 자산과 괴리가 생기는 녹지공간으로 전락한다. 특히 도심 속 조경일수록 더욱더 그렇다.
둘째, 나무는 성장한다. 양림동엔 100년의 역사에 가까운 선교사 사택이 있다. 바로 옆에 건물보다 훨씬 높은 나무가 무성하다. 당시엔 작은 나무였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집을 위한 나무가 반대로 주인이 되어 집에 피해를 준다. 나무는 자란다. 장기적으로 건축물과 관계를 고려하여 나무 종류와 위치를 각별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채우려는 욕심을 조금만 갖자. 도심공원이나 관공서 마당에 가면 튄 맛이 부족하다. 빈 곳을 두지 않는다. 나무를 빽빽이 심는다. 도심과 소규모 녹지에선 식재에 대한 욕심을 좀 버렸으면 한다. 법 규정에 식재 비율이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잔디밭에 심어진 한그루 나무만으로도 충분한 쉼의 공간과 여유로움을 만들 수 있다 것도 알아야 한다.
녹지공간은 필요하다. 식재만 한 녹지가 아니라, 잘 디자인되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서로 상생하는 생태예술로서 멋진 조경공간을 많이 만나고 싶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