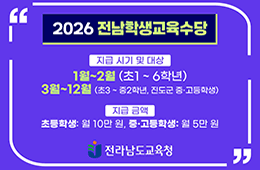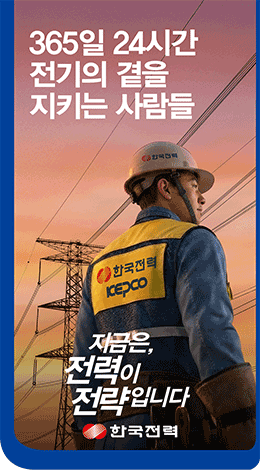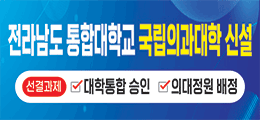[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게임에서 ‘몰입’을 배우다
전 세계가 ‘포켓몬고’ 신드롬에 빠져 있다. ‘포켓몬고’는 지난 몇 년간 정체돼 있던 게임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전기(轉機)가 됐다. 세계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길 거리가 등장했다는 평가도 있다. 혜성처럼 나타난 이 즐길 거리는 우리들의 일상 깊은 곳으로 들어와 위안을 준다.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여가활동인 셈인데, 디지털 시대의 게임은 소수가 즐기던 마니아 문화에서 이제 보편적 대중의 여가문화로 변하고 있다.
‘포켓몬고’의 본질은 게임이다. 미국의 철학자 버너드 슈츠(Bernard Suits)는 게임을 ‘불필요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게임은 우리나라 19∼35세 국민의 74.5%, 10대의 약 91%, 20대의 약 87%가 이용하는 주요 여가활동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 관계를 배우는 만남의 장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캐나다 캘거리대 로버트 스테빈스(R.Stebbins) 교수가 1970년 처음 사용한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개념은 TV시청, 낮잠 등과 같은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의 상대적·대칭적 개념이다. 단순히 놀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돈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여가인 것이다. 피아노를 배우거나 클라이밍에 도전하는 것이 이 ‘진지한 여가’의 대표적 사례인데, 스스로 여행을 떠나고 시간과 비용 투자를 요구하는 ‘포켓몬고’ 역시 그래서 진지한 여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몰입이론의 창시자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에 따르면, 몰입(flow)은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는 심리 상태’다. 주위의 모든 잡념과 방해물을 차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의도적인 집중과정을 통해 무의식적인 몰입 단계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몰입은 숙련을 요구하다. 특히 많은 노력과 시련 끝에 도달하는 높은 수준의 몰입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스키를 타고 산비탈을 질주할 때는 누구라도 몸의 움직임, 스키의 위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 눈 덮인 나무 등에 주의를 집중한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넘어지기 십상이라,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완전한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느낌은 강한 행복감을 주고 우리의 뇌리에 오래오래 남아서 자신이 꿈꾸는 삶의 나침반이 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몰입은 자신의 목표를 찾아 노력하고, 그 결과로 보상받는 대표적인 행복 체험이다. 그래서 보통 몰입이라는 개념은 행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과다한 행복’이라는 것이 있는지 짚어 봐야 한다. 바이올린을 하루 종일 연주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그림을 몇날 며칠 밤새워 그리는 화가들을 과몰입이라고 불러도 될까? 그런 차원에서 게임에 몰입하는 게이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
몰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더 알차게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 또한 키울 수 있도록 해 준다. 진지하게 몰입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경험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서두에서 말한 돈과 시간을 투자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진지한 여가로서의 게임과 불필요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는 게임의 정의 사이에는 ‘몰입’이 매개가 될 수 있다.
이제 게임을 단순히 ‘건전’과 ‘불건전’의 대결 구도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스포츠 활동과 마찬가지로 ‘행복 추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게임을 만드는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최고의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진지한 여가로서의 게임’,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자발적 도전으로서의 게임’. 우리는 게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몰입’을 배우는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캘거리대 로버트 스테빈스(R.Stebbins) 교수가 1970년 처음 사용한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개념은 TV시청, 낮잠 등과 같은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의 상대적·대칭적 개념이다. 단순히 놀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돈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여가인 것이다. 피아노를 배우거나 클라이밍에 도전하는 것이 이 ‘진지한 여가’의 대표적 사례인데, 스스로 여행을 떠나고 시간과 비용 투자를 요구하는 ‘포켓몬고’ 역시 그래서 진지한 여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몰입은 숙련을 요구하다. 특히 많은 노력과 시련 끝에 도달하는 높은 수준의 몰입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스키를 타고 산비탈을 질주할 때는 누구라도 몸의 움직임, 스키의 위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 눈 덮인 나무 등에 주의를 집중한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넘어지기 십상이라,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완전한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느낌은 강한 행복감을 주고 우리의 뇌리에 오래오래 남아서 자신이 꿈꾸는 삶의 나침반이 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몰입은 자신의 목표를 찾아 노력하고, 그 결과로 보상받는 대표적인 행복 체험이다. 그래서 보통 몰입이라는 개념은 행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과다한 행복’이라는 것이 있는지 짚어 봐야 한다. 바이올린을 하루 종일 연주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그림을 몇날 며칠 밤새워 그리는 화가들을 과몰입이라고 불러도 될까? 그런 차원에서 게임에 몰입하는 게이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
몰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더 알차게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 또한 키울 수 있도록 해 준다. 진지하게 몰입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경험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서두에서 말한 돈과 시간을 투자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진지한 여가로서의 게임과 불필요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는 게임의 정의 사이에는 ‘몰입’이 매개가 될 수 있다.
이제 게임을 단순히 ‘건전’과 ‘불건전’의 대결 구도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스포츠 활동과 마찬가지로 ‘행복 추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게임을 만드는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최고의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진지한 여가로서의 게임’,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자발적 도전으로서의 게임’. 우리는 게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몰입’을 배우는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