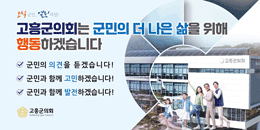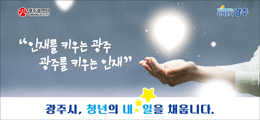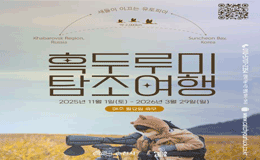[심명섭 전남대 행정학 박사] 작심삼일(作心三日) 없는 1년
아쉬움과 미련을 남겨둔 채 다사다난했던 을미년이 가고 장엄한 햇살과 함께 눈부시게 찬란한 병신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참신한 기대와 가슴 벅찬 희망을 갖고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모든 염원이 새해에는 뜻대로 성취되기를 염원한다.
동녘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아니면 첫 샘물 정한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으며 올해 한해에는 꼭 성취해 보겠다는 큰 기대와 결의를 또 한번 굳게 다짐해 본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세모가 닥치면 그때마다 느끼는 허무했던 마음을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은 아무리 절대자라 하더라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혹자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월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와 낮과 밤은 언제나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흘러간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아 출발의 시점에서 각자의 새로운 각오와 대망의 의지로 후회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학창시절 교양한문 시간에 명심보감을 배우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외운 적이 있다. 일생지계는 재어유(一生之計在於幼)하고, 일년지계는 재어춘(一年之計在於春)하고, 일일지계는 재어신(一日之計在於晨)하나니라는 글이다.
뜻을 풀이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 동안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어린 유년시절에 세우고, 일년의 계획은 씨앗을 뿌리는 봄에 세우며, 하루의 계획은 동이 트는 새벽에 세운다는 뜻이다. 혹자는 이렇게도 해석한다. 어려서 공부를 게을리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아는 것이 없어 남에게 무시당하기 쉽고, 춘삼월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거둘 곡식이 없어 먹지 못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먹듯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알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누구나 일년 동안 실행할 나름대로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초에 세웠던 부푼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현실의 길목에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고뇌의 길을 걸어야 한다. 냉혹한 현시점에서 속세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에서 생존경쟁으로 인생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자산이다. 그 자산을 잘 이용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돌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쉬움이 남겨지기 마련이다. 영국 속담에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것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흘러가는 세월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기에 더하여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가 여유 즉 삼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참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일 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고,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고 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것이 바로 이 여유를 즐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 역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학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학도서관에서 책과 더불어 살아왔다. 물론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이 주된 임무였으니 그 많은 책의 주옥같은 내용을 훔쳐보는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책의 제목을 보는 여유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 시간들이었다.
지금은 새해를 맞는 정초라 해돋이를 찬미하며 사람들이 희망에 차있다. 그런데 새해의 기대와 다짐도 음력설이 될 때쯤이면 차츰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년 초 세운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빌어본다.
동녘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아니면 첫 샘물 정한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으며 올해 한해에는 꼭 성취해 보겠다는 큰 기대와 결의를 또 한번 굳게 다짐해 본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세모가 닥치면 그때마다 느끼는 허무했던 마음을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학창시절 교양한문 시간에 명심보감을 배우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외운 적이 있다. 일생지계는 재어유(一生之計在於幼)하고, 일년지계는 재어춘(一年之計在於春)하고, 일일지계는 재어신(一日之計在於晨)하나니라는 글이다.
뜻을 풀이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 동안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어린 유년시절에 세우고, 일년의 계획은 씨앗을 뿌리는 봄에 세우며, 하루의 계획은 동이 트는 새벽에 세운다는 뜻이다. 혹자는 이렇게도 해석한다. 어려서 공부를 게을리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아는 것이 없어 남에게 무시당하기 쉽고, 춘삼월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거둘 곡식이 없어 먹지 못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먹듯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알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누구나 일년 동안 실행할 나름대로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초에 세웠던 부푼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현실의 길목에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고뇌의 길을 걸어야 한다. 냉혹한 현시점에서 속세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에서 생존경쟁으로 인생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자산이다. 그 자산을 잘 이용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돌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쉬움이 남겨지기 마련이다. 영국 속담에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것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흘러가는 세월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기에 더하여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가 여유 즉 삼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참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일 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고,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고 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것이 바로 이 여유를 즐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 역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학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학도서관에서 책과 더불어 살아왔다. 물론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이 주된 임무였으니 그 많은 책의 주옥같은 내용을 훔쳐보는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책의 제목을 보는 여유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 시간들이었다.
지금은 새해를 맞는 정초라 해돋이를 찬미하며 사람들이 희망에 차있다. 그런데 새해의 기대와 다짐도 음력설이 될 때쯤이면 차츰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년 초 세운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