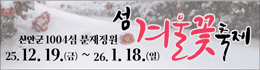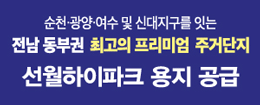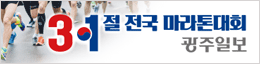히말라야 바람이 전하는 말
송 기 동
체육부장
체육부장
해발 3000m를 넘으며 어느 정도 고소에 적응해갈 즈음, 로지(여행자 숙소) 난로 가에 옹기종기 모인 도보 여행자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
“(고소가 없는 걸 보니) 혹시 조상 중에 고산족(高山族)이 있는 것 아냐?”
“내가 고산(孤山) 윤선도 14대손일세.”
“우리 동네 앞산이 고산(高山)이요….(웃음)”
최근 15박16일 일정으로 네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BC) 트레킹을 다녀왔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해발 2800m에 위치한 루크라에 도착해 해발 5550m의 칼라파타르까지 갔다가 다시 출발점인 루크라로 돌아오기까지 꼬박 12일을 걸어야 하는 힘든 여정이었다.
‘검은 바위’라는 의미의 칼라파타르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해발 8848m)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뷰 포인트로, 전문 산악인이 아닌 일반인이 걸어서 오를 수 있는 지상 최고의 높이에 자리하고 있다. 에베레스트의 턱밑까지 걸어가는 여행인 셈이다.
올라갈 때는 고소 적응을 위해 서서히 고도를 올린 탓에 목표까지 8박9일이 소요됐지만, 하산길은 3박4일에 불과했다.
인간의 신체는 자신이 사는 환경에 적합하게끔 세팅돼 있다. 그런 까닭에 트레킹의 첫 번째 관문은 ‘저질 체력’이 아니라 ‘고산병’에 적응하는 것이었다.
칼라파타르 트레킹 코스의 베이스캠프라 할 수 있는 남체 바자르의 고도는 3440m. 루크라에서 하루 반나절 거리인 이곳부터 고산병 증세가 나타난다.
우선, 평소보다 희박한 산소량 때문에 두통이 시작된다. 설사나 불면증세도 뒤따르는데,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는 트레킹을 포기하고 신속하게 하산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는 수만 년에 걸친 진화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는 법을 터득하지 않았던가?
3000m 대에서는 4000m 대가, 4000m 대에서는 5000m대의 고산병이 염려됐지만 다행스럽게도 심각한 증세는 찾아오지 않았다.
수목한계선을 지나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황량한 평원을 걷고, 돌투성이 비탈길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시간째 오를 때는 지구라는 행성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자신의 안으로 침잠(沈潛)해 들어가는 사색여행이었다.
지난 2005년 일찌감치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소설가 박범신은 사색편지를 묶은 ‘비우니 향기롭다’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내가 살아온 경로를 역순으로 거슬러 온 것입니다.…
카트만두 뒷골목에서 나는 30대, 욕망을 향해 분주하게 달려가던 나를 만났고, 두크라나 남체바자르에서 나는 존재론적 번뇌에 싸여 보냈던 나의 20대를 만났으며, 탕보체∼팡보체∼딩보체 마을을 차례로 지나쳐온 비좁은 고원 길에서 끝간데 없이 더 먼곳을 그리워 했던 나의 외로운 10대를 만났고, 마침내 로부체를 거쳐 칼라파타르까지 갈 때 내 영혼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이르렀습니다.…”
티없이 짙푸른 하늘 빛깔과 투명한 햇살 아래 설산(雪山)을 바라보며 걷는 내내 몸은 힘들었지만, 머릿속은 여느 때보다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속도를 다투는 경쟁적인 도시문명 속에서 살며, 갖게 되는 온갖 고민으로 부터 해방된 때문이리라.
놀랍게도 4000m대의 춥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은 야크를 길들이고, 감자를 재배하며 살고 있었다.
마침내 당도한 칼라파타르에는 누가 쌓았는지 돌탑이 있고, 그 위로 롱다(라마불교 경전을 적은 작은 천)가 펄럭였다. 냉기를 잔뜩 품은 된바람 속에서 눈 앞의 에베레스트를 한참 바라봤다. 무얼 바라고 여기까지 왔던가?
“몸과 영혼이 정화된 듯한 느낌입니다.” 동행한 한 초등 선생님의 말이다.
산길을 걸으면서 새삼 내가 이미 너무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눈 앞의 목표에만 열중해 삶의 여유와 본성, 행복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트레킹 내내 가장 많이 들었던 네팔 말은 ‘비스따리∼!”였다. ‘천천히 (걸어라)’라는 의미다. 도시 속 삶에서 잃어버린 단어가 아닐까? 그리고 일생에 한번쯤은 희박한 공기 속에서 설산 아래를 ‘천천히’ 걸어보자.
/song@kwangju.co.kr
“(고소가 없는 걸 보니) 혹시 조상 중에 고산족(高山族)이 있는 것 아냐?”
“내가 고산(孤山) 윤선도 14대손일세.”
“우리 동네 앞산이 고산(高山)이요….(웃음)”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해발 2800m에 위치한 루크라에 도착해 해발 5550m의 칼라파타르까지 갔다가 다시 출발점인 루크라로 돌아오기까지 꼬박 12일을 걸어야 하는 힘든 여정이었다.
‘검은 바위’라는 의미의 칼라파타르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해발 8848m)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뷰 포인트로, 전문 산악인이 아닌 일반인이 걸어서 오를 수 있는 지상 최고의 높이에 자리하고 있다. 에베레스트의 턱밑까지 걸어가는 여행인 셈이다.
인간의 신체는 자신이 사는 환경에 적합하게끔 세팅돼 있다. 그런 까닭에 트레킹의 첫 번째 관문은 ‘저질 체력’이 아니라 ‘고산병’에 적응하는 것이었다.
칼라파타르 트레킹 코스의 베이스캠프라 할 수 있는 남체 바자르의 고도는 3440m. 루크라에서 하루 반나절 거리인 이곳부터 고산병 증세가 나타난다.
우선, 평소보다 희박한 산소량 때문에 두통이 시작된다. 설사나 불면증세도 뒤따르는데,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는 트레킹을 포기하고 신속하게 하산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는 수만 년에 걸친 진화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는 법을 터득하지 않았던가?
3000m 대에서는 4000m 대가, 4000m 대에서는 5000m대의 고산병이 염려됐지만 다행스럽게도 심각한 증세는 찾아오지 않았다.
수목한계선을 지나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황량한 평원을 걷고, 돌투성이 비탈길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시간째 오를 때는 지구라는 행성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자신의 안으로 침잠(沈潛)해 들어가는 사색여행이었다.
지난 2005년 일찌감치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소설가 박범신은 사색편지를 묶은 ‘비우니 향기롭다’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내가 살아온 경로를 역순으로 거슬러 온 것입니다.…
카트만두 뒷골목에서 나는 30대, 욕망을 향해 분주하게 달려가던 나를 만났고, 두크라나 남체바자르에서 나는 존재론적 번뇌에 싸여 보냈던 나의 20대를 만났으며, 탕보체∼팡보체∼딩보체 마을을 차례로 지나쳐온 비좁은 고원 길에서 끝간데 없이 더 먼곳을 그리워 했던 나의 외로운 10대를 만났고, 마침내 로부체를 거쳐 칼라파타르까지 갈 때 내 영혼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이르렀습니다.…”
티없이 짙푸른 하늘 빛깔과 투명한 햇살 아래 설산(雪山)을 바라보며 걷는 내내 몸은 힘들었지만, 머릿속은 여느 때보다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속도를 다투는 경쟁적인 도시문명 속에서 살며, 갖게 되는 온갖 고민으로 부터 해방된 때문이리라.
놀랍게도 4000m대의 춥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은 야크를 길들이고, 감자를 재배하며 살고 있었다.
마침내 당도한 칼라파타르에는 누가 쌓았는지 돌탑이 있고, 그 위로 롱다(라마불교 경전을 적은 작은 천)가 펄럭였다. 냉기를 잔뜩 품은 된바람 속에서 눈 앞의 에베레스트를 한참 바라봤다. 무얼 바라고 여기까지 왔던가?
“몸과 영혼이 정화된 듯한 느낌입니다.” 동행한 한 초등 선생님의 말이다.
산길을 걸으면서 새삼 내가 이미 너무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눈 앞의 목표에만 열중해 삶의 여유와 본성, 행복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트레킹 내내 가장 많이 들었던 네팔 말은 ‘비스따리∼!”였다. ‘천천히 (걸어라)’라는 의미다. 도시 속 삶에서 잃어버린 단어가 아닐까? 그리고 일생에 한번쯤은 희박한 공기 속에서 설산 아래를 ‘천천히’ 걸어보자.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