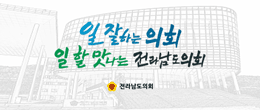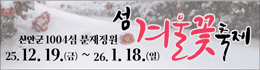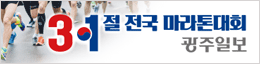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한근우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기과 교수
 |
애니메이션 영화 룩백(Look Back)을 보며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불쑥 올라왔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 잿빛처럼 가라앉은 마음을 안고도 다시 책상 앞에 앉는 한 인물의 모습은 왠지 낮설지가 않다. 영화 속 주인공에게는 기적적인 치유도, 극적인 구원도 없었다. 그저 삶의 무게를 등 뒤에 멘 채 다시 펜을 드는 움직임. 그 작은 동작 속 장면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만 한다’라는 문장을 보았다. 그리고 문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은 늘 완전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는 어떤 날은 덧나고 어떤 날은 무뎌진다. 그러나 그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책상 앞에 앉고(또는 일터로 향하거나), 다시 하루를 시작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독을 마주한다. 혼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있어도 메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독은 더 나아가 알 수 없는 공허함이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린다. 하지만 그런 고독은 어느 순간 삶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는 그림자가 된다. 그림자는 없앨 수 없지만 있어도 걸음을 막지는 않는다. 우리가 걸어가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림자는 그저 뒤에서 따라올 뿐이다.
상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잃어가며 산다. 사람을 잃기도 하고, 기회나 가능성을 놓치기도 하고, 한때 믿었던 자기 자신마저 잃을 때도 있다. 상실은 대개 조용히 찾아오지만 떠날 때는 꽤나 큰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아물 듯 아물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문득 아리는 순간들로 찾아온다. 그것들은 대개 미련이나 후회라는 상처로 남기고 홀연히 떠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상처를 삶에서 쉽사리 잘라낼 수 없다. 어쩌면 상실은 우리가 사랑했고, 꿈꿨고,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바라보았다는 증표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고독과 상실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많은 이들은 상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영화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상처를 이겨내지 못한 채 살아도, 불안을 안고 걸어도, 여전히 마음 한편이 시릴 때도 괜찮다. 누구나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무게가 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다.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달라지지 않아도 그저 앞으로 나아가 보는 것. 그것이 삶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용기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지 모른다.
우리는 가끔 “왜 이렇게 힘든 마음을 안고도 계속 살아가야 하지?”라는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그 답은 특별한 데에 있지 않다. 누군가는 책임감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희미한 희망 때문에, 누군가는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살아간다고 한다. 모두가 이유가 어찌되었건 살아간다는 행동 자체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킨다. 고통스러운 기억도, 예기치 못한 상실도, 살아가는 동안 몸 안에서 천천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를 지우지 않고도 현재를 쌓아 나갈 수 있게 된다.
영화 룩백의 마지막 장면이 주는 울림은 바로 여기에 있다. 완벽하게 회복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불안하고 흔들림이 있지만 다시 움직이려는 의지.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강했고 아름다웠다. 삶은 종종 너무나 잔인하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버겁다.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운다. 누군가는 천천히, 누군가는 비틀거리며, 누군가는 주저앉았다가 다시금 일어난다. 그 모든 방식이 정답이다.
다가올 새해에도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무척이나 잔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그 모든 흔적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저물어가는 2025년의 끝자락에서, 무거운 삶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온 우리에게 나직한 인사를 건네고 싶다. 참 애썼다.
중요한 것은 고독과 상실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많은 이들은 상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영화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상처를 이겨내지 못한 채 살아도, 불안을 안고 걸어도, 여전히 마음 한편이 시릴 때도 괜찮다. 누구나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무게가 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다.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달라지지 않아도 그저 앞으로 나아가 보는 것. 그것이 삶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용기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지 모른다.
우리는 가끔 “왜 이렇게 힘든 마음을 안고도 계속 살아가야 하지?”라는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그 답은 특별한 데에 있지 않다. 누군가는 책임감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희미한 희망 때문에, 누군가는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살아간다고 한다. 모두가 이유가 어찌되었건 살아간다는 행동 자체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킨다. 고통스러운 기억도, 예기치 못한 상실도, 살아가는 동안 몸 안에서 천천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를 지우지 않고도 현재를 쌓아 나갈 수 있게 된다.
영화 룩백의 마지막 장면이 주는 울림은 바로 여기에 있다. 완벽하게 회복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불안하고 흔들림이 있지만 다시 움직이려는 의지.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강했고 아름다웠다. 삶은 종종 너무나 잔인하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버겁다.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운다. 누군가는 천천히, 누군가는 비틀거리며, 누군가는 주저앉았다가 다시금 일어난다. 그 모든 방식이 정답이다.
다가올 새해에도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무척이나 잔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그 모든 흔적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저물어가는 2025년의 끝자락에서, 무거운 삶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온 우리에게 나직한 인사를 건네고 싶다. 참 애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