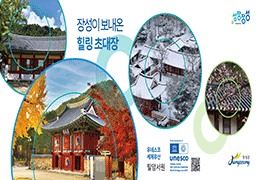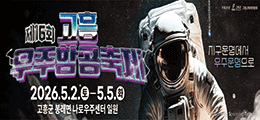광주 밝히는 공간들…세계 복합문화 플랫폼에서 배워야
복합문화공간, 도시의 미래가 되다 (14) 에필로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박물관지구’
도시 색깔 바꾼 그라츠 현대미술관
레오폴드 미술관·건축박물관 등
50개 문화시설 시민들 일상 풍요
서울예술의전당·부산 F1963…
독보적 콘텐츠·차별화된 운영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박물관지구’
도시 색깔 바꾼 그라츠 현대미술관
레오폴드 미술관·건축박물관 등
50개 문화시설 시민들 일상 풍요
서울예술의전당·부산 F1963…
독보적 콘텐츠·차별화된 운영으로
 지난 25일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야경. 개관 초기 랜드마크와 콘텐츠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누적방문객 2152만 명(지난 9월 기준)을 돌파하는 등 동시대 문화예술발전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ACC 제공> |
지난 2023년 6월11일 지역 문화계의 시선이 광주예술의전당(광주문예회관 전신)에 쏠렸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이자 마에스트로인 장한나와 오스트리아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들의 조합은 클래식 애호가들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이날 공연이 뉴스메이커로 떠오른 건 광주에서 3년 만에 열린 ‘빅쇼’였기 때문이다. 광주문예회관이 3년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무대에서 개관 32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한 것이다.
사실, 3개월도 아닌 3년동안 공연장의 문을 걸어 잠근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광주문예회관이 시설 노후화로 휴관에 들어가면서 대형 공연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광주문예회관의 장기휴관이 남긴 후유증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였다.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1500석의 공연장이 멈추면서 유명 아티스트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대형 무대를 감상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문화도시를 자부하는 광주에서 행정미숙으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9월 초, 취재차 찾았던 뮌헨의 가스타익(Gasteig)은 ‘잊고 있었던’ 광주예술의전당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40년간 시민들과 동거동락했던 하이드하우젠(Haidhausen)에서 외곽지역인 젠들링(Sendling)으로 이전해 ‘객지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3년 지어진 맥주공장에 들어선 복합문화공간이 노후화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에 들어가자 지난 2021년 ‘가스타익 HP8’(Hans Preissinger Strasse 8)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지금의 자리로 잠시 옮긴 것이다. 통상 미술관이나 공연장이 보수공사나 재건축에 들어가면 전면휴관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다.
뮌헨시 산하기관인 가스타익이 공사기간 동안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은 건 ‘문화공백’을 우려해서다. 가스타익의 부재는 곧 뮌헨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스타익이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문화적 상실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공사중이라는 팻말을 달면 ‘통하는’, 간단한 선택 대신 ‘임시 거처’에서 시민들을 위한 무대를 꾸미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복합문화공간이 시민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자리한 ‘박물관지구’(Museum Quartier, 이하 MQ)는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야외 거실’이었다. 도심 한가운데에 둥지를 튼 MQ는 깔끔하게 단장된 정원을 사이에 두고 레오폴드 미술관. 무목 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건축박물관 등 50여 개의 문화시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 흥미로웠다.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미술관과 바로크 건축양식이 공존하는 이 곳은 원래 황실 마구간으로 쓰였던 자리로, 비엔나시는 장소가 지닌 상징성을 보존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01년 개관까지 1500만유로(한화 약 220억원)를 들여 리모델링했다. 수많은 문화시설 가운데 인상적인 건, 이들 건축물 앞에 듬성 듬성 놓인 수십 여 개의 공공벤치다. 일명 ‘엔지스’(Enzis)로 불리는 초록색 의자에는 앉아서 책을 읽거나 누운채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라츠 현대미술관(Kunsthaus Graz)은 나아가 도시의 색깔을 바꾼 역사적인 현장이었다.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인구 25만 명의 중소도시이지만 지난 2003년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될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새끼 하마나 해삼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건축미와는 거리가 먼 건축물은 개관과 동시에 그라츠의 이미지를 180도 바꿨다. 지난 2003년 무어강을 바라보며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오스트리아는 물론 유럽 문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15개의 촉수를 가진 거대한 연체 동물이나 외계 생명체 같은 모습은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현대미술관의 랜드마크 논란은 오스트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등 핫이슈로 부상했다. 그라츠의 정체성을 깨뜨린 UFO라는 반대 여론에 맞서 노후화된 도시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미래 지향적인 건물이라는 건축계의 호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술애호가들 사이에 ‘한번쯤 가봐야 하는 유니크베뉴(uniquevenue)’로 알려지면서 비엔나를 찾는 관광객들이 그라츠로 몰려드는 반전이 펼쳐졌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중세도시에 착륙해 ‘친절한 외계인’(Friendly Alien)이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시간이었다.
서울예술의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부산F1963, 청주문화제조창 등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복합문화공간들도 독보적인 콘텐츠와 차별화된 운영으로 도시의 브랜드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판 그라츠
현대미술관’으로 불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변신은 인상적이었다. 지난 2014년 개관과 동시에 ‘정체불명의 UFO’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지만 개관 10년 만에 누적 방문객 1억 명(2024년 6월 기준)을 돌파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부상했다. 개관 첫해인 2014년 688만 명이 찾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1729만 명이 방문했다. 올해로 개관 11주년을 맞은 DDP가 세계 유일의 디자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데에는 독창적인 콘텐츠가 있다. 디자인, 창조산업, 전시, 공연, 축제 등이 어우러진 공간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올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개관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개관 초기 거센 랜드마크 논란으로 위축되기도 했자만 아시아 문화예술 가치를 창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은 멀다. 일각에선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슬로건에 매몰돼 지역과 소통하지 못한채 중앙과 세계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번 기획시리즈에서 둘러본 국내 4개 도시와 해외 6개 도시의 11개 복합문화공간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비록 나라와 장르는 다르지만 여느 곳에서는 접하기 힘든 차별화된 콘텐츠와 시민들의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열정이었다. ACC를 비롯한 광주의 문화 인프라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가치이자 미래다. 21세기 복합문화공간은 단순한 미술관, 공연장이 아닌 한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글·사진=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연이 뉴스메이커로 떠오른 건 광주에서 3년 만에 열린 ‘빅쇼’였기 때문이다. 광주문예회관이 3년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무대에서 개관 32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한 것이다.
광주문예회관의 장기휴관이 남긴 후유증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였다.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1500석의 공연장이 멈추면서 유명 아티스트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대형 무대를 감상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문화도시를 자부하는 광주에서 행정미숙으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뮌헨시 산하기관인 가스타익이 공사기간 동안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은 건 ‘문화공백’을 우려해서다. 가스타익의 부재는 곧 뮌헨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스타익이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문화적 상실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공사중이라는 팻말을 달면 ‘통하는’, 간단한 선택 대신 ‘임시 거처’에서 시민들을 위한 무대를 꾸미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복합문화공간이 시민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오스트리아의 그라츠현대미술관 전경 |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미술관과 바로크 건축양식이 공존하는 이 곳은 원래 황실 마구간으로 쓰였던 자리로, 비엔나시는 장소가 지닌 상징성을 보존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01년 개관까지 1500만유로(한화 약 220억원)를 들여 리모델링했다. 수많은 문화시설 가운데 인상적인 건, 이들 건축물 앞에 듬성 듬성 놓인 수십 여 개의 공공벤치다. 일명 ‘엔지스’(Enzis)로 불리는 초록색 의자에는 앉아서 책을 읽거나 누운채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라츠 현대미술관(Kunsthaus Graz)은 나아가 도시의 색깔을 바꾼 역사적인 현장이었다.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인구 25만 명의 중소도시이지만 지난 2003년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될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새끼 하마나 해삼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건축미와는 거리가 먼 건축물은 개관과 동시에 그라츠의 이미지를 180도 바꿨다. 지난 2003년 무어강을 바라보며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오스트리아는 물론 유럽 문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15개의 촉수를 가진 거대한 연체 동물이나 외계 생명체 같은 모습은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현대미술관의 랜드마크 논란은 오스트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등 핫이슈로 부상했다. 그라츠의 정체성을 깨뜨린 UFO라는 반대 여론에 맞서 노후화된 도시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미래 지향적인 건물이라는 건축계의 호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술애호가들 사이에 ‘한번쯤 가봐야 하는 유니크베뉴(uniquevenue)’로 알려지면서 비엔나를 찾는 관광객들이 그라츠로 몰려드는 반전이 펼쳐졌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중세도시에 착륙해 ‘친절한 외계인’(Friendly Alien)이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시간이었다.
서울예술의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부산F1963, 청주문화제조창 등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복합문화공간들도 독보적인 콘텐츠와 차별화된 운영으로 도시의 브랜드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판 그라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
올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개관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개관 초기 거센 랜드마크 논란으로 위축되기도 했자만 아시아 문화예술 가치를 창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은 멀다. 일각에선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슬로건에 매몰돼 지역과 소통하지 못한채 중앙과 세계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번 기획시리즈에서 둘러본 국내 4개 도시와 해외 6개 도시의 11개 복합문화공간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비록 나라와 장르는 다르지만 여느 곳에서는 접하기 힘든 차별화된 콘텐츠와 시민들의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열정이었다. ACC를 비롯한 광주의 문화 인프라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가치이자 미래다. 21세기 복합문화공간은 단순한 미술관, 공연장이 아닌 한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글·사진=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