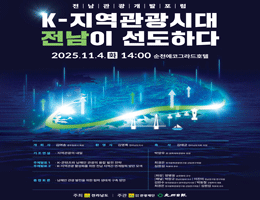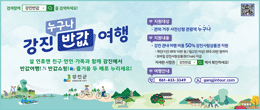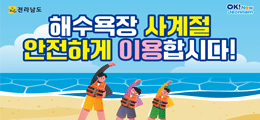뜨거워지는 바다 사라져가는 고기 떠나가는 섬 사람
섬이 위험하다 <1>기후 최전선에 놓인 위기의 전남 섬
남해 해수면 온도 20.26도
어획량 급감에 배 연료비도 안나와
여자만 일대 어종 변화…치어 자취 감춰
달라진 바다 환경에 섬 떠나는 사람 늘어
고령화 심화·인프라 부족에 식수난까지
남해 해수면 온도 20.26도
어획량 급감에 배 연료비도 안나와
여자만 일대 어종 변화…치어 자취 감춰
달라진 바다 환경에 섬 떠나는 사람 늘어
고령화 심화·인프라 부족에 식수난까지
 여자도 해안 데크길에서 연도교로 연결된 송여자도 전경. 여자도는 대여자도, 송여자도는 소여자도로도 불린다. 연도교 입구에 설치된 낚싯꾼 조각상. |
#. “여자만이 얼마나 고기가 많았는데…. 동부권 사람들이 이 여자만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기가 없어. 또 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니 도시로 전부 나가고 없잖아요. (섬에) 환갑 밑으로는 거의 없어. 빈 집도 많아졌지요. 이런데 ‘우리 섬이 먹고 살기 좋으니 오세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자도 토박이 김용운(75) 어촌계장은 예전보다 급격히 줄어든 어획량으로 자신의 배를 소형으로 바꿨다. 바다 온도가 오르면서 어종이 바뀌고 어획량도 급감했다고 한다. 김 계장이 자신의 배에서 여자만 앞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
지난 18일 찾은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汝自島·면적 0.77㎢)는 고즈넉했다. 똑같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섬이지만 배로 2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섬달천항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인근 섬을 찾아가는 등산객들의 북적거림이나 주차장을 가득 채운 차량 등은 찾기 힘들었다. 대신, 한적하면서도 느긋한 편안함이 섬을 감싸안는다.
2개의 유인도(대여자·소여자)와 5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섬 여자도는 공중에서 보는 섬 배열이 한자 여(汝)자 형태인데다, 육지에서 너무 멀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미의 ‘자’(自)를 썼다고 한다.
그만큼 섬 주민들 대부분은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철따라 건져올리는 게 달랐죠. 바다만 나가면 먹을 게 나왔거든요. 제가 젊었을 땐 잡기싫어 안 잡을 때도 있었어요.”
김 어촌계장은 신난 표정으로 30년 전의 즐거운 기억을 꺼내놓았다.
여자도는 여수 반도와 고흥반도 사이, 순천만 중앙에 위치한 섬으로, 감성돔, 낙지, 새우, 전어, 꽃게, 쭈꾸미 등이 많이 잡히고 갯벌에서 새고막, 키조개, 피고막 등 패류 채취가 풍족했던 섬이다.
여자도로 가는 배에서 만난 여자호 사무장 김정안씨는 “20년 전만 해도 전어가 워낙 많이 잡혔다. 사료로 줘도 됐을 정도였다”고 기억했다.
그 바다가 달라졌다.
남해바다는 더 뜨거워졌다. 25년 전인 2000년 남해바다 표층 수온은 18.49도. 지난 2023년(19.92도)까지 18~19도를 오르내리더니 지난해 20도(20.26도)를 넘어섰고 올해도 0.55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도 17.12도(2024년)를 기록, 25년 전(15.43도)보다 2도 가까이 올랐다. 바다 온도가 오르면서 여자만에서 뛰놀던 고기들이 산란기에 산란하지 못하고 다른 바다로 떠났다.
“3년 쯤 전인가부터 고기가 확 줄었어요. 예전 같으면 설 쇠고 봄에 산란하러 올라오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고기 수가 줄더라고요. 전어도 어획량이 줄어서 고갈되다시피했어요. 예전에 소규모 어선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잡은 고기 받아가려고 뭍에서 운반 차도 보내줬는데, 이젠 그것도 사라졌어요. 낙지, 꽃게도 주 어종이었는데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할 정도에요.”
선착장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큰 배들을 모래 위로 올려 기우뚱하게 세워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자도 앞 선착장에는 아예 운항을 하지 않는 큰 배들이 적지 않다. 큰 배 운항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정도로 어획량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
김 어촌계장이 기억하는 어획량 감소 상황은 수협중앙회 전남본부가 내놓은 ‘2020~2024년 전남 주요 수산물 위판 현황’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여수수협의 경우 6095t(2020년)이던 삼치 위판량이 5810t(2022년)→5149t(2024년)으로 감소했고 갈치 위판량도 4531t(2020년)에서 2908t(2022년)→1229t(2024년)으로 급감했다.
서해도 다르지 않았다.
영광군수협의 참조기 위판량은 5년 전(2020년)만 해도 9772t에 달했지만 3년 만에 3520t(2023년)으로 쪼그라들었다.
2000년대(2000~2009년)만 해도 서해 평균 어획량은 멸치(1만9780t)·꽃게(1만 1661t)·바지락(9354t)·살오징어(5381t)·주꾸미(3962t) 등이 많았지만 2020년대(20~24년)에는 까나리(1만1531t)·갑오징어류(3025t) 어획량이 증가했다.
남해 어획량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00년대 평균 어획량이 20만 9378t에 달했던 멸치는 2010년대(2010~2019년)에는 어획량이 17만 9560t으로 줄었고 병어류(2000년대·7720t)는 2010년대 아예 주요 어획량 순위에 들지조차 못했다.
서식하는 주요 어종에도 변화가 생겼고 주로 잡히는 시기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고 한다.
“지난해만 해도 7~8월에 엄청난 대하가 잡혔어요. 제가 70년 넘게 여기서 살았는데 처음이었어요. 서해에서 TV로만 보던 풍경이 우리 바다에서 생겼다니까요. 그물(길이 300m·폭 4m)에 걸린 대하가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온 마을 주민이 달려들었어요. 한 달 이상을 그렇게 잡았어요. ”
그물에 걸린 대하를 빨리 떼어내야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상품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마을 주민 모두가 나서서 거들었다는 게 김 어촌계장 설명이다.
“그물 가지고 있는 주민이라면 모두 잡으러 나갔어요. 그동안 고기 안잡힌다고 그물 던져버리거나 폐어망 내놓는데 줘버렸던 어민들도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꺼내고 찾아서 나갔어요. 사러 가기도 했고. 그 때 많이 잡은 주민들은 40~50㎏짜리 박스로 3개까지 채워넣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았어요. 주민들이 그물 일 도와주고 양동이 하나씩 가득 채워 가지고 갔을 정도였거든요.”
가지고 있던 어구도 튼튼하게 하고 그물을 더 많이 확보해놓고 시기만 기다렸던 여자만 일대 여수·순천·보성·고흥지역 어민들은 헛물을 켰다. 반면, 영광군수협에서는 지난해 참조기 위판량이 5304t에 달하는 등 전년도(3520t)보다 훨씬 많았다.
“날이 더워지면서 바다 온도가 올라가고 염분 농도도 올라가죠. 아열대 기후 영향으로 비는 예년보다 덜 내리니 바다로 유입되는 수량도 줄어 바다 속 플랑크톤도 없으니 치어 등 어린 고기가 살 만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놀래미 등 작은 고기는 아예 안보여요. 예전보다 바다도 오염됐고 갈수록 심화되니 어장도 황폐화되지 않았을까요.” 표층 수온이 올라가면 수심이 낮은 곳에 살던 어린 고기들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 돼 온도가 낮은 바다를 찾아 옮겨가게 되면서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는 얘기다.
 여자도 앞 선착장에는 아예 운항을 하지 않는 큰 배들이 적지 않다. 큰 배 운항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정도로 어획량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
어종 변화 뿐 아니라 평소 살던 치어들도 자취를 감출 정도로 변했다는 게 여자도에서 만난 주민들 설명이다.
여자도 뿐 아니라 여수 지역 섬 주민 대부분이 비슷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뿐 아니라 이 바닷가에 사는 모든 어민들은 똑같아. 우리 여자도 사람들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가는 곳마다 물어보면 물고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같은 섬 사람들은 바다를 보고 살잖아.” 한 때 여자도 일대 바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던 새고막도 예전보다 알이 튼실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게 되면서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감소했다. 새고막 양식 수익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
살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심해지니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머무는 이들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살아가는 데, 즐기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데도 인색하다.
여자도의 경우 2012년 송여자도(松汝自島·〃 0.17㎢)와 연도교(길이 517m)로 연결되면서 여자도 대동마을 뒷길을 지나 3개의 해변 데크길을 따라 탁 트인 남해바다 절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산책로가 만들어져 등산객들 발길이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됐지만 관광 여건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섬과 바다, 갯벌이 어우러진 에코 관광 모델도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해 섬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완도 일대 섬은 여전한 식수난을 버텨내고 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우리 섬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다만 보고 사는 섬 사람들인데 이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요.”
/글·사진=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