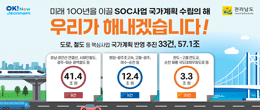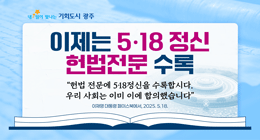독일에서 다시 만난 과거와 현-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오랜만에 독일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출장으로 하루 이틀만 다녀오곤 했었지만 이번에는 회의 일정이 길게 잡혀 있어서 베를린과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다. 마침 베를린의 현대사박물관은 1945년 나치 패망 80주년 특별전을 하고 있었다. 이 특별전은 우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부끄러운 역사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치의 합법적 집권에서부터 독일 제국이 몰락하는 과정까지는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부터 비정상적 집단이 정권을 잡게 된 과정은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에 대한 공포를 과장하면서 히틀러의 권력 강화로 이어지는 과정도 보여주고 있었다.
1945년 이후의 과정은 세 가지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나는 핵 확산과 공포로 인해 빼앗겼던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다. 둘째로, 1945년까지 독일이 전략폭격으로 망가졌다면, 그 다음은 한국 차례라는 설명이 있었다. 북핵뿐만 아니라 자체 핵무장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한국의 현실은 두 문제가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천안문 사건과 독일 통일의 연관성을 조명했다. 천안문 사건에 대한 독일 시민사회의 각성이 없었다면 독일 통일로 연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한 그림판에 천안문 사진과 브란덴부르크의 사진을 좌우에서 볼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써, 탈냉전기의 세계를 한눈에 회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성찰은 라이프치히의 현대사박물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라이프치히는 독일 통일에 대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었다. 그만큼 라이프치히는 바하의 무덤과 괴테 파우스트의 무대가 되었던 작은 도시였지만, 동독의 자유화와 독일 통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박물관에는 과거 동독 시대의 현실을 재현하여 동독이 수립된 후 쓰러진 비스마르크의 동상에서부터 레닌과 스탈린의 사진과 동상, 그리고 동독 사회의 치밀한 주민 검열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대중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슬로건의 그림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베를린과 라이프치히는 전시회 이외에도 도시 전체가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였다. 독일의회 옆에 있는 집시 학살을 추모하는 장소와 함께 베를린의 남서쪽에 위치한 그루네발트역도 인상적인 추모 공간이었다. 17번 플랫폼에는 유대인들을 끌고 간 시기와 유대인의 수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라이프치히에는 길 군데군데에 ‘걸림돌’로 불리는 조그마한 동판들이 놓여 있었다. 유대인들을 끌고 간 자택 앞에 시민사회에서 가로 세로 10cm의 동판을 새겨놓은 것이다. 걸려 넘어지면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지금 독일 사회에서 이주민을 혐오하는 극우세력들이 분기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다.
베를린에 갈 때마다 방문하는 카이저 빌헬름 교회는 1950년대에 복구를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복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화해와 이해를 상징하는 한쪽 팔이 없는 예수상이 있으며, 이 교회가 박물관이 아니라 기억과 숙려의 장소임을 알리는 동판이 걸려 있다. 1945년 이후 파괴된 모습을 그대로 둔 이 교회는 기억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아직도 복원되지 못한 하이델베르크 성 대신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략폭격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드레스덴도 방문했다. 전략폭격으로 하룻밤에 최소 3만여명의 일반 시민들이 죽었다. 1945년 3월 8만여명의 시민이 죽은 도쿄 폭격의 전사였다. 아쉽게도 베를린과 달리 드레스덴에서 폭격의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한국을 돌아보게 한다. 광복 80년을 맞은 한국. 또다시 전쟁에 이끌려 들어갈 뻔했던, 계엄의 공포에 떨었던 오늘의 한국은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있는가? 지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전쟁과 독재의 잔재를 찾기는 힘들다. 새로운 혐오가 나타나고 있는 한국은 어쩌면 과거가 사라진 공간일지도 모른다.
1945년 이후의 과정은 세 가지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나는 핵 확산과 공포로 인해 빼앗겼던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다. 둘째로, 1945년까지 독일이 전략폭격으로 망가졌다면, 그 다음은 한국 차례라는 설명이 있었다. 북핵뿐만 아니라 자체 핵무장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한국의 현실은 두 문제가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성찰은 라이프치히의 현대사박물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라이프치히는 독일 통일에 대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었다. 그만큼 라이프치히는 바하의 무덤과 괴테 파우스트의 무대가 되었던 작은 도시였지만, 동독의 자유화와 독일 통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박물관에는 과거 동독 시대의 현실을 재현하여 동독이 수립된 후 쓰러진 비스마르크의 동상에서부터 레닌과 스탈린의 사진과 동상, 그리고 동독 사회의 치밀한 주민 검열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대중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슬로건의 그림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베를린과 라이프치히는 전시회 이외에도 도시 전체가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였다. 독일의회 옆에 있는 집시 학살을 추모하는 장소와 함께 베를린의 남서쪽에 위치한 그루네발트역도 인상적인 추모 공간이었다. 17번 플랫폼에는 유대인들을 끌고 간 시기와 유대인의 수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라이프치히에는 길 군데군데에 ‘걸림돌’로 불리는 조그마한 동판들이 놓여 있었다. 유대인들을 끌고 간 자택 앞에 시민사회에서 가로 세로 10cm의 동판을 새겨놓은 것이다. 걸려 넘어지면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지금 독일 사회에서 이주민을 혐오하는 극우세력들이 분기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다.
베를린에 갈 때마다 방문하는 카이저 빌헬름 교회는 1950년대에 복구를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복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화해와 이해를 상징하는 한쪽 팔이 없는 예수상이 있으며, 이 교회가 박물관이 아니라 기억과 숙려의 장소임을 알리는 동판이 걸려 있다. 1945년 이후 파괴된 모습을 그대로 둔 이 교회는 기억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아직도 복원되지 못한 하이델베르크 성 대신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략폭격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드레스덴도 방문했다. 전략폭격으로 하룻밤에 최소 3만여명의 일반 시민들이 죽었다. 1945년 3월 8만여명의 시민이 죽은 도쿄 폭격의 전사였다. 아쉽게도 베를린과 달리 드레스덴에서 폭격의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한국을 돌아보게 한다. 광복 80년을 맞은 한국. 또다시 전쟁에 이끌려 들어갈 뻔했던, 계엄의 공포에 떨었던 오늘의 한국은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있는가? 지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전쟁과 독재의 잔재를 찾기는 힘들다. 새로운 혐오가 나타나고 있는 한국은 어쩌면 과거가 사라진 공간일지도 모른다.